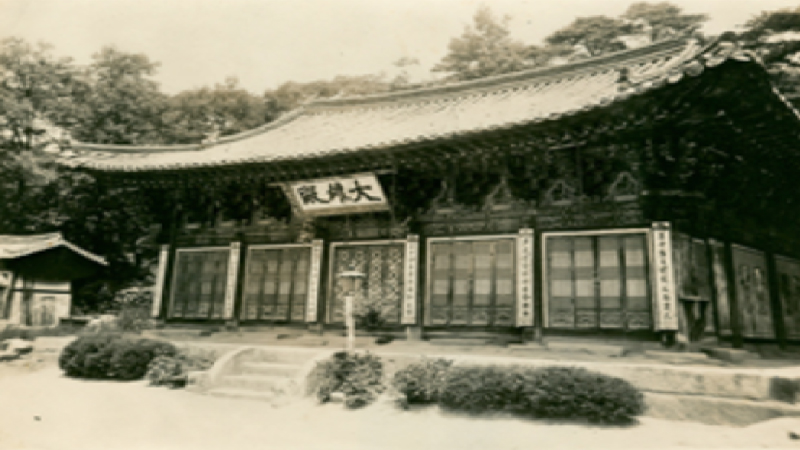[명시초대석] 이것이 삶의 끝이란 말인가 게시기간 : 2024-10-23 07:00부터 2030-12-24 23:23까지 등록일 : 2024-10-21 14:59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명시초대석
|
||||||||
|
“이것이 삶의 끝이란 말인가”(人生會當至此而死矣).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신숙주가 죽음 앞에서 남긴 말이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후대에까지 회자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친구를 배반하고 세조에 협력한 과거에 대한 후회가 담겨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런 관점은 신숙주를 바라보는 오랜 방식의 하나이다.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벗들과 길을 달리하게 된 것은 수양대군(首陽大君)과의 우연한 동행에서 시작된다. 1452년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사은사로 가는데 이때 서장관으로 수행하게 된다. 여러 달의 여정을 함께 한 두 사람은 이때부터 특별한 관계가 된다. 이듬해 수양대군은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다. 2년 뒤인 1455년 윤6월에는 드디어 왕으로 등극한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정권 탈취의 과정을 보며, 성삼문(成三問) 등 집현전 출신 관리들이 중심이 되어 단종 복위(復位)를 모의한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이 왔다. 이때 창덕궁에서 초대 잔치를 열기로 하는데 이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날 실제 행동을 취해야 할 호위 무신(武臣)의 참석이 갑자기 취소된다. 연회의 자리가 좁다는 이유에서였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거사(擧事)를 미루는데, 멤버 중의 한 명인 김질(金礩)의 밀고에 의해 모두 체포된다.

<신숙주 초상>, 보물 제613호 이들은 세조의 주관 하에 국문(鞫問)을 받는데 모진 고문에도 정당함을 굽히지 않았다. 이때 신숙주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성삼문은 신숙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꾸짖었다. “옛날 세종께서 원손(元孫)을 안고 뜰을 거닐며, 훗날 이 아이를 잘 보필하라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그대는 벌써 잊었는가?” 신숙주는 부끄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부인에 관한 일화는 보다 가혹한 윤리의 칼날을 들이댄다. 신숙주의 부인은 영의정을 지낸 윤자운(尹子雲)의 누이동생이었다. 사육신(死六臣)이 체포되던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신숙주는 부인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이곳저곳을 찾아보니, 부인이 두어 자 되는 베를 가지고 다락 위의 들보 밑에 앉아 있었다. 연유를 묻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평일에 성학사(成學士)와 형제처럼 친했습니다. 오늘 성학사 등의 옥사(獄事)가 있다는 것을 듣고, 당신도 함께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지를 기다려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당신이 살아 오셨네요.” 부인에게마저 지탄을 받는 내용이다. 사육신의 거사 이전에 부인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각색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신숙주를 다룬 기록은 고정된 틀처럼 사육신의 절의(節義)와 그의 변절을 대비시킨다. 평생 그는 변절 콤플렉스를 떨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세조 집권 이후의 글에서는 성삼문 등 집현전 시절 벗들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아래의 시만이 헤아리기 어려운 내면을 조금 보여줄 뿐이다. <次洪日休游津寬洞後賡金浩生詩卷詩韻>
하루 동안 세속 생각 세상 밖에 펼치니 하늘가의 삼각산은 푸르름을 보내오네 마음 아픈 옛 일 아는 이 없는데 말 위에서 시 엮으며 느릿느릿 돌아오네 一日塵懷物外開 三山天際送靑來 傷心舊事無人識 馬上聯詩緩緩回 -『保閑齋集』 권6 1463년 홍일동(洪逸童), 이석형(李石亨), 김호생(金浩生), 일암(一菴) 등과 진관사(津寬寺)를 방문하고 쓴 시이다. 진관사는 20여 년 전인 1442년 이석형, 박팽년, 하위지, 성삼문 등과 사가독서(賜暇讀書) 하던 곳이다. 모처럼 시인은 도성을 벗어나 상쾌함을 느낀다. 그런데 시간이 더할수록 마음 한쪽은 무겁기만 하다. 젊은 시절 동료들과 이곳을 찾았던 기억이며 이후에 길을 달리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음 아픈 옛 일[傷心舊事]’은 이러한 기억에 대한 표현이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저 덤덤히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곧 공적(公的)인 자아와 사적(私的)인 자아가 타협한 지점의 언어이다.
“이것이 삶의 끝이란 말인가?”라는 말은 죽음 앞의 마지막 언어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삶에 대한 회한(悔恨)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한 시대를 호령한 인물이지만 종국에는 ‘절의’라는 지배적 가치를 수긍한 모습으로 보려는 시각이다. 그렇지만 후회나 반성으로 돌리기에는 설명해야 할 여백이 커 보인다. 다음의 시는 그러한 사고의 공간을 제공한다. <曉發利城 浴海而行 望日出有感 題谷口軒>
새벽녘에 말을 타고 이성을 나서 평원을 내달리며 일출을 바라보네 푸른 바닷물 채색의 구름과 만나더니 솟구치는 붉은 기운 산불이 번지는 듯 갑자기 구름 걷히고 기운도 퍼져가니 아득히 물과 하늘 한 빛깔이 되었네 화룡이 유리 소반을 받들어 올리니 신이한 빛 눈부시게 사람 눈을 비추네 전설 속의 부상과 석목은 어디일까 하늘과 바다 아득하여 끝이 없구나 바다 밑을 떠나 금세 높은 곳에 이르러 눈앞 세상 비추는 것 잠깐의 사이네 세상의 세월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 나도 모르게 깊은 탄식을 하게 하네 말을 멈추고 곡구역에 묵으려 하는데 홀로 앉자 까닭 없이 마음이 편치 않네 인생 백 년 삼 만의 날 이러할 뿐 예쁜 꽃 좋은 새소리도 끝내는 사라지는 것 멍하니 보내는 한평생 무슨 의미 있을까 장부(丈夫)는 그 이름 불멸하게 해야 하리 平明騎馬出利城 馳上平原望出日 海水正碧綵雲合 赤氣先騰山火急 倏忽雲開氣亦散 水遠天長共一色 火龍擎出玻瓈盤 神光閃閃射人目 扶桑折木定何處 天海茫茫不可極 纔離海底易爲高 眼前萬丈在頃刻 世上光陰正如此 令人不覺長歎息 歇馬來投谷口驛 獨坐無端懷抱惡 百年三萬聊爾耳 榮華好音竟泯若 醉生夢死顧何爲 丈夫要使名不滅 - 保閑齋集』 권11. 세조가 등극하고 정국이 안정을 찾아가던 1460년이었다. 함경도 변경에서 여진족이 자주 소란을 피운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정에서는 출정을 결정하고 신숙주에게 강원·함길도의 도체찰사의 직을 맡긴다. 그는 뛰어난 전략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다. 위의 시는 변경 지역에 머물 때에 쓴 것이다. <새벽에 이성(利城)을 떠나 바닷가에서 씻고 가다가 해 뜨는 것을 보고 감회가 있어 곡구헌에 쓰다>라는 제목의 시이다. 제목에 나오는 이성은 지금의 함경남도 이원이다. 고려시대에는 한때 여진이 점유하기도 했던 곳으로 단천(端川)과 북청(北靑) 사이의 동해를 접하고 있다.
이 시는 동해의 일출을 제재로 한 것이다. 동해에 다녀온 사람들은 일출의 광경을 기억한다. 어둠을 밀어내고 바다로부터 퍼져오는 밝음의 한 가운데,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장면은 감탄을 자아낸다. 사람들은 그러한 약동의 현장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다짐하기도 한다. 새해 첫날의 해맞이라는 것도 부상하는 태양의 리듬에 삶의 리듬을 일치시키려는 것이리라.
이른 아침, 숙소를 나선 시인은 말을 타고 바닷가를 달렸다. 그 때 마침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시인은 장관(壯觀) 앞에서 남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일출 앞에서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문득 깊은 허무감에 빠져 들었다. 솟아오르는 태양은 의지를 북돋는 매개가 아니었다. 그저 속절없는 시간의 표상일 뿐이었다. 바다 밑에서 떠올라 허공에 떠오른 그 잠깐의 시간. 어찌 보면 사람의 한평생도 이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후 도착한 곡구(谷口)의 역참(驛站)에서도 불편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다. 허무감에 복잡한 상념마저 더하려던 차였다. 그는 돌연 자신을 짓누르던 허무감의 뒷면을 들췄다. 덧없는 인생, 그 한정된 시간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의 눈에는 중천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불멸의 이름 - 영웅적(英雄的) 삶 -이라는 것이 들어왔다. 지금까지 주도해왔고 앞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정치와 외교, 국방, 학술의 일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부와 책임감에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신숙주에게 허무감은 영웅적 삶에 대한 의지와 동전의 앞뒷면처럼 공존하는 것이었다. 그는 종종 유한한 존재로서의 허무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에 반발하듯 곧바로 영웅적 삶을 실체로서 확인하려 했다. 허무감이란 모든 것을 덧없음의 울타리에 가두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허무라는 늪은 속성상 자아를 더욱 왜소화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다. 마음 안에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 - 단종과 벗들에 대한 배신 - 에 대한 쓰라린 기억은, 여기에서 허무감과 뒤섞일 가능성을 가진다. 그래서일까? 습관화된 마음의 구조는, 싹트려던 번민의 실마리를 금세 영웅적 의지로 대치시켜 버리곤 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허무감과 이내 그 감정을 덮어버리는 영웅적 의지. 삶의 과정에서 허무감과 영웅적 의지가 꼬리를 물고 반복되지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아픈 과거의 기억과 성찰의 무게감. 이러한 회로(回路)에서 난망(難望)의 답을 찾아갔던 것이 곧 신숙주의 삶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삶의 끝이란 말인가”라는 말은 그 불완전의 회로를 멈추게 된 지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을까? 글쓴이 김창호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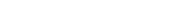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