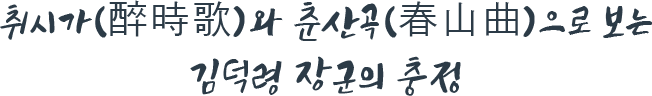[원고 공모전 우수작] 취시가(醉時歌)와 춘산곡(春山曲)으로 보는 김덕령 장군의 충정 게시기간 : 2022-08-12 07:00부터 2030-12-31 23:59까지 등록일 : 2022-08-10 16:5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원고 공모전 수상작
|
|||||||||||||||||||||||||||||||||||||||||
|
춘심(春心)이 동하던 날에 변두리 누정(樓亭)에라도 들러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리라 마음을 다잡고 지인의 차에 몸을 실었다. 춘정(春情)은 춘곤(春困])을 구축(驅逐)한다. 느닷없이 압류당한 자신의 한나절에 불평을 늘어놓는 지인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나들이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격조가 있어야 했다. 봄날 데워진 몸도 식히고 나를 따라다니느라 늘상 지친 그림자에게 잠시라도 숨 좀 돌리라 하기엔 식영정이 맞춤하다 싶어 담양으로 길을 잡았다. 식영정(息影亭)을 지은 서하당(棲霞堂) 김성원도 ‘식영(息影)’을 지은 석천(石川) 임억령도 주인 행세를 못하는 후대의 봄날이 애석했는지 댓잎들의 노래가 우리를 접빈(接賓)하였다. 서하당 아래 길손들의 휴식을 위해 지었다는 초옥의 언저리에서부터 바람에 화답하는 댓잎들의 반응이 귀를 즐겁게 했다. 주중의 식영정 오르는 계단에는 사람의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한데 주인 없는 곳에 주인 행세를 하려 함인지 벌레들이 정자를 찾은 내방객을 인도한다. 주인 없는 무신(巫神)의 델포이에서 신전을 지키는 무녀 퓌티아를 연상시키는 날벌레들은 서하당이 거처로 내어준 부용당 앞 연지(蓮池)에서 퓌톤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가 앞날을 몰라 방황하는 나같은 길손을 반겨 석천 임억령의 신탁이라도 내어줄 심산인지 눈 앞에서 비무(飛舞)를 펼쳐 나를 최면에 들게 한다.
오늘 하루를 누정 답사로 정했으니 도랑 건너 환벽당(環碧堂)과 취가정(醉歌亭)을 아니 볼 수는 없으렷다. 옛날 환벽당의 주인 사촌(沙村) 김윤제와 식영정을 지은 서하당 김성원이 오백 보 거리를 사이에 둔 거처를 오가며 친교를 했다는데, 그리고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자 그 사이로 흐르던 청계천에 무지개 다리를 놓아 오갔다는데, 지금 그 무지개 다리는 찾을 수 없고 밋밋한 콘크리트 다리만 놓여 정감을 느끼려는 마음은 애초에 접어야 했다. 부용당의 날벌레들은 내를 건너지 못하고 배웅하며 돌아서는데 환벽당의 인사는 한창 피어나는 찔레꽃이 대신한다. 찔레꽃을 보면 항시 ‘태백산맥’의 소화가 떠오르곤 하는데 아마도 그 흰 꽃잎이 슬퍼보여서일까? 찔레는 환벽당을 가는 큰길에도 피었고 취가정을 에돌아 오르는 길에도 피었다. 시비(詩碑). 그때 나는 보았다. 찔레꽃에 춘심을 맡기고 소화에게 춘정을 느끼며 취가정에 들어서는 순간, 육중하게 다가오는 검고 커다란 돌덩어리 하나. 시비의 육중함은 돌이 가진 물리학적 계량 때문만은 아니었다. 상춘객은 시를 읽기도 전에 이미 상심하여버렸고 술을 먹기도 전에 벌써 취해버렸다. 벗의 꿈에 나타나 술 한 잔 걸치고 읊조리던 장군의 취시가(醉時歌)는 상념에 젖게 했다.
오호, 통재라! 조국이 위난을 당하니 의기로 떨쳐 일어남은 당연한 일이요, 하명을 받은 장수로서 성심을 다해 공직을 수행함도 지당한 일이었건만, 명군은 어찌하여 장군을 만고의 역적으로 몰아 오명으로 남게 하였던가? 딩연한 귀결로서 역사는 선조를 명백하게 혼군(昏君)으로 지명함으로써, 또한 훗날의 성군은 장군을 충신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역사에는 필연코 귀정(歸正)이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금부의 참혹했던 고신(拷身)과 세간의 혹독했던 무언(誣言)은 무슨 수로 감내했을까?
훗날 어떤 사가(史家)는 그의 노래를 일컬어 포은(圃隱)의 충심에 견줄 만한 단심가(丹心歌)에 비유하는데, 필부에 불과한 나같은 이는 그의 단심을 추호도 의심하지는 않지만 군주를 향한 비분함과 신료들에 대한 배신감이 어찌 티끌 한 점 만큼이라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분노와 울분의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용서와 초월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도 노기를 띠고 격한 감정으로 혼군의 친국(親鞠)에 임했기를 바란다. “이 뒤에 만일 어떠한 생각지 않았던 일이 생긴다면 김덕령같이 용맹한 자를 놓아주었다가 다시 잡아들일 수 있을는지는 신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서애(西厓)! 현신이라 불리는 영의정 류성룡이란 자마저도 망녕된 언사를 주절주절 늘어놓았으니 조정의 다른 신료들은 말해 무엇하랴? 김덕령이 ‘이몽학의 난’과 무관하다는 것은 제 정신을 가진 자들이라면 모를 리 없건만 각다귀 떼들이 득시글거리는 조정에서 정신줄 놓은 자들 또한 부지기수라 이미 난망한 일이었다. 성산(星山)의 아름다운 풍광을 두고 화월(花月)에 취하지 않을 마음이 어찌 없겠으며, 청계(淸溪)를 박차고 나가는 백마 위에서 공훈을 바라지 않을 마음이 어찌 없었으랴? 그러나 환난의 시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부운(浮雲)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그 욕망과 의지를 접는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다시 술기운이 서린 장군의 노래는, 충심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 가진 재주를 굽힘 없고 접힘 없이 떨치고픈 마음으로 부르는 충정의 노래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차도 일장검(一長劍) 짚고 서서 거칠 것이 없었던 절재(節齋) 장군의 충심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장검가(長劍歌)이다. 취가정을 오르며 굳이 발품을 팔아준 지인에게 ‘네가 충장공을 아느냐?’, ‘네가 말바우를 아느냐?’ 하며 한껏 ‘김덕령 論’을 펼치다가 난데없이 장군의 급습을 받은 나는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취가정에 오르면 의젓한 마음으로 장군의 넋을 위로하고 집에서 손수 빚은 가양주(家釀酒) 한 잔 시비에 멋지게 뿌려주리라 했건만, 용렬하게도 나는 가방끈도 풀지 못하고 돌아서고 말았다. “소신의 명성은 그저 하명에 불과하지만 저 역적의 무리들이 국가에서 저를 쓰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시기하여 모함하는 흉계를 부린 것입니다. 제가 우러러 받드는 군부의 앞에서 분변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발명(發明)하겠습니까?” 악덕한 군주 앞에서는 발명도 소용없는 일이다. 장군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왕이 자신을 살려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장군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노래를 부른다.
지금의 봄처럼 그때의 봄도 가물어 춘산(春山)엔 많이도 불났나보다. 지금의 봄처럼 그날의 봄도 흐드러지게 봄꽃이 만발했나보다. 성산의 불은 계류로 끄겠지만 장군의 마음 속에 일어난 연기 없는 불은 무엇으로 끄랴? 충신으로 살다 하루아침에 역도로 몰린 사람의 마음에 불길이 치솟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리라. 춘산곡을 부르는 김덕령이 그랬다. 석저장군(石低將軍). 김덕령의 별칭이다. 이 별칭은 묘하게도 왜놈들이 지었다. 장군이 태어난 곳이 석저촌(石低村)이어서 불렀던 것이지만 말을 모는 솜씨가 귀신같았다는 장군의 ‘말바우 설화’와 맞물려 왜놈들에게는 전설이 되었다. 저 먼 그리스 땅에도 신마(神馬) 페가수스가 바위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던 때에 신마의 말발굽으로 으깨져나간 커다란 바위 웅덩이에 물이 고여 영약의 샘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히포크레네의 전설로 내려오는데 김덕령이 모는 말 역시 준마였던 모양이다. 무등산 자락이야 너덜겅으로 유명하니 돌이 좀 많았으랴. 돌 아래에서 신출귀몰하게 불쑥 나타난다는 장군의 모습은 바위 틈에서 용솟음치는 페가수스를 연상하게 한다. 춘심을 위무하려던 느자구없는 상춘객은 벗의 꿈에 나타나 읊은 시 한 수에 ‘개념있는’ 남자가 되어 다소곳한 발걸음으로 계류를 건넜다. 그러지 않았다면 늘어진 목소리로 장사익의 ‘찔레꽃’을 불렀거나 방정맞은 목소리로 백난아의 ‘찔레꽃’을 불렀을 터인데 용케 참고 계류를 따라 걸었다. 성산(星山)의 계류(溪柳)에서 탁열(濯熱)을 꿈꾸던 내가 심히 부끄러웠고 방치된 누정의 조분(鳥糞)을 보며 남을 탓하던 것이 또한 부끄러웠다.
나의 흉중을 알 리 없는 지인은 봄날의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계류에 앉아 성산을 바라보던 문인들이 시를 지어 시절을 노래했다는데, 장군의 명시를 두 수나 받은 날에 입 다물고 있으면 그 또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충심도 모자라고 문장도 짧은 내가 무슨 수로 시를 짓겠는가 싶었지만 오늘이 아니면 영영 못하리라 싶어 마음 속에 지필묵을 펼쳤다. 그 봄날에 펼친 종이에 무더위가 시작된 여름날이 되어서야 포도시 두 수로 바치는 시가 나와 주어 다행이다. 시는 너저분하지만 어이하랴, 시재(詩材)가 빈궁한 것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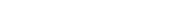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