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의 재발견] 진도의 상장례 다시 읽기 11 게시기간 : 2024-07-30 07:00부터 2030-12-17 21:21까지 등록일 : 2024-07-24 10:20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민속의 재발견
|
|||||||||||
|
1. 김이익의 생애 『순칭록(循稱錄)』에 나타난 진도상장례의 면모를 드러내고 김이익의 시선을 비판하기 위해 지난 호에 이어 붙인다. 김이익의 생애 및 원문 번역은 내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진도문화원의 『순칭록 번역』 작업의 일환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삼아 작성했다. 진도문화원에서 발간한 『국역 순칭록』 보고서에 실려 있긴 하지만, 여기에 옮겨 싣는 수준으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를 좀 더 알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 밝혀 둔다. 순칭록 번역은 록양 박경래(사단법인 록양고문연구원장)가 맡았고, 나는 풍속편의 연구를, 박명희(전남대 강의교수)는 시 백선의 연구를 맡았다. 박경래 원장의 번역작업이 아니었다면 이 글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전남일보 ‘이윤선의 남도인문학’에 관련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해설 등의 중요 부분들도 모두 박경래 원장의 번역에 의지한 것이다. 김희태 전남도 문화재위원 이하 모든 참여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이익(金履翼, 1743~1830)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보숙(輔叔) 호는 유와(牖窩), 시호는 간헌(簡獻)이다. 증조부 김창업(金昌業)이 김수항(金壽恒)의 넷째 아들이고, 할아버지는 김우겸(金祐謙)이다. 곧 김이익의 고조부가 김수항이다. 아버지는 김유행(金由行)이고, 어머니는 이덕영(李德英)의 딸이다. 김이흥(金履興)·김이인(金履寅) 등 형이 있고, 서제로 김이진(金履眞)이 있다. 자식으로는 김철순(金徹淳)·김휘순(金徽淳)·김우순(金禹淳)이 있다. 1777년 35세로 진사시험에 합격한다. 1785년(정조 9) 43세 때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급제한다. 1787년(정조 11)에 부교리에 재직하고 있을 때 함경도 경원에 익조(翼祖)와 도조(度祖)를 기리는 비를 세울 것을 건의하여 받아들여진다. 다음 해(1788년) 교리가 되어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을 탄핵하다가 이성에 유배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장령(掌令), 동부승지, 대사성, 대사간 등을 거쳐 1793년(정조 17)에 안동부사가 되었다. 안동부사 재직 시 형벌로 백성이 죽은 사건 때문에 유배되었다. 형벌이 과다하다는 안동 사람들의 소청에 따른 것이다. 이듬해 이조참의와 대사간을 지내고 1795년 강화유수를 역임하였다. 1799년에는 호조 참판에 올라 사신으로 북경(燕京)에 다녀왔다. 1800년 순조가 즉위한 뒤 벽파가 득세하자 시파로 지목되어 대왕대비(사도세자의 비 헌경왕후)에 의해 진도 금갑도로 유배되었다. 1801년 11월 12일 천극(栫棘, 가시 울타리 형벌)에 처해졌다. 탱자나무로 가시 울타리를 집밖에 치는 위리안치를 말한다. 안동김씨가 집권하자 1805년 7월 26일 유배에 풀려나 진도를 떠난다. 진도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공조판서, 병조판서, 수원부 유수, 대사헌, 형조판서, 한성부판윤을 지내고 대호군으로 치사하는 등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에 가담하여 권세를 누렸다. 1812년(순조 12) 대호군으로 재직 시 세도(世道)를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퇴직 후에 봉조하(奉朝賀)를 받았다. 1830년 88세로 타계하였다. 김이익은 세 차례 유배를 당한다. 1788년(정조 12)에는 김치인(金致仁)을 탄핵하다가 함경남도 이성(利城)으로 유배를 당한 것이 첫 번째다. 1793년(정조17)에 안동부사로 있다가, 환곡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곤장을 맞고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책임을 지고 철산부(鐵山府)로 유배 가게 된 것이 두 번째다.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게 되었고 친정세력인 벽파(僻派)가 안동김씨 중심의 시파(時派)를 견제하면서 1800년(순조 즉위년)에 진도 금갑도로 유배된 것이 세 번째다. 여러 저술에서 본인이 밝히고 있듯이 유배 생활의 억울함을 주로 집필 생활을 통해 해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2.『순칭록(循稱錄)』서술과 진도의 컨텍스트 김이익은 6년의 진도 유배 생활을 하면서 40여 책의 많은 저술을 남긴다. 유배지는 지금의 접도인 금갑도였다. 수군만호가 주둔하는 진(鎭)으로, 의신면 금갑리에 일부 성터가 남아있다. 1801년 주역을 필사하는 것을 비롯해 1804년 『금강유경편』 집필까지 해마다 집필에 몰두한다. 시조 50수를 수록한 『金剛永言錄』은 1802년 8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지은 작품이다. 같은 유배 시기의 글 40여 편을 모은 가사집으로 『金剛中庸圖歌』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순칭록은 1805년 유배 마지막 해에 집필하게 된다. 앞 호의 연재에서 언급한 대로 『循稱錄』은 진도 출신 박진종(朴震琮)의 요청에 따라 저술한 ’예의범절책‘이다. 문답 내용을 대화체 서문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보면 김이익이 진도 풍속에 대한 시선이나 관점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내가 이곳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 가엾고 병폐로 여겨 四禮를 대략 抄錄하여 ‘循稱錄’이란 이름을 붙여 그대에게 주네. 대체로 고을 풍습 중 크게 잘못이 아닌 것은 제외하고 옛것을 따르고 두서너 작가들이 보존한 有無에 따라 많이 끌어왔으니 열에 아홉은 옛 풍습과 맞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네. 그리고 간간이 도식을 붙여 설명하였으니 부족하나마 힘써 받들게. 이 책 한 권의 槪要는 諸賢들이 남긴 실마리가 아님이 없으나 말한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라 부끄럽지만 단 예의 體, 用, 質, 文은 여기에 충분히 갖추어 두었네. 그대는 증직받은 참판 선생이 선조로써, 이미 廟享 창건에 성심을 다했으니 이제부터 사례의 糟粕에 대해 정성을 다한다면 낳아주신 분에게 욕되지 않을 것이니 나는 실로 우리 그대에게 기대가 매우 크네. 그대는 정성껏 이 일을 도모하고 따라서 온 고을 善士와 같은 집안 친척들이 익혀서 행한다면 聖世의 풍속으로 교화하는데 어찌 도움이 없겠는가?
유배 후 행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김이익은 조선 후기 중앙집권 문화의 핵심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성세(聖世)의 문화 곧 왕조 중심의 문화가 사례의 근간이라 여기고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유배 섬 중의 대표적인 공간이었던 진도의 기층문화가 김이익의 시선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그 대강이라도 말하기 위해 본고를 준비하였다. 김이익은 “가엾고 병폐로 여겨” “풍속으로 교화”하고자 쓴 책이 순칭록임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말한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라 부끄럽지만”이라는 대목으로 보면 중앙과는 다른 진도의 기층문화를 인정하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진도의 풍속을 바라봤다는 점이 부동의 사실이라, 진도사람들의 이에 대한 실천(김이익이 주장한 유교 의례 준수)과는 별개로 오늘날 순칭록을 어떤 시선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의 관점은 비교적 선명하다고 할 수 있다. 『순칭록(循稱錄)』은 제1편 관례(冠禮), 제2편 혼례(婚禮), 제3편 상례(喪禮), 제4편 제례(祭禮)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에서 자세한 절차와 축문 등의 예를 수록하고 있다. 중앙과 다른 점들이 언급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조선 후기 진도의 민속 생활과 의례문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들이다. “대체로 고을 풍습 중 크게 잘못이 아닌 것은 제외하고” 등의 언설로 보아 사례의 편람에 부합하는 풍속 또한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사례방방략서(四禮倣方畧序, 戊辰, 1928, 安宅承), 고서(古序, 안동 김이익)에 이어 4편의 사례방방략(四禮倣方畧)으로 이어진다. 이중의 ‘사례방략서’는 중간본 서문으로 안택승(1861∼1936)의 글이다. ‘고서’는 원 저자인 김이익의 서문이다. 진도의 낙후된 예의범절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순칭록』(가정절검)의 부록으로 시사백선(詩社百選)이라는 제하의 100편 시가 있다.1) 시제(詩題)와 작자, 출전 등을 기록하고 있다.2) 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도 현지를 노래했다는 것 정도라, 여기서는 그 존재만 확인해두기로 하고 장차 기회를 보아 다루기로 한다. 3.『순칭록』에 나타난 김이익의 시선 지난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비판적인 언급들을 인용해가며 200여 년 전의 풍경을 현재 전승되고 있는 상례에 비교하여 추론해본다. 이외에도 사례의 절차와 원리를 거론하면서 진도의 풍속을 한탄하는 대목들이 많지만, 차후의 분석을 기약한다. 김이익은 “상례에 있어 조석으로 슬프게 곡하는 풍속이 있는데, 수일 후에 갑자기 (곡하는 것을) 거두고 하지 않는다”고 진도의 풍속을 비판한다. 조석으로 올리는 상식도 하지 않고 삼년상도 하지 않는다고 힐난한다. 교활한 무당들의 습속에 유혹되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무속적인 생활환경과 여성(무속을 주도하는 경향)을 심히 나무라는 대목이 빈출한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비판을 통해 당시 진도에서는 삼우제 이후에는 곡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진도의 다시래기나 씻김굿, 만가 등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운상 중에 북치고 노래하며 술 마시는 풍속이 성행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진도 혹은 남도 지역만의 풍속이었을까? 이 풍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에 대해서는 지난 연재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뒤에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발상에 있어, 상주들은 3~4일 음식을 먹지 않고, 다만 죽을 먹는데, (상주들이) 머리를 풀고 편안히 앉아 술잔을 잡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음을 꾸짖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진도의 습속이 유교식 제례와는 판이하게 달랐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애고’라고 곡하는 것은 다만 상주 쪽에서 해야 하고 조객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조객들이 ‘애고 애고’하고 곡을 하는 풍속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한 사람의 망자에 대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애고 애고’하고 곡을 했다는 뜻이다. 형식이나 형태가 좀 변하기는 했지만 근자까지 전승되어 오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지금은 국가유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로 지정된 다시래기의 풍경들이 겹쳐 보인다. 200여 년 전 김이익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진도의 상례 풍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거듭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했기 때문에 200여 년 후에야 이 풍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강제하는 ‘문화재(문화유산)’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상가의 풍속 중 (상례 음식을) 오로지 너무 많이 준비하려 함을 비판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떡과 과일, 포 등 간략하게 진설하면 될 터인데, 전을 마친 복인들이(절을 하는 등 간단한 예를 마친 조문객들이) 조객과 즉석에서 취하고 배불리 먹는 것은 잘못이라고 나무라는 것이다. 이런 풍경에 대해, 죽은 자를 생각지 아니하고 산자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까지 하고 있다. 김이익의 이런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근자까지 성행하던 진도 혹은 남도의 씻김굿이나 다시래기(신안지역에서는 밤다래라고 함)의 전승 예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이익이 지적한 것처럼 ‘걸게(많고 다양하게 차린다는 의미)’ 차리는 것을 상례를 잘 치루는 일로 여기는 태도나 관념이 있다. 이에 대한 사회학적 혹은 심리학적 측면을 추적해봐도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종실록에도 이 전통이 유구한 것임을 유추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풍속이 사치를 숭상하여 장사를 지내는 데 힘써 사치합니다. 제사는 油蜜의 비용이 數斛에 이르고, 酒饌을 많이 갖추고 인근 사람들을 널리 불러서 聲樂을 크게 베풀어 밤이 지나서야 파하며 이름하여 오시라 하는데 이 때문에 파산하는 자가 많습니다3)
여기서 ‘인근 사람들’이라 함은 바로 마을 사람들을 의미한다. 부지불식간에 혹은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가장 큰 사회적 손실이었을 ‘죽음’이라는 사건을 접하는 태도에 대한 시선을 읽을 수 있다. 예컨대 김이익은 ‘사례의 의례’를 중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를 꾸짖었지만, 진도의 풍속은 ‘의례’보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주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여 년 전의 진도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이 풍속은 고구려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과 끝에는 눈물을 흘리며 곡하지만, 장사 지낼 때는 북치고 춤추며 풍악을 울리면서 장송(葬送)한다는4) 내용이 그것이다. 수서 동이전 고구려조의 기록, “장례를 하면 곧 북을 치고 춤추며 노래 부르는 가운데 주검을 묘지로 운반했다”는 기록 등은 지금의 진도 다시래기나 씻김굿, 만가 등 진도 무속을 논한 논문에서 주요하게 거론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나는 진도에서 나고 자라 성년기까지 보냈다. 내가 경험한 내 고향 진도 및 남도 특히 서남해 지역 사람들은 조객들(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웃고 떠들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을 상례의 기본으로 생각한다. 김이익이 비판했던 풍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나같은 사람들 마음 속에 마치 DNA처럼 흐르고 있다는 뜻이다. 진도씻김굿이나 다시래기가 이를 승계한 전형적인 풍경 아니겠는가. 이것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 김이익이 지적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풍속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속이지 않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김이익 외에도 수많은 유배객이 다녀간 진도지역의 “교활한 무당에 홀린” 풍속이 근자까지 지속될 수 있었겠는가. 성종실록에는 이런 풍속을 백희(百戲)에 비교하고 있다. “경상도 관찰사 김여석, 전라도 관찰사 이집, 충청도 관찰사 최응현에게 유시하기를, “본도(本道)의 민속에 어버이를 장사지낼 때 주식(酒食)을 많이 마련해놓고 마을 사람들을 널리 모아 배우들의 백희(百戲)를 못하는 것이 없이 한다.”5) 김이익은 진도를 중심으로 남도, 호남 등만을 거론하였지만 사실 조선 시대 전반을 충청, 경상지역을 포함하여 계승된 매우 오래된 전통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백희에서 말하는 배우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의례하는 사람들로 추정되며 주식을 많이 마련해놓고 가무 잡희(百戲)를 연행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사전적 의미로는 가면놀이, 곡예, 요술 따위를 이르는 온갖 연희(演戲)를 말한다. 잡희(雜戲)라고도 하며 잡기(雜技)라고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항목을 보면 공놀이(弄丸), 나례(儺禮), 목발(躡趫), 무동(舞童), 불뿜기(吐火), 어룡만연지희(魚龍曼衍之戱), 유가(遊街), 재인(才人), 죽간희(竹竿戱) 등이 연희되었다. 보통 궁중의 나례희에 추천되었던 민간 예능인들의 갖가지 연희를 통칭한 것인데, 이를 고구려의 풍속에 비유하여 진도의 상례 풍속에 다시 빗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다시래기나 씻김굿이 오래된 옛 전통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가면놀이나 곡예 혹은 요술 따위의 온갖 연희가 소거되고 축소된 상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장지를 선택함에 있어, 호남은6) 의원이나 당골, 점쟁이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이목을 현혹시킨다거나 요사의 패설, 잡서의 이론을 탐내는 일 등으로 폄하하는 대목이 여러차례 등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지를 마련함에 있어 부모의 장지를 하나는 동쪽에 하나는 서쪽에 혹은 남북으로 나누어 외로운 무덤으로 만든다고 한탄한다. 처첩과 주야로 한집에 살면서 다만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김이익의 비판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부모의 묘지를 나란히 쓰는 것보다는 길지를 택한다는 점7), 혹은 섬 지역의 비좁은 땅의 활용이라는 맥락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이익의 지적을 또 하나 소개한다. 또 향상, 교의, 등롱은 앞에, 만장과 ‘翣扇’은 좌우에 있는데 이는 의장물이다. 들고 있는 사람과 상여꾼은 필히 머리에 건을 써야 하고, 상여 위에 채색을 꽂는 짓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당시 진도지역의 상여가 울긋불긋 채색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선 연재에서 근자까지 현행되었던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상여 사진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아마도 어떤 무리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상것들이 행하는) 짓거리’정도로 폄하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상여 나갈 때 북을 치며 앞에서 인도하고 큰 소리로 울며 뒤에 따라가는 것은 결코 오랑캐의 풍속이다.
이렇듯 오랑캐의 풍속이라고 개탄하는 점도 앞서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의관을 갖춘 집안에서 차마 이런 풍습을 본받겠는가?”라고 토로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이런 시선은 “애경사와 관계된 일은 더더욱 반상의 구별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김이익은 그의 표현대로라면 오랑캐적인 남도(진도를 포함한 남녘지역으로 확대해석해도 무방하다)지역의 풍속을 개화시키기 위해 ‘순칭록’이라는 저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이익이 진도 사람들을 양반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이런 비판을 했던 것일까? 아니면 당시의 진도사람들이 양반과는 상이한 평민 혹은 노비 계층의 사람들이었을까? 전술하였듯이 이 지적을 통해 역설적으로 얻게 되는 정보들이 있다. 당시 진도의 평민들은 상여가 나갈 때 북을 치며 앞에서 인도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중앙관료들 혹은 내륙 일반의 조선 사회에서는 오랑캐의 풍속으로 폄하했다. 하지만 이것이 오랑캐의 풍속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 생태와 풍토를 반영한 매우 오래된 매커니즘을 가진 의례임을 여러차례 확인하게 된다. 이는 마치 앞서 말한 백희(百戲)의 광대들이 갖은 묘기를 부리거나 연극을 꾸며 ‘죽음’이라는 사회적 손실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다시래기와 씻김굿을 포함한 상례 전반에 대해 갈등 만들기와 죽음 달래기의 연극으로 해석한 바 있다. 중복되기 때문에 거듭하여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카레스크식 구조 안에서 ‘꿔다가도 하는 지랄’을 맡은 배역을 통해 갈등 해소를 도모한다는 이론이었다.8) 상주들마저 이 걸판진 판에 끼어드는 것이 진도 다시래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 사실을 역설적으로 김이익의 저술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4.『순칭록』에 나타난 진도의 상례 풍정(風情) 우리나라 옛날 옥주(沃州, 진도의 옛 이름)는 도읍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있다. 백성은 순진하고 풍속은 순박하여 깎지 않은 통나무나 다듬지 않은 덩이 옥 같았다. 그런데 왕교(王敎)가 넉넉히 펴지기도 전에 무당과 불교가 먼저 주민을 속이고 유혹하므로 관혼상제(冠婚喪祭) 때 소박하고 정성스런 풍습이 아직 남아있으나 의문(儀文, 의례에 관한 법도)에 많이 어둡다. 그러나 군수로 부임한 자는 풍속에 따라 어루만져 보살필 뿐 고쳐서 바로잡지 못하였다. 이 지역 선비들은 간혹 개정(改正)해 볼 생각은 하였으나 주민들은 옛 풍습에 안주하여 믿고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백 년간 무지한 채 소박하고 정성스러움은 간직하였으나 문(文)은 없었다.
『순칭록』서문이다. 김이익의 비판과 나의 재비판을 가장 명료하게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서문에서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상가에서 떠들고 웃고 놀며, 다양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 상여를 울긋불긋 치장하고, 또 상여 나갈 때 노래하고 춤추고 북장구를 두드리는 전통이 사실은 옛 풍습 즉, 오래된 풍속이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풍속은 요망하고 허탄한 지관의 말에 많이 현혹된다. 자손이 零替하면 山禍탓이라 하고,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도 산화 탓, 병에 걸려도 산화 탓, 衣食이 넉넉하지 못해도 산화 탓이라 하여 기어코 묘를 옮긴다.
여기서 말하는 산화(山禍)는 묏자리가 좋지 못한 탓으로 자손이 받는다는 재앙을 말한다. 흔히 ‘산탈’이라고 말한다. 나는 전남일보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2024년 3월 15일자 칼럼에서 ‘유쾌한 풍자 영화 <파묘>’라는 제목으로 이를 다룬 바 있다. 주지하듯이 주거나 주택을 양택이라 하고 묘지를 음택이라 한다. 무라야마지준(村山智順)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귀신>이나 <조선의 풍수> 등 방대한 양의 민간전승 사례를 수집하여 보고하였다. 고묘법(顧墓法)이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보고한다.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전해진 풍수설(風水說)을 믿고 옛날부터 자손의 운명은 오로지 조상의 유해에 의해 지배되며 또 그 유해는 묻혀있는 묘지의 좋고 나쁨에 영향을 받는다. 묘지의 좋고 나쁨은 땅의 힘(地氣=生氣)을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현상만 보고 그 본질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은 보고자료임을 알 수 있다. 영화에서 이런 시선을 비판 없이 수용하거나 혹은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줄거리도 대체로 인과적인 서사가 적용되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다. 예컨대 아무리 묘를 잘못 썼다고 죽은 조상이 자신의 후손을 해칠 수 있을까? 우리네 가족 관념으로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작위적 얼개다. 감독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설정 자체가 일본군 수장의 그것과 뒤섞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성이다. 하지만 리얼한 굿판 풍경과 남녀 주인공들의 열연이 영화를 매우 풍성하게 해주었다. 이 영화의 백미나 매력은 일제강점기의 탄압과 도륙의 상기는 물론 쇼킹한 굿판 장면들과 실제를 능가하는 무당 연기력에 있지 않을까 싶다.
김이익의 『순칭록』과 연결하여 상고할 대목이 많지만, 이 부분은 따로 떼어 다루기로 한다. 풍수 중 음택과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들이 중첩되거나 충돌하는 지점들이 여럿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목이다.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현상을 오로지 현상으로만 파악한다는 점에 있다. 그 이면에 그윽하게 스며들어 있는 보다 본원적인 매커니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해당 문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이익의 『순칭록』에 대해 진도문화원 보고서 내용을 옮기다시피 2회에 걸쳐 다시 소개하는 까닭이기도 할 것이다. 진실로 폐단의 근본을 헤아려 보면 요망한 무당과 교활한 박수가 활과 화살을 만들어 선인을 수천백년 간 더러운 구덩이로 빠뜨린 짓이 아님이 없다. 이 같은 요망하고 교활한 말은 부녀자가 혹 질병과 우환에 걸렸을 때 믿고 감동하면, 가장이 당연히 냉정하게 꾸짖고 엄하게 배척하여 감히 근접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믿고 스스로 현혹되어 오히려 그들이 감히 신주를 옮기는 여부, 제사의 여부를 관여하게 한다. 슬프게도 남도의 준수한 자들은 본래 같은 彝性(타고난 떳떳한 본성)을 지녔는데도 어찌하여 지극히 슬픈 마음을 참고 어렵지 않은 일들을 포기하며 정상에 가깝지 않게 천륜 아닌 인정을 달게 받아들이는가?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도, 사당을 세워 신주를 모시는 사람은 열에 한 두 명도 없다고 지적한다. 무슨 뜻일까? 90%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사당을 짓거나 위패, 신주 등을 모시지 않고 지방(紙榜, 종이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써서 붙이는 형태)으로 대신했다는 뜻이다. 유교적 질서가 남도까지 습윤되지 않은 이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방을 써서 기제사를 모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진도 나아가 남도 혹은 호남은 의원이나 당골, 점쟁이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이목을 현혹시킨다거나 요사의 패설, 잡서의 이론을 탐내는 일 등으로 폄하하는 대목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삼년 喪中에 폐지한 奠, 장사 전날 조객을 만나는 일, 상여 위에 꽂는 채색 꽃, 상여 앞에서 북을 치는 일을 끝내 버리지 않는다면 仁天의 죄인과 亂民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두렵지 않겠는가? 나는 일부러 중언부언 대서특필하여 알리고 또 고심하며 말한 것이다.
이제 논의를 정리한다. 위에서 말한 김이익의 비판은 철저하게 사례편람이 말하는 유교 의례 중심의 시선에서 비롯되었다. 삼년상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더던가, 장사 전에는 조객을 만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던가, 상여 위에는 채색꽃을 꽂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상여 앞에서 북을 치고 노래를 하는 일을 상스럽게 여기고 있는 점 말이다. 이를 고치지 않으면 하늘에 죄를 짓고 심지어 난민(難民)을 면하지 못한다고 겁박하고 있다. 그래서 중언부언 대서특필하여 알리고 또 고심하며 말한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김이익의 이 주장을 빌려, 중언부언 대서특필하여 알리고, 말한 바를 다시 중복하여 말하여 김이익의 『순칭록』을 재비판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순칭록』은 진도의 문하생 박진종의 요청에 따라 진도 유배 6년 동안 김이익이 저술한 의례 지침서다. 고을 풍습 중 크게 잘못이 아닌 것은 제외하고 옛것을 따르라고 하면서도 사례(四禮)에 기록된 성인들의 말씀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온 고을 선사(善士)와 같은 집안 친척들이 익혀서 행한다면 성세(聖世)의 풍속으로 교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김이익의 진도 풍속에 대한 시선이나 관점은 당시 지배세력의 문화적 지향이나 지점들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장례뿐만 아니라 혼례, 상례 등 사례편람에 속하는 남도의 풍속들에 대해 언급해 두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책임을 다시 확인한다.9) 하지만 김이익의 소망대로 진도의 풍속이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다. 70여 년 후인 1873년 소치 허련이 진도군수에게 건의한 변속팔조(變俗八條)에도 ‘거전타고(擧前打鼓)를 금하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재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상여 앞에서 북을 치는 것을 금하라는 뜻이다. 이후 오늘에 이르러 상여 앞에서 북치고 노래하며 춤추는 풍속은 전남무형문화재(국가유산법에 따라 전남도도 곧 문화재라는 이름이 바뀔 예정이다)로 지정되었다. 무슨 뜻일까? 뒤집어 생각하면 중앙 혹은 내륙 지역들과는 다른 풍속이 매우 오랫동안 진도 혹은 남도 지역에 전승되어왔다는 뜻이. 200여 년 전의 『순칭록』을 통해 무엇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순칭록』은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2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속에 대해 상고할 지혜를 선물해준다. 이 풍속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의 태도나 수준, 역사를 대하는 세계관에 달려 있을 것이다.
1) 菊花(梁敬錫, 朴晉遠), 梅花(朴晉遠, 李熙黼), 漢上名家(呂圭亨, 趙秉健, 鄭萬朝, 尹喜求, 崔永年), 鐵馬城懷古(任承鈺), 登智力山(朴永培), 靑門話舊(老痴 許鍊, 松塢 金弼根, 蕙史 朴晉培) 등
2) 출전은 文藝彙稿, 大東斯文會選, 文昌吟社, 全鮮白日場會, 大東詩壇, 豐沛詩社 등이다. 3) 『성종실록』 5년 정월 15일조 4) 『북사』 권94 열전 제82 고구려조 참고 5) 『성종실록』 20년 5월 9일조 6) 진도뿐 만이 아니라 남도, 호남, 남녘 등의 호명을 하고 있다. 7) 당골이나 점쟁이가 관여하여 일러준 곳을 택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8) 졸저, 『산지와 죽은자를 위한 축제-진도 상장례와 재생 의례』, 민속원, 2018, 전반적인 내용 참고. 9) 김미경, 『진도 축제식 상장례 민속의 연희성과 스토리텔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45쪽. 글쓴이 이윤선 진도학회 회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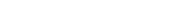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