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초대석] 소[牛] 치는 아이, 허리춤의 피리 떨어진 줄도 모르고 게시기간 : 2024-08-19 07:00부터 2030-12-17 21:21까지 등록일 : 2024-08-12 11:24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명시초대석
|
||||||||
|
지금도 생각나는 교과서 속 문학작품들이 있다. 당시에는 그것들이 문학작품이라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글이므로 선생님 해설을 잘 듣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도 가끔은 그 나이의 감수성을 흔드는 작품들이 있었다. 청소년기를 돌아볼 때 먼저 떠오르는 글이 오영수의 <요람기>이다. <요람기>의 앞부분과 끝부분이다. “…기차도 전기도 없었다. 라디오도 영화도 몰랐다. 그래도 소년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마냥 즐겁기만 했다. 봄이면 뻐꾸기 울음과 함께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고, 가을이면 단풍과 감이 풍성하게 익는, 물 맑고 바람 시원한 산간 마을이었다. 먼 산골짜기에 얼룩덜룩 눈이 녹기 시작하고 흙바람이 불어오면, 양지 쪽에 몰려 앉아 볕을 쬐던 마을 아이들은 들로 뛰쳐나가 불놀이를 시작했다. …(중략)… 언제나 가보고 싶으면서도 가 보지 못하는 산과 강과 마을, 어쩌면 무지개가 선다는 늪, 이빨 없는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다는 산 속, 집채보다도 더 큰 고래가 헤어 다닌다는 바다, 별똥이 떨어지는 어디쯤... 소년은 멀리멀리 떠가는 연에다 수많은 꿈과 소망을 띄워 보내면서, 어느새 인생의 희비애환과 이비(理非)를 아는 나이를 먹어버렸다.”
작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년의 성장기(成長記)이다. 산업화 시기, 또는 그 이전 시골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대개 이랬다. 산과 들을 헤집고 다니다 멀리 보이는 산 너머 어딘가를 상상하고, 누군가가 꺼낸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를 보태 함께 환상에 빠져들던 풋풋한 얼굴들. 즐겁기만한 오늘 뒤에 걱정스런 내일이 있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생임을 알면서 소년은 어른이 되어 왔다. 전통시대 시골 아이들의 일상은 어땠을까. 한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소[牛]치는 아이’이다. 소는 농가의 소중한 재산이자 노동력의 원천이었다. 그런 만큼 잘 먹이고 병이 없게 해야 했다. 가까이에서 관리하며 소죽을 끓여 먹였지만 이것으로 부족했다. 시간 날 때마다 산과 들로 데려가 충분한 풀을 먹여야 했다. 집집마다 이 일은 아이들의 몫이었다.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담은 제호 양경우(梁慶遇, 1568~?)의 ‘<목우곡>’을 보기로 한다. 먼저 시인에 대해 소개한다.

김홍도, <경작도>, 삼성미술관 리움

김득신, <목동오수>, 간송미술관 양경우의 본관은 남원이고 자는 자점(子漸), 호는 제호(霽湖)이다. 임진왜란 때 부친 양대박(梁大樸)을 따라 아우 양형우(梁亨遇)와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부친의 명에 따라 고경명의 아래에 가서 서기(書記)가 되었다. 1595년에는 명군(明軍)의 군량 조달을 위해 격문(檄文)을 지어 곡식을 모집했다. 이때 불과 10일 만에 도내에 7천 여석을 모아 조정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후 참봉으로 별시문과에 급제했고 광해군 8년(1616)에는 문신 중시(重試)에 뽑히기도 했다. 인목대비 폐비 논의가 한창일 때 아우 양형우가 항의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고향 인근 제암(霽巖)에 집을 지어 생활하면서 제호(霽湖)로 호(號)를 삼았다.
양경우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200년이 지난 1796년, 정조(正祖)는 전교(傳敎)를 내린다. 부친 양대박의 숭고한 거의(擧義)가 고경명, 이순신보다 못하지 않은데, 은전이 제대로 베풀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병조판서를 증직하고 시호를 내리라고 한다. 아울러 내각(內閣)에 있던 양대박의 문집 『청계집』을 보내 판본을 만들어 인쇄하고 양경우의 『제호집』도 함께 올리라고 한다. 3년 뒤 1799년 양대박, 양경우, 양형우 부자의 유문(遺文)을 모은『양대사마실기(梁大司馬實記)』가 11권 5책으로 간행된다. 양경우는 시를 잘 지었을 뿐 아니라 시에 대한 감식안도 높았다. 시화집 「제호시화」로 유명한데, 이전 시 비평에서 진일보하여 성률, 체재, 형식 등을 다루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목우곡>이다. <牧牛曲>
늙은 소 언덕의 풀 실컷 먹고는 맑은 시내 길가에 편안히 누워있네 산중을 뛰어 곳곳의 무덤 다 돌고 고개 숙여 백양나무에 뿔을 가네 아이는 고삐를 당기느라 끙끙대다 허리춤의 피리 떨어진 줄도 몰랐네 푸른 산 돌아가는 길 날은 금세 저물고 옅은 안개는 저물녘 햇살과 뒤섞이네 풀피리 만들어 몇 곡조 불어보지만 팥배나무 잎 여려 불어도 소리 나질 않네 老牛飽厭原頭草 頹然臥睡淸溪道 走山遶盡纍纍墓 低頭礪角白楊樹 小兒引轡引不得 未覺逬落腰間笛 靑山歸路日易夕 細靄半雜斜陽明 欲翦草笳成數曲 棠梨葉軟吹無聲 소를 치며 하루를 보내다 돌아오는 아이의 일상을 다룬 작품이다. 이 시는 한가로이 쉬고 있는 소의 동작을 스케치하면서 시작된다. 배부름을 누리는 소를 볼 때 아이는 일찍부터 소를 데리고 온 것 같다. 소가 풀을 먹고 누워있는 시간은 아이에게도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아이는 산언덕 이곳저곳으로 걸음을 옮기며 꽃과 풀을 보고 만졌으리라. 아이의 호기심이 무료함이 될 무렵 소가 기운을 내기 시작한다. 아이의 호기심이 소에게로 옮겨간 것일까. 소는 몇 줄기 풀을 뜯더니 터벅터벅 걸음을 옮겨간다. 걸음이 빨라진다. 건너편 풀밭을 향해 달려간다. 총총한 언덕배기 무덤들 주위를 한 바퀴 돈다. 그러더니 무덤들 가장자리 오래된 백양나무 줄기에 뿔을 부벼댄다. 저 녀석이 또 어디로 가려고 저러는지. 아이는 재빨리 달려가서는 소의 고삐를 당긴다. 소는 버티고 소년은 있는 힘을 다한다. 그 사이 허리춤에 끼웠던 피리가 풀밭에 떨어진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소년은 겨우 소를 진정시킨다. 숨을 돌리고 고개를 드니 해가 서편 하늘 위에 와 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 습한 기운이 더하고 산 냄새도 짙게 느껴진다. 소 등에 앉아 피리나 불며 집에 가야지. 허리춤에 손을 가져가는데 피리는 오간 데 없다. 조금 전 한바탕 소동 중에 흘렸으리라. 짜증스런 마음에 소에게 화풀이를 해보지만 무심한 소는 큰 눈만 껌뻑인다. 마음을 삭이며 내려가는 길. 늘어선 팥배나무 이파리 하나를 딴다. 풀피리를 만들어 불어보지만 여린 잎이라 소리도 나지 않는다. 몇 번을 시도하다 이파리를 길 밖으로 휙 던져 버린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날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는 사이 소와 함께 동네 어귀에 들어서는데 해는 벌써 산을 넘어 갔다. 멀리 집이 보인다. 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른다. 어머니가 사립문 밖에서 나를 향해 손짓을 한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또 저물어간다.

심사정, <계변수우(溪邊水牛)>, 간송미술관

김홍도, <목우도>, 삼성미술관 리움 소는 인간과 자연의 경계에서 가장 인간화된 동물이다. 소가 우리 생활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은 농사에 이용되면서부터다. 한반도에서는 신라 지증왕(智證王) 3년에 우경(牛耕)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밭을 갈고 물건을 나르는 등 쓸모가 많아지면서 생태나 번식이 국가적 관심 사항이 되어 갔다. 때로는 소와 관련된 사건이 국가 미래에 대한 어떤 징조(徵兆)로 해석되기도 했다. 백제 온조왕(溫祚王) 때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몸이 두 개인 것을 두고 이웃나라를 합병할 길조라 해석하는가 하면,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에는 소가 세 마리의 새끼를 낳자 국가적 경사의 조짐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말(麗末)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소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 사대부들은 도(道)를 펼칠 상황이면 나아가 벼슬하고, 도를 펼치기 어려우면 물러나 수신독서를 한다[用行舍藏]는 출처(出處)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념상의 공간도 벼슬길과 전원(田園)으로 뚜렷한 분화를 보인다. 이 구도에서 ‘소’는 전원의 공간을 상징하게 된다. 벼슬길은 정치적 풍파와 고단한 업무의 연속이었다. 이 때 정서적 위안의 가장 쉬운 방법이 유년을 보낸 전원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전원은 언제나 멀고, 그립고, 돌아가야 할 곳이었고, 그러한 마음을 펼치는 작품 속 전원은 목가적(牧歌的) 이상향(理想鄕) 그 자체였다. 후대에는 이러한 전원이 틀에 박힌 풍경화처럼 천편일률화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양경우의 <목우곡>은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평온한 정경 가운데 생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소는 넓은 자연에서 한가로이 풀만 뜯고 있지 않다. 배불리 먹고 충분히 쉬고 좌충우돌하며 풀밭을 다닌다. 소년의 통제를 벗어나 한번쯤은 자연을 향한 본능을 발휘하려 한다. 소년의 모습도 색다르다. 소를 풀어 놓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어디로 갈지 모를 소를 잡아 놓느라 기운이 다 빠졌다. 소 등에 걸터앉아 피리를 불며 집에 오려던 계획도 틀어졌다. 모두가 소 탓이라는 생각에 화도 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 마음을 다독이며 딴 이파리마저 도톰한 울림판이 되질 못한다. 이래저래 되는 일이 없는 날 뿔난 소년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작품을 보며 소년의 ‘건강한’ 삶을 생각한다. 소년에게 오늘은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날이다. 소는 제멋대로 하려 하고 허리춤의 피리는 오간 데 없다. 산을 내려올 때에는 풀피리를 만들 여건도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몇 가지 난관(難關)을 풀어 가는 발전이 있었다. 제멋대로 다니려는 소를 진정시켰다. 힘겨루기를 했지만 가족처럼 친숙한 소를 달래는 무언가도 있었을 것이다. 아끼던 피리를 잃어버렸지만 체념하는 것도 배웠다. 나무래 봤자 소는 영문을 알지 못한다. 굳이 밖에서 이유를 찾을 것 없이 마음 안에 삭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풀피리 만드는 것마저 쉽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날도 있다고 돌려버리는 대범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설사 짜증이 풀리지 않았더라도 멀리 보이는 집과 어머니의 손짓은 종일 불편했던 감정을 다 잊게 하지 않았을까. 전통시대의 아이들은 이렇게 상황을 돌파하고 감정을 추스리며 어른이 되어갔으리라. 양경우의 <목우곡>은 짧은 시편 속에 한 소년이 정신적인 나이테를 더해 가는 모습을 잘 담고 있다. 교육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다. 교육 내용도 풍부하고 교육 방법도 다양하다.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늘 어렵다. 때로는 과잉 개입을 하다가 문제만 키우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아이를 내버려두라고 말하지만 당장에 가능한 방법도 아니다. 아이에게 부족한 것은 질 높은 교육 내용도 명쾌한 교육 방법도 아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를 성장시켰던 그 지점에는 부모님의 ‘기다림’이 있었다. 기다림이라는 보장된 여유 안에서 우리는 헤매며 스스로의 길을 찾아 왔다. <목우곡>의 아이는 ‘긴 하루의 시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감정을 다독였다. 불가피한 노동의 분담이기도 했지만, 아이에게 맡기고 보장한 이 시간은 곧 아이가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시대든 자녀 교육은 최대의 난제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라는 점에서, 아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시대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글쓴이 김창호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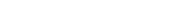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소[牛] 치는 아이, 허리춤의 피리 떨어진 줄도 모르고](https://www.hiks.or.kr/attach/newsletter/20240812112056HQDvH7ueIUwlaEeq8ds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