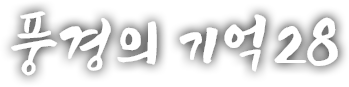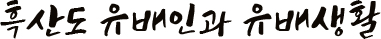[풍경의 기억] 흑산도 유배인과 유배생활 게시기간 : 2020-12-05 07:00부터 2028-12-19 21:00까지 등록일 : 2020-12-03 09:55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풍경의 기억
|
||||||||
|
나인[內人]1)도 유배를 가나? 최고 시청률 55.5%, 본격적인 한류의 탄생을 알린 명품사극 대장금!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있을 드라마이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면 대장금이 한상궁과 함께 제주도로 유배 가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대장금의 신분은 수라간 나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역모의 모함을 받아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의문 하나. “나인들도 유배를 가나?” 대개 양반들이나 가는 줄 알았던 유배길에 나인이 나서니까 갖게 되는 의문이었다. 팩트는 “그렇다”이다. 유배는 양반만 가는 것은 아니었다. 유배는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다섯 형벌 중 하나였다. 이런 형벌에 대한 법은 『경국대전』에서 완성되었다. 『경국대전』 「형전(刑典)」 에 의하면 “유(流)란 사람이 중한 죄를 범한 경우 차마 사형까지는 못하고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고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형”이라고 하였다. 유배는 사형 다음가는 무거운 형벌이었다. 이처럼 유배는 형벌의 하나였기 때문에 평·천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인도 당연히 유배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유배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하였다. 여기서는 조선 후기 흑산도 유배인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섬 주민과 유배인의 갈등 흑산도 유배인 가운데 유배생활의 단면을 엿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 흥미롭다. 조선시대 최초의 유배 기록이기도 한데, 이첨한(李瞻漢)·김필명(金必鳴)과 이만초(李晩初)의 다툼이 특기할만하다. 이첨한·김필명 등은 이미 흑산도에 정배되어 와 있는 상태에서 나주목에 연명하여 소장을 올렸다. 그 내용은 역시 같이 흑산도에 귀양살이하고 있던 이만초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았다. “귀양살이하는 천얼(賤孼) 이만초란 자가 국가를 원망하고 조정을 비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금년 봄에도 호서(胡書)를 가지고 백성들을 공갈하였고, 또 섬사람들과 작당하여 계를 맺고, 장부(丈夫)의 일을 하고자 한다고 일컬으면서 장수를 뽑아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2)
이런 소장을 접한 나주목사는 이를 중앙에 보고하였다. 이에 이들을 잡아들여 국문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작성된 이만초의 공초를 살펴보면, “이첨한은 섬 주민들을 침학하는 짓이 끝이 없었다. 섬 주민들이 12건의 죄상을 본 섬의 별장 김성흘(金成屹)에게 글을 올려 호소하였다. 김성흘은 생각하기를, ‘이첨한이 본래 화를 잘 내는 증세가 있는 사람으로 심하게 책망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이로 인해 그의 종 순방(順方)을 다스렸습니다. 김성흘이 처음에 순영에 전보(轉報)하려고, 저와 최계민(崔繼敏)으로 하여금 섬사람들이 호소한 바에 의거하여 진서(眞書)로 번역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원한을 품고 모해하려고 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김시현(金時現)이란 자가 처음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섬의 주민들과 함께 계를 만들어 혹은 모여서 마시기도 하고, 혹은 모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곡식을 바꾸기도 하였으나, 혹은 풍속을 손상시키거나 풍속을 어지럽힌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여 벌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이를 글로 적어 회문을 내었는데, 뜻하지 않게 김시현이 그날의 회문을 바쳤습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공초에서 언급된 김시현은 바로 이첨한의 여종의 남편이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본 관리들은 “이는 반드시 이첨한이 김시현을 교사하고 부추겨서 무함(誣陷)하려는 계교였다”라고 평하였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섬에 정배된 유배인들이 오히려 섬의 토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이첨한에게서 확인할 수 있고, 별장도 쉽게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그 위세가 막강하였다는 점도 엿볼 수 있다. 유배인은 섬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분리 관리되던 유배인 섬에 유배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립되게 된다. 그들이 왕래하거나 의견을 교환한다면 또 다른 위협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차단시키는 게 일상적이었다. 1775년(영조 51) 11월 25일의 기록을 보자. 당론으로 인하여 비록 시차는 있지만 흑산도에 같이 유배된 박성원(朴盛源)과 이적보(李迪輔)의 경우에 왕이 직접 선전관을 흑산도에 보내어 천극(荐棘, 위리안치)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들이 사적인 편지글을 서로 통한다든지 음식물을 보내 주는 것들을 특별히 신칙하여 엄단하도록 하였다.3) 그때 흑산도에는 같은 사건으로 황택인(黃宅仁)도 유배되어 왔었다. 그런 터에다 다시 12월에 심상운(沈翔雲)까지도 유배를 갔다. 왕은 특히 심상운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래서 “이(심상운의 정배)는 흑산도에다 호랑이를 기르는 셈이다”라고 하여 두려움을 표했다. 그리고 “이 섬에 천극한 죄인 가운데 황택인은 비록 말할 것이 없지만 박성원과 이적보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늦추어지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제 심상운을 더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무리들이 이 하교를 들으면 자결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고 하여 마침내는 그의 자결을 유도하기에 이른다.4) 다만 자결하지는 않았다. 흑산도에 위리안치시키고 영구히 서민으로 삼게 하였다.5) 또 1777년(정조 1)에는 대사간 윤홍열(尹弘烈)이 “북로(北路)에 홍지해(洪趾海)·홍술해(洪述海)·심익운(沈翼雲) 등 여러 역적이 같은 지역에 함께 귀양 가 있어서 광혹(誑惑)시켜 선동할 우려가 있으니, 해도(海島)에 분배시키소서6)라는 상소를 올렸고, 이에 정조는 특교를 내려 이들을 절도로 나누어 유배하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홍지해는 추자도로, 홍술해는 흑산도로, 심익운은 제주도로 각각 이배시켰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유배인들간의 연계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조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배인들은 유배되어 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역옥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1777년(정조 1)에 홍술해·홍찬해 등은 이찬(李禶)을 추대하여 반정을 꾀하려 한 일당으로 지목되어 죽음을 당하였다.7) 즉 홍술해는 귀양갈 때 부적과 주문을 간직한 일이 문제가 되었고, 홍찬해는 1776년(정조 원)에 흑산도로 유배되었을 때 비부(婢夫) 복룡(卜龍)이 의복과 서찰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중에 홍상길(洪相吉)의 서찰에다 반역의 음모에 답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런 사정들을 보면 역옥사건 관련자들이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서로 연계될 여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하여 자결을 유도하기도 하고, 유배지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잡아들여 죽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유배인들의 내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또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사안이나 해당 인물의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었겠지만, 유배인이 섬 주민을 만나는 것이 허용된 사항은 아니었다. 따라서 유배인의 섬 주민에 대한 영향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유배 기간이 길어지고 중앙의 관심도 소홀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고 활동 영역도 넓어졌을 가능성은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항 역시 묵인될 뿐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 손암(巽庵) 정약전(丁若銓)과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의 유배생활 한편 고급 지식인들의 눈을 통해 들여다본 흑산도 주민들의 풍속은 유교적 질서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간 이징명(李徵明)은 “섬주민들이 대개 삼년상(三年喪)을 거행하지 않고 기년(期年, 즉 1년)만에 복(服)을 벗었고, 또 어버이를 장사하지 않아 백골로 쌓여 있는 것이 이미 풍속이 되어 있었다”8)라고 묘사하여 장례문화의 한 단면을 지적하자, 숙종은 거듭 경계의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유배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교문화가 섬에 조금씩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섬 주민들의 풍속을 전면적으로 바꿀 만큼 지속적이지는 않았다. 조선 후기 흑산도는 정약전(1758~1816)과 최익현(1833~1906)의 유배지로 더욱 잘 알려졌다. 정약전은 다산 정약용의 둘째 형으로 1801년(순조 1) 신유옥사 때 흑산도로 귀양 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흑산도에 머무는 동안 문순득(文淳得)이라는 우이도 사람의 표해 사실을 정리한 『표해록(漂海錄)』과 어류 및 해산물, 섬의 풍속 등을 정리한 『자산어보(玆山魚譜)』를 편찬하였다.
한편 최익현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반대하는 ‘오불가척화의(五不可斥和議)’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흑산도에 유배되었다. 그는 먼저 우이도로 왔다. 그 유배 일정을 보면, 그는 1876년 9월 무안읍에 도착하였고, 9월 10일 다경포진을 출발, 암태, 팔금, 기좌, 도초, 비금을 거쳐 9월 16일에 우이도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이도에 도착한 그는 문인주(文寅周)의 집에 위리안치되었다. 그후 언제인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흑산도로 옮겼다. 흑산도에 온 그는 처음 진리(鎭里)에서 일신당(日新堂)이라는 서당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뒷편에 있는 의두암(倚斗岩)이라는 바위가 그와 연관되어 있다. 다시 면암은 천촌리(淺村里)로 옮겨 지장암(指掌岩)에서 교화에 전념하였다. 현재 유허에는 “기봉강산(箕封江山) 홍무일월(洪武日月)”이라는 그의 친필글씨가 새겨져 있고 그 앞에는 1924년 9월 문하생 오준선(吳駿善)이 짓고 임동선(任東善)이 쓴 「면암최선생적려유허비(勉庵崔先生謫廬遺墟碑)」가 세워져 있다.9)
나인, 관노, 거간꾼, 책장수, 중들의 유배 흑산도 유배인들을 보면, 아무래도 당론(黨論)에 연루된 양반 사족들이 많았지만, 관노, 나인, 거간꾼, 책장수, 여종, 중 등 실로 다양한 신분과 직종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배인만 해도 130명이 넘었다.10) 양반 사족들 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흑산도까지 유배 왔을까?
주로 역옥(逆獄)에 연좌되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시기도 영조대에 집중된다. 숙종대에는 한 사례가 보인다. 즉 서제(書題) 이덕흘(李德屹)이 당고개(堂古介)에서 처형당했는데, 이유는 포도청 군관인 그의 아들 이지훈의 죄를 면하게 하려고 내관(內官) 최상앙(崔尙仰)에게 포도대장의 말이라 사칭하여 부탁했던 일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일에 연루되어 그 누이인 나인(內人) 정숙(正淑)이 흑산도로 정배되었다.11) 이어 영조대에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흑산도로 유배 왔다. 그 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역적 심정연(沈鼎衍)은 시권(試券)에 패악하고 흉한 말을 적어 낸 일로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죄를 지어 극형에 처해졌는데, 그의 처는 그 역적죄에 연좌되어 법에 없는 법까지 동원하여 흑산도의 노비로 보내졌다.12)
② 동궁이 낙상(洛傷)한 데 대한 죄를 물어 중관(中官) 유인식(柳仁植)·서태항(徐泰恒)·최성유(崔聖兪) 및 승전색 홍석해(洪碩海)는 모두 멀리 정배하는데, 특히 나인(內人) 득혜(得惠)는 대정현(大靜縣)으로 정배하되 배도압송(倍道押送)하라 하였다가 다시 흑산도(黑山道)로 바꾸어 보냈다.13) 나인이 가장 큰 벌을 받았다. ③ 이천(利川)의 백성인 이득룡(李得龍)은 그 수령에게 원망을 품고 흥화문(興化門) 기둥에 익명서(匿名書)를 붙여 무고(誣告)한 죄로 흑산도에 정배되었다.14) ④ 제주 사람 조영득(趙榮得)의 첩 월중매(月中梅)를 간통죄로 흑산도에 보내어 계집종으로 삼게 하였다.15) ⑤ 장흥의 세선(稅船)을 고의로 파선시킨 선리(船吏)와 뱃사공[梢工]을 흑산도로 보내 종으로 삼게 하였다.16) ⑥ 오득(五得)은 중관의 고군(雇軍)인데 어의(御衣)를 도둑질한 죄로 포도청에 명하여 곤장 1백 도(度)를 가하고, 흑산도에 보내어 종으로 삼게 하였다.17) ⑦ 여러 시전 상인들의 재물을 침탈한 환노(宦奴) 성욱(成郁)은 곤장 50대를 쳐서 흑산도의 관노로 삼도록 하였다.18) ⑧ 주인(朱璘)의 『명기집략(明紀輯略)』19)이란 망측한 책을 사 가지고 온 이희천(李羲天) 및 책 거간꾼 배경도(裵景度)는 청파교(靑坡橋)에서 효시하게 하여 강변에 3일 동안 머리를 달아 놓도록 하고, 그들의 처자[妻孥]는 흑산도에 관노비로 영속(永屬)하게 하였다. 책 장수 8인도 흑산도의 종으로 삼게 하였다.20) 또 역관 고세양(高世讓)의 두 아들도 흑산도로 귀양보냈다.21) ⑨ 내의(內醫) 허온(許溫)의 처를 그 지아비의 천첩(賤妾)을 투기(妬忌)하여 참형(慘刑)을 많이 썼다는 죄로 흑산도에 정배하였다.22) 정조대에도 몇몇 사례가 확인된다. ① 입번(入番)한 액정서의 하례(下隸)인 조덕창(趙德昌)은 궁궐 담장을 넘어가는 짓을 했기 때문에 흑산도에 충군하였다.23)
② 대역 죄인 강용휘(姜龍輝)의 딸인 월혜(月惠)는 차비 나인(差備內人)인데, 여러 해 갇혀 있다가 이때 흑산도에 보내어 노비로 삼게 하였다.24) ③ 대역부도(大逆不道)한 죄인 김하재(金夏材)의 아들, 딸, 조카들을 연좌죄로 인하여 진도, 남해 등지로 보내 종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의 아내 임이(任伊)는 흑산도의 여종으로 삼았다.25) ④ 1785년(정조 9)에 문광겸(文光謙)·홍복영·이율(李瑮) 등의 모반에 대한 국문 과정에 나온 이야기로 구례 화엄사의 중 윤장(允藏)이 일찍이 그 절에 『정감록(鄭鑑錄)』을 숨겨둔 죄로 흑산도에 귀양 갔다고 되어 있다.26) 이런 예들로 보아 궁녀인 나인이 유배를 가는 일은 그 자체로는 팩트이다. 다만 장금이가 제주도로 유배 갔다는 기록은 없다. 1) 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왕과 왕비의 시중을 드는 정5품 상궁(尙宮) 이하의 궁인직(宮人職)으로 계급별로는 상궁·나인·애기나인 등이 있다. 통상 애기나인이 관례(冠禮)를 치르면 나인이 되는데, 직책에 따라 지밀(至密)나인·침방(針房)나인·수방(繡房)나인·세수간(洗水間)나인·생과방(生果房)나인·소주방(燒酒房)나인·세답방(洗踏房)나인의 7개 분야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궁중 안살림을 분담하였다. 궁녀가 바로 이들이다.
2)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1693) 1월 9일 1번째 기사 3) 『영조실록』 125권, 영조 51년(1775) 11월 25일 2번째 기사 4) 『영조실록』 126권, 영조 51년(1775) 12월 23일 5번째 기사 5) 『영조실록』 127권, 영조 대왕 행장(行狀) 6) 『정조실록』 3권, 정조 1년(1777) 1월 16일 3번째 기사 7) 『정조실록』 4권, 정조 1년(1777) 8월 11일 1번째 기사 8) 『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1694) 10월 13일 2번째 기사 9) 『黑山島 「流配文化公園」 造成 학술조사보고』(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3. 12) 참조 10) 구체적 명단은 같은 책, 26∼30쪽에 정리되어 있다. 11) 『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1693) 4월 3일 2번째 기사 12) 『영조실록』 84권, 영조 31년(1755) 5월 4일 1번째 기사 13)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1757) 11월 13일 1번째 기사 14) 『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1762) 12월 19일 4번째 기사 15) 『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1763) 11월 20일 2번째 및 3번째 기사 16) 『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1769) 11월 13일 1번째 기사 17) 『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1770) 5월 27일 1번째 기사 18) 『영조실록』 116권, 영조 47년(1771) 2월 1일 7번째 기사 충군하거나 관노로 삼게 하는 것은 유배형과는 다르나 도역(徒役) 장소가 멀 때는 유배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도형은 대개 3년 이하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유형지보다는 가까운 곳에 배치되었다. 따라서 흑산도로 보내 종으로 삼거나 충군하는 경우는 유배에 준하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겠다. 19) 『명기집략』은 청나라 주인(朱璘)이 지은 역사서로 이인임이 이성계의 아버지라고 황당한 설정을 하여 문제가 되었다. 20) 『영조실록』 116권, 영조 47년(1771) 5월 26일 1번째 및 2번째 기사 21) 『영조실록』 116권, 영조 47년(1771) 6월 11일 1번째 기사 22) 『영조실록』 118권, 영조 48년(1772) 5월 5일 3번째 기사 23) 『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1776) 4월 10일 5번째 기사 24) 『정조실록』 13권, 정조 6년(1782) 4월 9일 3번째 기사 25) 『정조실록』 118권, 정조 8년(1784) 7월 29일 3번째 기사 26) 『정조실록』 19권, 정조 9년(1785) 3월 16일 1번째 기사 이후에는 주로 역옥, 당론, 상소, 부정부패 등의 사유로 유배형이 집행되어 그랬는지 주로 양반 관료들이 대상이 되었고, 하층 신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글쓴이 고석규 목포대학교 前 총장, 사학과 명예교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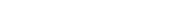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