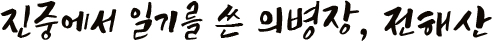[미지의 초상] 진중에서 일기를 쓴 의병장, 전해산 게시기간 : 2020-08-20 07:00부터 2030-12-17 21:21까지 등록일 : 2020-08-18 16:55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미지의 초상
|
||||||||
|
마을 어른이 울면서 나에게 말하였다. “대한의 형세가 이미 글렀는데 그대는 어떻게 하려는가.” 나는 말하였다. “이 뒤의 일이야 어찌될 줄 알겠습니까. 그저 있는 힘을 다해 볼 따름입니다.” 어른은 말하였다. “내야 비록 감동하여 울지만 그대는 눈물 한 방울도 내지 말라. 언제나 눈보라 치는 밤이면 우리 해산이 지금 어디 있는가, 추워서 어떻게 견디는가, 밥이나 먹고 다니는가 하여 온 생각이 그대에게 쏠린다.”1)
(1909년 정월 24일 일기) 大韓之事去矣 君終何以圖之 此後時事 不知何如 盡力圖之 余雖感而泣 君勿出一適也 凡於風雲之夜 每想吾海山 今在何處 寒乎暖乎 飢乎食乎 念存于君 1907년 10월 장성 수연산에 깃발을 올린 호남창의회맹소의 영수는 기삼연 의병장이었다. 전투 중 발을 다친 기삼연은 엉금엉금 기어갈 수밖에 형편에서 지휘권을 부하에게 넘기고, 순창 복흥면의 모처로 숨었다. 1908년 1월 1일 설 날, 일경은 기삼연의 은신처를 포위 수색했다. 1월 2일 기삼연을 체포한 일경은 들 것에 실어 담양에서 광주로 이송했다. 길가에서 이를 본 광주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때 호남창의회맹소의 선봉장 김태원 부대는 무등산 뒤 무동마을에서 일군과 접전하고 있었다. 김태원 부대가 일군을 물리치고 급히 광주로 진군했을 때는 이미 기삼연 의병장이 광주경무소에 구금된 이후였다. 1월 3일 광주천변에서 총성이 울렸다. 흩어진 ‘호남창의회맹소’의 의병들을 다시 결집한 이는 김태원 선봉장이었다. 신출귀몰. 김태원 의진을 포획하기 위해 일군은 경상도의 병력까지 동원하여 광주에 투입하였다. 김태원 의병장은 왜놈들을 몰아내지 못한 한을 품고 1908년 4월 25일 어등산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 무렵 ‘호남창의회맹소’에 합류하기 위해 전북에서 달려온 젊은이가 있었다. 전해산이었다. 전해산이 광주에 도착했을 때는 기삼연도 없고 김태원도 없었다. 조경환 의병장이 흩어진 의진을 수습하는 상황이었다. 전해산과 조경환은 이후 각자 독자적인 부대를 지휘하면서 서로 긴밀히 공조하며 호남 의병을 이끌었다. 1908년 그 해 겨울 12월, 조경환 의병장이 어등산에 전사하자 이제 호남창의회맹소를 지휘하는 역할이 오롯이 전해산의 어깨에 달리게 되었다. 전투 중에도 전해산은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였다. 1909년 1월 17일 일기는 아버님과의 비밀상봉을 적고 있다. “아침에 아버님을 뵙고 집안일을 여쭈었다. 이석용의 거처를 물었다. 예전 일들이 생각나서 견딜 수 없었다. 종일 부모님 곁을 모시고 싶었으나, 군사상 불비한 점이 염려되어 물러나 돌아왔다.”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는 의병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매일 고단한 행군을 하였으니, 한 끼도 건너 뛸 수 없었다. 일어나면 밥을 먹어야 했고, 해가 지면 또 밥을 먹어야 했다. 집도 절도 없는 의병이 삼시 세끼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진중일기》는 밥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기록을 하였다. 8월 21일-이 씨의 제각에서 유숙하고 산 아래 마을 사람으로 하여금 밥을 지어 오게 하여 아침밥을 먹었다.(令山下村人 炊飯輸來)
9월 11일 일기는 한사동(寒士洞)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다. 비가 내려 군사들이 추위에 떨었고, 무생동 마을 사람으로 하여금 밥을 지어 실어 오게 하였는데 무생동 마을 사람들은 명령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나 보다. 의병의 끼니를 담당하는 호군장이 보고하였다. “저녁밥을 달라 했더니 한 그릇도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먹이는데 쓸려고 소를 끌고 왔습니다.” 고생하는 의병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무생동 주민의 비협조는 분명 괘씸한 소행이었으나 밥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백성의 소를 끌고 온 것 역시 정당한 처사가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소 임자가 와서 울며불며 통곡하였다. 자식 놈 장가 밑천으로 키운 소를 징발하면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해산은 돈 60냥과 고기 3근을 내주게 하였다. 10월 9일 일기에는 닭 한 마리를 훔친 죄로 군사에게 매를 때리는 기사가 있다. “‘군인이 촌으로 흩어져 마을 닭을 사냥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빨리 잡아 오게 하여 매를 때려 놓아 보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어선 의병이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을 괴롭히면 의병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주민의 닭 한 마리도 함부로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의병의 군율이었다. 백성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었지만 백성에게 민폐를 끼쳐서도 안 되는 것이 의병의 군율이었다. 이 엄격한 군율을 얼마나 지탱하느냐, 이것이 의병이 넘어서야 하는 두 번째 과제였다. 의병이 직면한 세 번째 곤란은 무기였다. 의병들의 구식 화승총은 무기라고 보기엔 너무 초라하였다. 신식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총 쌈을 하는 것은 맨몸으로 달려드는 것과 같았다. 의병의 기본 화기는 화승총이었다. 이 총은 화승에 불을 붙이고 철환과 화약을 비벼 넣어 사격을 한다. 우천 시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사격이 곤란하다. 유효 사거리는 12미터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일본군의 3.8식 소총은 사거리가 360미터이고 매분 8-10발씩 사격할 수 있었다. 1908년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의병이 직면한 네 번째 곤란은 추위였다. 의복은 변변치 못해 추위가 살을 뚫었다. 잠은 산 속 제각에서 잤다지만, 잠자리는 늘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인을 시켜 불을 피우게 하고 자리를 마련하게 했다. 집이 몹시 좁아 다 유숙하지 못하고 절반은 한데서 잤다.”(9월 1일)고 적었다. 일기는 “군사들이 춥고 배고파서 견디지 못하므로 벼를 방아에 찧어 밥을 짓게 하였다.”(10월 16일)고 적었다. 배고픔과 추위는 의병의 숙명이었다. 행군은 밤중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황혼을 타고 행군하여 산으로 들로 허덕이며 돌에 부딪치고 가시덩굴에 찔리면서 밤이 깊어서야 겨우 덕령에 이르러 밥을 먹었다.”고 일기는 썼다. 고난의 행군이었다. 그런 고단한 삶 속에서도《진중일기》는 전해산의 시심(詩心)을 전하고 있었다. “강 위의 고기 잡는 등불이나 나뭇가지의 벌레 소리가 모두 내 마음을 슬프게만 한다.”(江上漁火枝梢虫音 無非感傷我心) 10월 2일 일기는 적는다. “단풍은 마치 웃음을 띠고 환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대면서 산중의 취미란 왕자에 비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겠다.”(楓人殆若含笑迎接 撫孤松而盤桓 山居氣味 始知南面之比也) 1909년 윤2월 전해산의 부대는 부안의 바닷가를 이동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에 문 밖을 나가 큰 바다를 바라보니 물빛이 하늘과 연접하고, 바람과 물결은 눈(雪)을 나부끼게 하는 듯하여 한참 구경하는 동안 마치 조화의 경계에 노니는 것 같았다.”(윤2월 5일) “비록 오래오래 감상하고 싶지만 이것 역시 그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는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큰 바다를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떠올리는 전해산의 머리에서 소동파의 시구가 스쳐지나가고 있었다. 윤2월 9일의 일기다. 달빛은 새파랗고 바닷물은 아득만 하니 “한 바다에 좁쌀 하나 격이라.(渺滄海之一粟) 끝없이 흐르는 강물을 부러워하며(羨長江之無窮) 우리네 인생의 덧없음을 슬퍼하노라.(哀吾生之須臾)”는 저 소동파(蘇東坡)가 참으로 바다를 알았다고 하겠다.
전해산은 어느 바위 위에 걸터앉아 일행들에게 말했다. “이 반석은 술잔을 나누며 시를 읊을 만하다.”(此石可傳觴呤詩) 그랬더니 김공삼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어느 시절에 다시 좋은 세상을 만나서 노닐 수 있을까요?”(今則已矣 何時更逢好世界) 이제 마지막으로《진중일기》가 남긴 눈물겹도록 가슴 애린 장면을 보도록 하자. 2월 18일의 일기다. 결코 픽션이 아닐 것이다. 궁관산 아래 궁관촌을 찾아가는데 바람이 점점 더하고 횃불은 비로 꺼졌다.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고 굴러서 구렁텅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문득 한 외로운 마을이 나왔다. 궁관촌이었다. 마을 호수는 불과 6,7호였고, 쓸쓸하여 바람도 가리지 못할 모양이었다. 군복이 다 젖어 체면도 돌아볼 겨를이 없이 봉창 문을 열고 내실로 들어갔다. 한 작은 계집아이가 방금 옷을 벗고 잠을 자려던 참이었다. 발자국 소리를 듣고 옷을 주워 입는 참이었다. 나도 깜짝 놀라 사과하며 말했다.2)
行尋宮冠官山下 宮冠之村 風雨漸緊 火隨雨滅 咫尺不辨 轉入溝壑 忽得一孤村 乃宮冠村也 家戶 不過六七戶 村樣蕭然 不蔽風日 戎衣盡濕 靡恤廉隅 開蓬戶 卽入內堂 有一小女兒 方解衣就寢 忽聞剝啄之聲 方收拾衣裳 余亦驚悟 謝語 “밤길 가는 사람이 체면 불구하고 이처럼 분별이 없었으니 민망하오.” 그러자 계집아이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탄과 풍우를 무릅쓰고 밤낮과 추위 더위를 가리지 않고 고생하며 다니시는데 어찌 염우(廉隅; 염치)를 차릴 수 있겠으며, 어찌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난리를 평정한 후에는 의당 남녀의 구별이 있게 될 것이니 더 말씀하지 마옵소서.” 듣고 매우 훌륭하게 여겼다. 夜行之人 不顧軆禮 如是無別 悚悶悶 女兒答曰 不然 不避失石風雨 晝夜寒暑 徃來多艱 胡恤廉隅 豈有男女之別 靖難後 當有別男女之日 勿煩他話 聞甚器之3) 1) 소무(蘇武): 한(漢)나라 때 흉노(匈奴)에게 잡혀가 충절을 지킨 충신(忠臣)
2) 이태룡,《호남의병장 전해산》,삼조출판사, 2010. 142쪽. 3)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1970. 874쪽. 글쓴이 황광우 작가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상임이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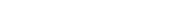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