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의 초상] 의병장 안규홍을 만나는 길에서 게시기간 : 2020-03-19 07:00부터 2030-12-24 00:00까지 등록일 : 2020-03-18 14:21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미지의 초상
|
||||||||
|
약천(藥川; 곡성 입면의 마을)에서 헤어진 것이 손가락을 꼽아보니 이십 여 성상(星霜)이 흘러서 거의 얼굴을 잊을 지경입니다. 난리 중이라 인사도 고르지 않았고 몸엔 병이 많아 한 번도 헌병(軒屏; 어른의 가까운 곁)에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저의 죄입니다. 하지만 군자의 너그러움을 두루 보이시어, 혹여 현자를 모시는 저의 정성이 부족하였다면 이를 용서하여 주시고 과오나 허물로 삼지 말아 주시지오. 삼가 여쭈오니 요즘 경체(經軆)가 숭왕(崇旺)하신지요? 마음만 당신께 달려갑니다. 저는 칩거하며 들은 것이 없어 드릴만한 말도 없습니다. 藥川奉別 屈指已二十餘星霜 殆乎忘面 盖亂離中 人事不齊 身亦多病 未得一造軒屏 罪也 君子容人周至 或恕其緇薄 而勿爲過咎也否 謹問兹者 經軆崇旺 神迬不置 弟蟄居無聞 無足奉凂1) 봉산(蓬山) 안종선(安鍾宣)께 드리는 이 편지의 작성자는 운사 여창현(1897년생)이다. 운사는 의열단 단장 김원봉(1898년생)처럼 일제 강점기의 고난을 헤치고 살아온, 나의 할아버지뻘이 되는 어른이었다. 불과 60년 전에 먼저 살다 가신 어르신의 한문은 나에게 암호문처럼 난해하였다. 모르는 한자가 많은 것이 아니었다. 아는 한자어도 꽤 있었다. 인사(人事)와 난리(亂離)는 지금도 사용되는 일상어이고, 성상(星霜)과 칩거(蟄居)는 학창 시절 익힌 한자어이다. 경체(經軆)와 헌병(軒屏)처럼 간찰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따로 있었다. 경체(經軆)는 ‘경전을 공부하는 몸’으로서 상대에 대한 존칭어이고, 헌병(軒屏) 은 ‘어른의 가까운 곁’이요, 역시 상대에 대한 존칭어였다. 숭왕(崇旺)은 ‘좋다’이고, 봉별(奉別)은 ‘헤어짐’이요, 신왕(神迬)은 ‘마음만 달려감’이다. 그런데 치박(緇薄)이 무엇인가? 검을 치(緇), 엷을 박(薄), 두 글자가 만나 무엇을 뜻하는가? 인터넷에 들어가 한국고전번역원 DB를 다 뒤지고, 동양고전 DB를 다 뒤져도 치박(緇薄)의 뜻2)을 찾을 수 없었다. 어이해야 좋을지 암담하였다. 치박(緇薄) 두 글자의 뜻을 못 찾다니, 내가 ≪운사유고(雲沙遺稿)≫의 풀이에 나선 것 자체가 만용이 아닌가? 과연 내가 ≪운사유고≫를 끝까지 제대로 풀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졌다. 절망이 스멀스멀 나를 잠식하고 있었다. 포기해야 하나? 어둠 속의 미로를 헤매고 있을 무렵 한학의 대가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조선대 한국고전번역센터 선임연구원 안동교 씨였다. 나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고승의 법문을 듣는 마음으로 자리를 준비하였다. 그날 나는 알았다. 당시 나의 ≪운사유고≫ 풀이는, 비록 나는 죽기 살기로 풀이하였으나, 전문가의 견지에선 손을 볼 수조차 없는 엉망의 풀이였던 것이다. 친절하게도 안동교 씨는 ≪운사유고≫의 편지 세 통을 자상하게 풀이해주었다. 큰 깨달음을 얻었다. 순강(鶉江)3)은 남원과 곡성 사이를 흐르는 섬진강의 한 지류인데, 나는 순강의 비밀을 풀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나는 원문을 순강지한(鶉江之恨)으로 읽고서 ‘메추라기(鶉)가 강을 건너지 못하는 한(恨)’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니 도무지 문맥이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순강지한(鶉江之恨)이 아니라 순강지한(鶉江之限)이라며 나의 오독을 교정해준 이가 바로 안동교 씨였다. 원문을 대조해보니 정말 ‘恨’이 아니라 ‘限’이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얼굴이 붉어져야 마땅했으나, 나는 부끄럽지도 않았다. 그게 한글세대의 현주소인 것을 어이할 것인가? 나는 독한 마음을 품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고전 DB에 오른 조선 선비들의 간찰을 훑었다. 고산 윤선도와 우암 송시열의 간찰을 읽었고, 율곡 이이와 퇴계 이황의 간찰을 읽었다. 2019년엔 나는 송사 기우만이 남긴 ‘호남 의사 열전’을 읽었다. ≪省齋奇參衍先生傳≫을 읽으면서 호남 창의 회맹소를 조직하기까지 기삼연 선생이 흘린 그 엄청난 땀을 마주하노라니, 짐짓 숙연해졌다. 이어 나는 머슴 출신 의병장 안규홍을 주목하게 되었다. 문병란 시인이 지은 서사시 ≪동소산 머슴새≫를 어렵게 구해 읽었다. 담살이는 머슴이다. 산과 들에서 일하던 농민과 머슴들이 일어나 흙 묻은 손으로 조직한 담살이 부대, 죽음의 전선에 앞장 선 담살이들, 그들은 이 땅의 진짜 주인 위대한 대지의 아들들이었다. 젊은 날,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에 알고 지냈던 후배 안남열을 만났다. 남열은 고향이 보성이었다. “어이, 남열이, 혹시 안규홍 의병장에 대해 이야기 들은 적 있는가?” 물었다. 남열의 입이 찢어지는 것이었다. 머리를 가볍게 뒤로 젖히며 이렇게 답했다. “가까운 우리 할아버지인디요.” 가만히 보아하니 안남열의 얼굴이 안규홍의 얼굴을 빼다 박은 것이었다. 그러면서 후배는 자기 집에 ≪담산실기(澹山實記)≫가 있으니 필요하면 가져다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우연으로 엮어지는 인연의 실을 따라 나는 또 한 권의 고문서를 손에 쥐게 되었다. 나는 설레이며≪담산실기≫를 열어나갔다. 두 분의 이름이 확! 눈에 띄었다. “논한다. 이때 호남에서 의리를 들고 일어난 선비로서 고광순, 이석용, 기삼연 같은 사람은 모두 글을 읽고 고금의 역사에 능통했다. 하지만 규홍은 품팔이꾼과 함께 짝지어 살았고, 눈으로 시서도 못 읽어 봤건만 그래도 능히 사태에 마주쳐 분발하여 이런 일을 해내었다.”4)라고 안규홍을 소개한 이는 그 유명한 효당 김문옥이었다. 나는 ≪운사유고≫를 연구하면서 운사 여창현이 젊은 시절 교유한 인물이 효당 김문옥임을 알고 있었다. 그 효당이 ≪담산실기≫에도 또 등장하는구나! 야아, 안규홍과 김문옥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나는 무척 반가웠다. 또 한 분은 안규용(安圭容)이었다. 사실상 ≪담산실기≫의 편저자였다. 그는 이렇게 안규홍의 육성을 기록하였다. 당당한 예의지국으로서 너희 이리 같고 돼지 같은 놈들의 해독을 입고서 어찌 앉아서 그대로 보겠느냐? 지금 불행히 이 지경에 이르러 나는 죽겠지만 하늘이 어찌 무심하겠느냐? 나의 눈은 지하에서도 감지 않고 10년 내에 너희들이 남아 있지 않고 없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5) 안규홍은 글을 못하는 문맹이었다. 그렇다면 이 글은 안규홍의 말을 누군가 글로 옮겨 쓴 것이다. 그 작자가 안규용이었다. 나는 먼저 가신 분의 평전이나 전집의 출간 작업을 해보아서 아는데, 이 일은 가신 분을 향한 충심이 없고서는 못 하는 일이다. 안규홍의 혼을 모시고 살았을 이 분 안규용은 누굴까? 1873년 보성(寶城)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29세 때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연구하였다. 1934년에 일제가 서당인가를 받으라고 독촉하자, 지리산에 들어가 초막을 짓고 은거하였다. 1936년 문인 박규현(朴奎鉉)의 일기가 문제가 되어 아들인 안종선(安鍾宣)과 함께 일경에 구속되어 구례와 광주 등지에 3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아니, 이게 뭔가? 이곳에서 안종선(安鍾宣)이 나오다니? 나는 경악하였다. ≪운사유고≫ 간찰의 수신인 그 안종선(安鍾宣)이 안규용의 아들이었다고? 아버지 안규용과 아들 안종선이 구례와 광주에서 3개월 동안 구금되었다고? 그랬었다. 효당 김문옥은 위당 정인보가 인정하는 큰 한학자였다. 뿐만 아니라, 위당과 마찬가지로 일경의 핍박을 받은 사실상의 독립운동가였다. 안규용도 마찬가지였다. 안규용은 연재 송병선의 대를 잇는 큰 한학자였다. 뿐만 아니라 담살이 의병장 안규홍의 얼을 가슴에 품고 산, 사실상의 독립투사였다. 후배 안남렬은 나에게 흘려 말했다. 의병장 안규홍이 안방준의 손이라고. 그러고 보니 안규용도 안방준의 손이었다. 그때 "나의 할아버지 편지도 ≪운사유고≫에 수록되어 있어요"라고 말했던 안동교의 발언이 불현듯 기억났다. 안동교의 할아버지가 안종선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안동교와 안동선과 안규용은 모두 안방준(1573~1654)의 후손이었고, 안규홍 역시 안방준의 후손이었으며, 내가 30년 가까이 지내던 후배 안남열도 알고 보니 안방준의 후손이었다. 허어…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若無湖南, 是無國家.)”는 이순신의 말처럼 임진왜란에서 보인 호남인들의 공헌은 절대적이었다. 명량대첩은 남도의 바닷가 사람들이 치른 대첩이었다. 진주대첩은 어떤가? 나주 출신의 선비, 김천일 장군은 진주성이 함락되자, 아들과 함께 남강에 몸을 던졌다.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권율은 광주목사(光州牧使)였다. 권율과 함께 왜군과 싸운 이들은 호남의 청년들이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의병장이 또 있었으니 보성의 선비 안방준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안방준은 읽던 책을 덮고 칼을 뽑았다.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광해군이 그 명성을 듣고 기용하고자 하였으나 그는 고향으로 내려와 은거하면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선조들의 삶에서 편지가 갖는 의미는 오늘 우리들과 사뭇 달랐던 것 같다. “비 오는 산 중에서 갑자기 은혜로운 편지를 받고 기쁨과 고마움에 머리 숙여 여러 번 절할 뿐입니다.”라고도 했고, “수찰을 받으니 비통한 심정이 사연 밖에 넘쳐, 나도 모르게 감회의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라고도 했으며 “받들어 거듭 읽을 때마다 정이 넘치는 말씀은 저의 가슴을 찧고 매이게 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니 누가 편지는 만나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던가요?”라고도 했다. 카톡과 메일로 용건만 주고받는 오늘의 우리와는 선조들의 마음씀씀이가 사뭇 달랐다. 그리움은 거리에 비례하는가? 한양 천리 길은 걷자면 십 여일이 걸렸고, 한 통의 편지를 주고받기까지 이십 여일이 걸렸다. 시공간의 거리는 거꾸로 절절한 그리움을 일게 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감정의 절제를 중시한 선비들이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빙긋이 웃을 뿐이다. 좀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선비들이 간찰에서 사용하는 그리움의 언어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운사 여창현은 봉산 안종선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그리움으로 목이 메던 차 홀연 서찰을 받고 형체(兄軆)가 숭왕(崇旺)함을 삼가 살피니 실로 먼 곳에서 빌던 바와 같았습니다. ≪소송유고≫를 어루만지며 엎드려 읽으니, 송담 선생을 직접 뵙는듯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戀思如噎 忽承巍牘 謹審兄軆崇旺 實叶遠禱 小松遺稿摩挲伏讀 宛如承顔 不覺涕淚盈眶6) 1) ≪운사유고≫ 중 ‘봉산(蓬山) 안종선(安鍾宣)께 드림’에서.
2) ‘치박(緇薄)’은 치의성박(緇衣誠薄)의 줄임말로 ‘어진 이를 우대하는 정성이 얕다’는 뜻이다. 3) 순자강(鶉子江)으로 불리며, 전라북도 진안군과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과 옥과면의 경계를 따라 이루는 섬진강의 일부 하천이다. 4) 〔論曰, 異時湖南義起之士如高光珣李錫庸奇參衍諸人皆能讀書通古今. 圭洪生傭人爲伍目未涉詩書矣而(及)能遇事奮發有爲異哉.〕≪澹山實記≫. 5) 〔以堂堂禮儀之邦酷被爾狼豕肆猘之毒吾豈何坐視乎. 今不幸至此吾則死矣天豈無心乎. 吾目不瞑於地下十年之內見爾類之無遺失矣,〕≪澹山實記≫. 6) ≪雲沙遺稿≫ 중 ‘答安蓬山’. 글쓴이 황광우 작가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상임이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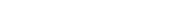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