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 길을 열다] 산 절로 물 절로, 자연가 이야기 게시기간 : 2020-03-21 07:00부터 2030-12-24 21:00까지 등록일 : 2020-03-19 16:24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선비, 길을 열다
|
||||||||
|
1545년 7월 초하루 아침 6시, 인종이 서거하였다. 최후는 절박하였다. 마지막 12시간 전, ‘인심을 위로하고 싶다’며, 조광조 등을 신원 복직시키고 현량과를 복구하더니만, 6시간 전에 이복아우 12살 경원대군에게 전위하였다. 유언은 다음과 같았다. “백성이 어떻게 되겠는가? 장례에 사치하지 말라.” 재위 8개월, 향년 31세, 능침은 효릉이었다. 달포 전 옥과현감으로 돌아온 김인후는 망곡하다가 혼전에 나가지 못한 죄스러움에 몇 번이나 혼절하였다. 그리고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던 7월 18일 한밤중, 몹시 병약하여 안쓰러운 열세 살 막내딸이 숨을 끊었다. 움집을 태우고도 한참 떠나지 못하였다.1) “관 뚜껑 덮으니 만사 까마득한데, 천길 숲은 요동치고 뭉게구름 차갑구나. 오래 묵은 병이라 약도 침도 들지 않더니, 한 달 열흘은 얼굴 보기도 괴로웠더라. 매서운 불길 훨훨 여막에 뻗치니 내 마음 놀래라, 이제 온갖 병이 이 몸을 덮치겠구나.” 그런데 조정의 소식이 참혹하였다. 섭정의 대권을 거머쥔 문정왕후가 선왕의 외숙 윤임(尹任) 등을 ‘금상이 대통을 승계하자 형적이 불안하였고, 여주(女主)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고 하였다’고 모략하다가, 마침내 ‘왕자 중에 조금 낫다는 봉성군(鳳城君)을 추대하려고 하였으며, 계림군(桂林君)에게도 뜻을 두었다’며 무서운 옥사를 일으켰던 것이다. 봉성군은 희빈 홍씨 소생으로 중종의 여섯째 왕자였고, 계림군은 월산대군의 손자로 윤임의 생질로서 인종과는 이종사촌이었다.2) 이런 와중에 외척의 음모와 공작에 비판적이었던 많은 사림관료가 보복을 당하였다. 이른바 을사사화, 여기에 김인후의 선배 동료가 적지 않았다. ‘제목 없는’ 오언율시에 참담함을 풀었다.3) 어진 바람 온누리에 떨치자, 만물이 우쭐대며 기뻐하였지. 갑자기 바람서리 휘몰아치자, 쭉 뻗은 줄기가 시들고 꺾이누나. 뭇 새들 구슬피 울부짖다가, 날고 난들 어디에 깃들꼬? 해 질 녘 저문 구름 일면, 장대비 주룩주룩 퍼부을 터인데. 어진 바람 ‘인풍(仁風)’은 인종의 정치, 바람서리 ‘풍상(風霜)’은 무서운 공작과 음모, 쭉 뻗은 줄기 ‘직간(直幹)’은 화를 당한 동지, 어디에도 깃들기 쉽지 않은 뭇 새는 화를 모면한 자신 같은 선비다. 꺾인 선비들을 풍우에 떠내려가는 꽃망울에도 비유하였다. “춘광은 한 번 가면 다시 끌 수 없는데, 예쁜 꽃은 멋모르고 물에 떠밀려가는구나.…비바람에 깊은 숲 꽃망울마저 남지 않으니, 온통 푸른 이끼가 쓸쓸한 동산을 뒤덮으리라."4) 한동안 안정을 찾지 못하며 어느덧 취광(醉狂)을 자처하였다.5) 담장 넘어 국화 시들어 한숨 나오는데, 해 저물어 날은 춥고 술독마저 비었더라. 동쪽 이웃에게 달려가 두주불사하였더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취광을 만났다고 하는군. 결국, 무척 아팠다가 겨우 몸을 추스르자 병가를 내고 장성 부모님에게 갔다. 뵐 면목이 없었던지 홀로 읊었다.6) “인생사 슬픔과 기쁨을 한 동이 술에 부치며, 응어리 삭이고 녹이며 심혼(心魂)을 진정코자 하였지. 남들은 미친 사람 되었다고 입방아를 찧고, 학발 양친은 자식 아플까 유독 슬퍼하시니 어찌하리?” 그래도 정신은 또렷하였다. 서러움 겹쳤던 「을사년 겨울」이 다음과 같다.7) “여러 해 게을러서 이 병 저 병 타고 올라, 여윈 뼈마디 울뚝불뚝 튀어나왔네. 한낱 어린애로 괜스레 눈물 뿌린 것은 아니라, 일 년 남짓 두 임금이 붕어하셨음이라네.” 차츰 원기를 회복하였다. 다음은 동지 다음 날 새벽, 뒷산에 올라 읊었다.8) 동트는 하늘 눈 위의 달빛은 또렷하니, 매화 가지에 맺힌 이슬 눈물은 고드름 되어 주렁주렁. 보는 이 없어 가지 휘어잡고 홀로 서서, 차가운 허공을 한눈에 담고서 스스로 읊조리네. 1546년 여름 각자승(刻字僧)이 지난 늦가을 파직당한 유희춘(柳希春)이 해남 고향으로 내려가며 건네준 『효경간오(孝經刊誤)』의 판각을 마쳤음을 알려왔다. 옥과로 귀임하여 목판과 함께 간행에 필요한 발문을 후임 현감에게 인계하고 벼슬을 벗어났다. 6월 중순이었다. 김인후는 한동안 화초를 가꾸고 후학을 인도하며 마음을 추슬렀다. 이때 다음과 같은 시를 문인에게 보였다.9) 하늘과 땅 사이에 두 분 계시나니, 중니가 원기라면 자양은 참이로세. 마음 가라앉히고 부디 딴 길로 가지 말고, 늙고 병든 이 몸을 흐뭇하게 하여다오. 중니는 공자, 자양은 주자였다. 그러나 세월은 여전히 참담하였다. 명종 2년(1547) 9월 ‘위에서 여주(女主)가 정권을 잡고, 아래에서 간신 이기(李芑) 등이 정권을 농간하니, 장차 나라 망하기를 우둑하게 기다리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라는 양재역 벽서사건을 조작한 외척권신은 송인수(宋麟壽)ㆍ임형수(林亨秀) 등에게 사약을 내리고, 노수신은 진도, 정황(丁熿)은 거제, 유희춘은 제주를 거쳐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를 보냈다. 모두 김인후와 인연이 깊었으니,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음의 유명한 시조는 임형수의 원통한 죽음에 따른 추도사였다.10) 엊그제 베인 나무 백 척 장송 아니런가, 적은 대로 두더라도 동량이 될 터인데, 차후에 명당 기울면 어느 나무가 받치리. 어찌하여 착한 선비가 죽임을 당하는가? 춘추시대 부왕이 맞이한 계모의 모략으로 자결한 태자 신생(申生), 초한 쟁패 시절 친형은 항우에게 죽고 조카는 한신에게 잃고 자신은 유방에게 속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전횡(田橫)의 사적을 분노의 애사(哀詞)에 옮겼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11) 어느 날 꿈에 『주역』의 ‘군자의 길은 나감[出]과 물러섬[處], 침묵[黙]과 언론[語]이 있다.’는 구절을 읽고 적었다.12) “언론과 침묵이 다를망정 어찌 길이 다를까, 한마음 같은 말이면 날카로움은 쇠를 끊고 그 향내는 난초라네. 장차 얼마나 초록빛 죽엽주를 들이키며, 달빛 아래에서 양춘곡(陽春曲)을 튕겨야 할지?” 양춘곡은 망해가는 초나라가 서글퍼 불렀던 노래, 자신을 드러나지 않고 침묵의 세월을 견디겠다는 각오였다. 그리고 1548년 ‘짙푸른 버들 흩날리고 꽃 떨어지는 늦봄’ 순창 복흥 백방산 동녘 추령천이 흐르는 메기바위 어암(魚巖) 마을로 들어갔다. 첫째와 둘째 딸 내외와 셋째 딸, 둘째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모셨다.13) 나는 아버지 모시고 부인은 시어머니 보살피며, 사위와 딸자식이 빙 둘러 에워 쌓네. 고기 잡고 자라 잡아 받쳐 올리니, 십 리 냇가마을에 물안개가 파랗구나. 오랜만의 오붓함이며 다행이었다. “온갖 병에 얽힌 몸 우연히 보전하고, 양친을 시봉하니 하늘의 은혜로세. 산 깊고 외진 땅 풍경은 그윽한데, 항아리에 청주 탁주 없어 서운할 뿐.”14) 여기에서 안채에서 떨어진 냇가 가까운 곳에 초당을 짓고 ‘훈몽재(訓蒙齋)’를 내걸었다. 사위 아들을 비롯한 인근 후생의 공부 공간이었다. 어느덧 호남 각처에서 후학들이 모였다. 허심탄회하게 반겼다.15) 호남이라도 고향이 다르니, 기약한다고 이런 만남 되겠나? … 잠깐 사이 술상 낭자하고 시상(詩想)이 무럭무럭, 은근하게 취하고선 간담을 털어놓아 보세나.… 향시를 앞둔 교생들에겐 막걸리 가득, 닭과 개를 삶아주며 격려하였다.16) “병부(病夫) 되어 빗장치고 누웠더니, 어느덧 삼 년이라.… 그대들 향시를 앞두고, 부지런히 일과를 익혔겠구먼. 우리 사문(斯文)의 촉망은 허투가 되지 않으리.” 이렇듯 스스럼없으면서도 홀로 있을 때면 세월의 광풍에 소스라쳤다. ‘불볕더위 여전해도 서늘함 전하는 바람에 백로 내려앉던 날’ 문득 읊었으니, ‘왜가리와 따오기가 뒤섞여 날며, 제 잘난 척 부리를 오르락내리락. 독수리 솔개 떼를 어찌 견딜까, 마음껏 포식하고 높이 치솟는 것을. 세상 물정 한결같지 않으니, 세월은 미쳐버린 바람이로세.…’ 한 것이다.17) 더구나 초가을 7월이 되면 지난 슬픔은 오롯하였다.18) “온갖 일 걱정도 많더니만 또 가을이라니, 부질없이 세월에 머리만 희어졌군. 천지가 뒤집히는 꼴 보고 늙어가건만, 산은 홀로 푸르고 물은 절로 흐르는구나.” 걱정 많고 부질없고 허망하였지만, 산은 홀로 푸르고 물이 절로 흐르듯이 자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유명한 시조 「자연가」는 이즈음 작품이다.19)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 산수 간에 나도 절로. 두어라 절로 생긴 인생이니, 장차 절로절로 늙으리라. 그러나 인종을 향한 안타까움은 좀처럼 놓아버릴 수 없었다. “임은 바야흐로 서른, 나는 서른여섯이었소. 갓 만난 즐거움 다하지 못했는데, 한 번 이별하니 화살이더이다. 내 마음 변치 않았지만, 세상사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라오. 한창나이에 해로(偕老)할 짝 잃고서, 눈 어둡고 이 빠지고 머리까지 희었다오. 죽은 듯 입 다물고 몇 해를 보냈던가, 아직까지 죽지도 못하였소.…” 7월 1일 인종의 기일이 되면 맥동 마을 앞 난산에 들어가 술을 올리고 읊었다는 「가없는 그리움」이었다.20) 1) 『하서전집』 권10, 「哭亡女」 “七月十八日死 是夜大風雨” 및 권4, 「效邕叟平戒子歌 用其韻」 “甲辰冬十一月 中宗升遐 乙巳秋七月 繼有孝陵之喪 是月 家有季女方十三歲 得疚已一期 遂不能救以死 冬十月 麟厚病垂絶僅蘇 因以去職”
2) 계림군의 모친 윤씨와 인종을 낳은 장경왕후가 자매였다. 더구나 계림군 부인 정씨와 인종의 귀인 정씨가 자매였으니 동서가 되었다. 이들 정씨 자매의 어린 막내가 당시 8살로 훗날 가사문학의 대가로 서인 지도자로 활약하였던 정철(鄭澈)이었다. 이런 연고로 정철 일가는 혹독한 피해를 입었다. 3) 『하서전집』 권3, 「無題」 “…仁風振海宇 萬類方怡怡 風霜忽飄薄 直幹還摧萎 衆鳥聲啾啾 飛飛何所依 黃昏暮雲起 霖雨來霏霏” 4) 『하서전집』 권4, 「落花嘆」 “春光一去不可攬 芳華冉冉隨流水…風雨不貸千林紫 林園蕭索綠苔萋…” 5) 『하서전집』 권6, 「醉後吟」 “墻頭菊老最堪嘆 日暮樽空天氣寒 走向東隣開斗酒 傍人合作醉狂看.” 6) 『하서전집』 권6 「自詠」 “人世悲懽付一尊 消融蕩滌鎭心魂 顚狂不覺騰人口 憂疾偏傷鶴髮恩” 7) 『하서전집』 권6, 「乙巳冬作」 “年來懶與病相乘 瘦骨崢嶸日見稜 非爲嬰兒徒灑淚 眼看堯舜一年崩” 8) 『하서전집』 권7, 「至後日」 “雪月分明天向曙 梅枝露淚結氷垂 攀條獨立無人見 一望寒空自詠詩” 9) 『하서전집』 권7, 「示門人」 “天地中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 潛心勿向他岐惑 慰此摧頹一病身” 10) 『하서전집』 속편 「悼林士遂寃死作短歌」 11) 『하서전집』 권1, 「弔申生辭」 및 권3, 「田橫義士」 12) 『하서전집』 권7, 「記夢」 “語默雖殊豈兩般 斷金其利臭如蘭 幾將竹葉杯中綠 時擬陽春月下彈”; 『周易傳義』 「繫辭上傳」 “君子之道 或出或處 或黙或語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13) 『하서전집』 권6 「魚巖雜詠」 其七 “身侍嚴親婦侍孃 甥男女息擁成行 叉魚擉龞供滋味 十里溪村煙水蒼” 14) 『하서전집』 권6 「魚巖雜詠」 其六 “百病形骸偶自全 奉親游賞荷皇天 山深地僻多幽致 只恨尊中無聖賢” 15) 『하서전집』 권3, 「醉後爲詩 示沖虛喜奇諸君」 “…湖南各異鄕 邂逅良不期…杯盤乍狼藉 詩思何葳蕤 殷勤一醉餘 肝膽輸無遺…” 16) 『하서전집』 권3, 「寄接中」 “病夫掩關臥 三載于今玆…諸君且小試 會課來祁祁…屬望豈徒爾 斯文方有期…” 17) 『하서전집』 권3, 「偶吟」 “火日尙留暑 金風時報涼 點點白鷺下…飛飛雜鸛鶩 與之相頡頏 叵堪䲭鳶羣 恣飽還高翔 物情苦不一 歲月如風狂…” 18) 『하서전집』 권6 「魚巖雜詠」 其十九 “萬事悠悠又一秋 無端歲月白人頭 眼看飜覆乾坤老 獨有山靑江自流” 19) 『하서전집』 속편 「自然歌」 “靑山自然自然 綠水自然自然 山自然水自然 山水間我亦自然 已矣哉自然生來人生 將自然自然老” 20) 『하서전집』 권3, 「有所思」 “君年方向立 我年欲三紀 新歡未渠央 一別如絃矢 我心不可轉 世事東流水 盛年失偕老 目昏衰髪齒 泯泯幾春秋 至今猶未死” 글쓴이 이종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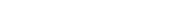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