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의 초상] 호남 선비의 후손을 찾다 게시기간 : 2020-01-16 07:00부터 2030-12-01 10:00까지 등록일 : 2020-01-15 10:22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미지의 초상
|
||||||||
|
내가 ≪철학콘서트≫를 출간한 것이 2006년이었다. ≪철학콘서트≫는 10명의 동서 사상가를 다루었는데, 퇴계와 고봉의 대화도 소개하였다. 퇴계의 도산서원을 방문하는 것은 작가의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여, 안동을 갔다. 이어 고봉의 월봉서원을 방문하는 것 역시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였다. 월봉서원은 광주의 인근 마을 임곡에 있는 서원이다. 나는 임곡의 동네 슈퍼에 들어가서 물었다. “할머니, 근처에 기대승 선생의 생가가 있지요? 어디입니까?” “예, 대승이요? 뒷집에 사는디요." 퇴계 이이는 화폐 속에 등장하는 지존(至尊)의 인물로 통하는 것과 달리, 고봉 기대승은 시골 동네 골목에서 노는 꼬마의 이름으로 통하고 있었다. 무척 부끄러웠다. 경상도는 저렇게 선조를 모시는데, 우리 광주는 뭐냐? 화도 났다. 광주 사람들은 서울 분들에 대해선 깍듯이 예우하면서 같은 광주 사람들을 우스운 인물로 치부하는 습성이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도 누구에게 따질 일이 아니었다. 이후 나는 가까이에서 선비의 후손을 찾았다. 호남 선비의 후손 말이다. 안동에 가면 모두가 퇴계의 후손이라 떠벌리는데, 왜 광주엔 나의 주변엔 선비의 후손들이 없을까? 강진에 가면 다산 정약용의 유품을 전시한 다산 유품 전시관이 있다. 갔더니 다산의 제자 황상(黃裳)의 시가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황상의 조상이 나의 조상과 한 뿌리가 아닐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았다. 같은 창원 황 씨이니 뚱딴지같은 망상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욕망이 상상으로 투영된 일례이리라. 올 해로 십년이 되었다. 나는 이곳 광주에서 인문을 익히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고전공부모임>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하였다.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도 함께 읽고, 공자의 <논어>도 함께 읽는다. 새로 들어오는 회원이 있으면, 신입 회원의 가계에 대해 물어본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호남 노론의 적통이라 떠벌인 허풍선이는 있었으나 진정한 선비의 후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다 어찌하다 어느 날 나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선비, 궁벽한 시골에서 시대를 한탄하다 살다 간 선비, 조선의 마지막 선비를 만나게 된다. <미지(未知)의 초상(肖像)>을 만난 것이다. 때는 2014년 12월이었다. 함께 공부하는 동학(同學) 조세경의 집이 담양에 있다. 담양 고서 집에서 우리는 연말을 보내고 있었다. 창가엔 싸락눈 몇 점이 휘날리고 있었다. 나는 예의 버릇대로 조세경의 가계에 대해서 시시콜콜 물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조세경의 모친은 여순효 씨인데, 여순효 씨의 가계가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었다. 여순효 씨의 어머니가 조광남(1979년 졸) 씨였는데, 조광남 씨의 외할아버지가 한말 의병장 기삼연이었다. 1907년 호남 창의 회맹을 묶어낸 호남의 대표적 의병장, 기삼연의 후손을 나는 눈앞에 만나고 있었다. 나는 어지러웠다 기삼연의 손녀를 자부(子婦)로, 아들의 부인으로, 며느리로 맞아들인 분은 운사(雲沙) 여창현(呂昌鉉)이었다. 여순효 씨의 할아버지이다. 여창현(呂昌鉉)은 누구인가? 송사 기우만의 제자였다. 나는 마침내 선비의 본대를 만나게 되었다. 기우만은 누구인가? 송사 기우만은 조선의 6대 성리학자의 한 분인 노사 기정진의 적통을 잇는 제자요 손자 아니던가? 여창현은 1910년 나이 14세 때, 남원의 사석리에 은거하던 송사 기우만에게 찾아가 제자의 예를 올렸다. 꿈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인가? 여순효 씨는 할아버님 여창현이 남긴 ≪운사유고(雲沙遺稿)≫를 나에게 내놓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문집인디... 까막눈이라 읽을 수 없어라우.” 내가 찾던 호남 선비의 후손은 정녕 등잔불 밑에 있었다. 유고집은 가신 분의 육성을 담은 기록물, 분신(分身)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유품이다. 이런 유품을 내 앞에 내놓다니? 만일 운사 어르신이 나의 할아버지라 한다면... 나는 이 유고집을 하룻밤 만에 미친 듯 읽어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순간 내 머리를 스쳤다. 로제타 비석의 글자를 파헤치듯, 나는 밤잠을 자지 않고 기어이 문집의 뜻을 밝혀내고야 말았을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 보길 고대하였던가? 나는 나의 짧은 실력을 잊고서 그만 그 자리에서 여순효 씨의 부탁을 승낙하고 말았다. 한글세대가 한문 문집을 풀이하려고 도전하는 것은 풍차를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의 행위와 다름 없는 무모한 짓임을 나는 뒤늦게 알게 되었다. ≪운사유고≫엔 100여 편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었다. 저는 빈 집을 앉아서 지키고 있어 서로 배움을 증진시켜줄 이가 없습니다. 전일 책을 편 것은 공연히 잘못을 세월에 돌리는 일이었습니다.(나의 독서는 시간만 낭비할 뿐 아무 성과가 없는 일이었다.) 비록 슬하의 자식들이 머리가 컸다고는 하는데 한결같이 서교(西敎)에 물이 들어 물어야 할 것을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두척(斗尺;미터법)과 오랑캐의 알아듣기 힘든 소리(영어 발음)를 물어오니 이 탄식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弟坐守空堂 無人相長 前日展冊者 歸咎爲枉費歲月 雖膝下犀額之漸就豊圓者 一向漬西敎 而不我問 所問者 今世科學之斗尺 侏離之蠻音 歎如之何 좌수공당(坐守空堂), ‘빈 집을 앉아서 지키고 있다’고 했다. 선비의 하루가 쓸쓸하다. 집에 아무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함께 대화를 나눌 벗이 없음을 말함이렷다. 무인상장(無人相長), ‘서로 키워줄 벗이 없음’을 한탄한 것이다. 나이 50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인생의 전성기에서, 운사는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슬하의 자식들이 머리가 컸다고는 하는데 한결같이 서교(西敎)에 물이 들어 물어야 할 것을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있었다. 운사는 옛 학문을 고집스럽게 지킨 선비였다. 아들들에게는 한학을 가르쳤다. 그런데 손자들은 모두 학교에 가서 신학문을 배웠다. 손녀 여순효는 왜 학교에 보내주지 않느냐며 할아버지에게 앙탈을 부렸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마을마다 서당이 있어 아이들은 서당에서 ≪천자문≫과 ≪소학≫을 배웠다. 그러던 아이들이 점차 서당을 버리고, 학교에 갔다. 우리는 멋도 모르고 ‘학교종이 땡땡땡’을 불렀던 것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한 문명이 몰락하고 있었다. 여순효 씨는 1945년 생, 해방둥이다. 그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선 ‘바둑아 바둑아 이리 오너라’를 가르치고 있었다. 한문의 보조 언어이던 한글이 문자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삽시간에 문맹률은 10% 미만대로 떨어졌다. 한민족의 역사에서 마침내 한글세대가 탄생하였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래, 500여년 만에 보는 쾌거였다. 한글 전용은 분명 경하할 일이었다. 하지만 한글이 나서고 한자가 물러나는 이면에 우리 민족에겐 뼈아픈 상실이 있었다. 여순효는 여창현의 손녀이다. 여순효는 시집가기 전까지, 홀아비로 살아가는 할아버지를 모시며 살았다. 각별한 사이였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친구들이 방문하면 밥도 짓고 팥죽도 쑤고 손녀딸이 수발을 들었다. 1970년 손녀딸이 시집을 갔다. 그 근엄하던 유자 여창현도 손녀딸이 시집가던 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제 여순효 씨도 칠순의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나이가 들면 조상이 그리워지나 보다. 여순효 씨는 할아버지의 육성을 듣고 싶어 했다. 그런데 여순효 씨에게 <운사유고>는 이집트의 상형문자처럼 해독할 수 없는 글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운사유고>의 비밀을 해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유고집의 한자를 컴퓨터의 화면에 옮기는 일부터 시작했다. 한 면의 한자를 모두 옮겨 쓰는데 꼬박 두 시간이 걸렸다. 다음으로 문장의 시작과 끝을 찾는 끊어 읽기에 들어간다. 우리 같은 한글세대는 여기에서부터 좌절한다. <운사유고>엔 문장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문장 부호가 없다. 국문과 영문만 보아온 우리에게 마침표 부호가 없다는 것은 독해에 있어서 절벽을 의미했다. 어렵게 하나의 문장을 획정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 본다. 모르는 한자는 거의 없다. 그런데 두 개의 한자가 결합하면 낯선 의미의 한자로 돌변했다. 시하(侍下)는 ‘부모를 모시는 이’이다. 중성(重省)은 ‘두 분의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다. 혼절(渾節)은 ‘가족 모두’이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다. 할아버지가 남긴 글인데 손녀가 읽지 못한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매일 같은 집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할아버지는 머릿속으로는 손녀딸이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문자로 사유하고 있었다. 나도 좌절했다. 운사와 나는 딱 두 세대, 60년의 시간 거리에 서 있다. 운사는 1975년에 타계하였으니, 어찌 보면 나와 동시대의 인물이기도 하다.1) 이곳 광주 인근에서 동시대를 살다 간 분의 글을 해독하지 못한다니... 오기가 올랐다. 나는 한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논어>와 <맹자>를 새로 읽었고, <고문진보>를 읽었다. <시경>과 <주역>도 읽었다. 중 고등학교 시절 한문을 배우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아, 영어 공부에 투입한 시간의 10분의 1만이라도 한문 공부에 투입했더라면.... 생각해 보니 한글세대의 탄생은 축복할 일만은 아니었다. 한글세대는 다른 한편으로 상실의 세대였다. 1) 1975년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광주일고를 다니면서 박정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시위에 연루되어 광주교도소에 투옥되었다. 출소 후 8월에 부친상을 입었다. 이 해 12월 16일 운사 여창현은 타계하였다. 광주와 옥과는 차로 30분 거리이다.
글쓴이 황광우 작가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상임이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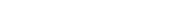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