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초대석] 단풍에 이끼 푸른 곳, 스님은 문을 닫으려 하고 게시기간 : 2019-11-07 07:00부터 2030-02-01 14:03까지 등록일 : 2019-11-05 14:42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명시초대석
|
|||||||||||||||||||||
|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간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특별한 여행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풍경을 눈에 담고 새로운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해방감마저 준다. 이런 마음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체험을 통해 활기를 되찾으려 하듯, 선인들도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 했다. 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길을 나선 이의 마음을 강박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간을 계획한 여행이야 덜하겠지만, 대개는 교통 시간과 끊임없는 연락에 얽매여 마음이 부산해지기 일쑤다. 전근대의 삶은 이와 달랐다. 떠나는 이는 소식의 단절을 미리 생각하고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그러한 길은 힘들고 위험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색(思索)의 시간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했다. 낯선 곳, 낯선 풍경과 새로운 사람들은 모처럼 자신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했다. 천 년 이전 시기의 어느 지점, 그렇게 길을 나선 이의 시를 한 번 읽어보기로 하자. 이 시는 고려 예종~인종 연간에 활동한 정지상(鄭知常, ?~1135)이 쓴 것이다. 정지상은 지금의 평양인 서경(西京) 출신으로 호는 남호(南湖)이다. 1114년(예종 9)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이후 좌정언·좌사간 등을 지냈다. 윤언이(尹彦頤, ?~1149) 등과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논하는 소(疏)를 올리자 왕이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했다. 묘청(妙淸, ?~1135)·백수한(白壽翰, ?~1135) 등 서경 천도를 주장하는 이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다가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을 중심으로 한 개경(開京) 세력에 의해 참살되었다. 문집은 전하지 않고 『동문선東文選』 등에 일부 한시 작품이 전한다. 그의 한시 「송인送人」은 문학사상 절창(絶唱)으로 오늘날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다. 제목에 나오는 소래사(蘇來寺)는 지금의 전북 부안에 있는 내소사(來蘇寺)이다. 이 절은 633년(백제 무왕 34) 백제의 승려 혜구두타(惠丘頭陀)가 창건하고 소래사라 하였다. 창건할 무렵 대소래사와 소소래사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소소래사이다. 1633년(인조 11) 대웅전이 중창된 이래 몇 차례 중창을 거쳤다. 내소사로 이름이 바뀐 것은 언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정지상의 생애가 자세하지 않은 만큼 이 시도 어느 때에 지어졌는지 알 수 없다. 내소사에는 사적인 여행 또는 공무 수행 중에 들린 것 같다. 어느 것이든 서경과 개경 일대에서 삶을 보냈던 그에게 호남의 변산(邊山)은 이국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뒷시대의 사람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서 “변산은 나라의 ‘재목 창고’로 궁실을 짓고 수리하느라 해마다 재목을 베어내도 아름드리나무와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이 항상 떨어지지 않는다(邊山者 國之材府 修營宮室 靡歲不採 然蔽牛之大 干霄之幹 常不竭矣 『東國李相國全集』卷23, 『南行月日記』)”라 한 것을 보면, 정지상이 찾았던 당시에도 울창한 숲에 우람한 고목들이 즐비했을 것 같다. 게다가 시인이 내소사를 찾은 때가 창건 이후 약 500년이 지난 무렵임을 감안하면, 절과 주변의 풍광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을 것 같다. 오늘날 내소사에 다녀온 이들은 입구의 일주문(一株門)에서 대웅전으로 길게 이어진 전나무 길을 떠올리곤 하는데, 이런 모습에 기대어 그 시절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으리라. 이 시는 내소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한다. 시인은 멀리 보이는 내소사를 향해 걸어간다. 제법 긴 길에는 나무가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굵은 뿌리는 꿈틀거리듯 길바닥에 드러나 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던 시인은 산 속 높은 곳에 있는 이 절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실감한다. “두우성도 손에 닿을 듯하다”는 말은 절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음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시인이 경내(境內)에 다다른 때는 저물녘이었던 듯하다. 마침 가을의 고운 단풍과 짙푸른 이끼가 절의 고색창연(古色蒼然)한 맛을 더하고 있었다. 그런데 속객(俗客)의 반가움과는 별개로 스님은 문을 닫으며 절간의 하루를 마감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르다’[到]와 ‘닫다’[閉]라는 글자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상에 대한 표현을 넘어 “뜬 구름 흐르는 물처럼 유랑하는 시인”과 “청정한 공간에서 불도(佛道)에 정진하는 스님”, 두 사람의 삶의 태도의 대비로까지 확장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층적으로 따진다면, 이러한 대비는 스님을 바라보는 시인의 관점을 내포한 것이다. 시인은 이와 관련한 단서를 곧바로 노출하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저물녘 산사(山寺)의 모습에 시선을 돌린다. 그 순간 멀지 않은 바다에서 살랑이는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형체만 남은 산(山)의 능선 위로는 초저녁달이 또렷해지고 있다. 시작(詩作) 전통에 따라 원숭이의 울음이라 표현하기는 했지만, 숲 속 어디에선가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려온다. 어느새 어둠에 둘러싸인 절간의 등불 아래 마주한 늙은 스님. 손님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을 스님을 보며 시인은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낀다. 긴 눈썹에 속기(俗氣)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낯선 모습에서, 시인은 자신이 떠나온 공간과 세상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세상에 관심을 끊고[閉] 불도에 정진하는 스님에 대한 경외심[奇哉]을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고적(古跡)이나 명승지를 찾곤 한다. 그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진 사찰은 넉넉한 품의 산자락과 함께 독특한 느낌을 준다. 아마 도심의 빌딩 숲에서 느끼기 힘든 청량함과 한적함, 편안함이라 할 수 있을까? 절의 경내를 둘러보다 보면, 도시 생활에서의 분주했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차분해짐을 느낀다. 때로는 숙고의 기회를 갖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분 전환’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옛 시인들이 느꼈던 사찰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이와 다르다. 그들의 시에서 사찰은 속세(俗世)와 대비되며 성찰(省察)을 촉구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해관계를 따지며 명리(名利)를 다투는 세상을 돌아보게 하고, 존재(存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공간은 시인에게 자각(自覺)을 선물하고 초속(超俗)의 인간으로 승급시키는 그러한 곳은 아니다. 자기정화(自己淨化)를 바탕으로 일상을 새롭게 마주할 ‘계기’를 제공하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옛 시인들 마음 안의 사찰처럼, 생활 속에서 나를 ‘흔들고 일깨울’ 대상은 어떤 것일까? 그 대상은 특정한 공간이거나 사람일 수 있고, 무언가에 대한 탐구의 과정(過程)일 수도 있으리라. 어느 것이든 일상(日常)이라는 회로(回路)에서 선명한 ‘전환의 지점’을 마련하는 것은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닐까? 글쓴이 김창호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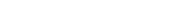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