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초대석] 외로운 꿈, 바다도 산도 멀다 하지 않기에 게시기간 : 2019-10-08 07:00부터 2030-02-01 01:01까지 등록일 : 2019-10-07 09:30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명시초대석
|
|||||||||||||||||||||
|
‘관계’의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명료한 시대에 살고 있다. 상대의 안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세한 일상을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다. 게다가 표정과 동작을 보며 상대의 디테일한 감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 가급적 많은 것을 함께하려는 친구나 연인, 가족들의 바람을 과학기술은 현실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관계의 기반이 충족된 지금에, 오히려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매뉴얼을 존중하고 패턴화의 경향을 띠며, 이모티콘에 맞춰 감정을 고르는 우리는 ‘관계의 건강성’만 중시하는 것은 아닐까? 먼 옛날, 불편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 한 수를 읽어보기로 한다. 이 시를 쓴 백광훈(白光勳, 1537∼1582)은 자는 창경(彰卿), 호는 옥봉(玉峯)이며 본관은 해미(海美)다. 전라도 장흥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시재(詩才)가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 13세에 지은 「증승정안시贈僧靜安詩」를 보고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은 이백(李白)의 환생이라 하며 감탄하기도 했다. 14세 무렵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1520∼1578)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몇 년 뒤 백형 광홍(光弘)을 따라 상경하여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 1519∼1581)에게 수학했다. 22세 때인 1558년에는 진도에 유배 중이던 소재(穌齋) 노수신(盧守愼, 1515∼1590)에게 나아가 배우기도 했다. 그는 28세인 1564년 진사시 합격하고 이후 대과를 포기하고 해남 옥천 옥봉산 아래 옥산서실에서 시작(詩作)에 전념했다. 1572년(선조 5) 명나라 조사(詔使) 한세능(韓世能), 진삼모(陳三謨)가 왔을 때, 노수신의 추천을 받아 백의(白衣)로 제술관에 차출되어 시명을 떨치기도 했다. 40세 이후 선릉 참봉, 소격서 참봉 등을 지내며 한양에 머무르던 중, 46세 되던 해 세상을 떠난다. 시제 중의 최가운(崔嘉運)은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1539∼1583)이다. 백광훈은 최경창, 이달(李達)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불리며 조선 중기 당시풍을 선도했다. 백광훈과 최경창은 소년 시절 강진 금릉의 박산(博山)에서 이후백에게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이 시는 소년 시절의 친구인 최경창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백광훈은 최경창보다 2년 먼저 태어나, 1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 함께 시를 배웠고, 나중에는 당시풍 최고의 시인으로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는 둘 다 불우(不遇)했다. 그래도 최경창은 대과에 합격했고 외직이나마 벼슬자리를 지냈던 반면, 백광훈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사시 합격 이후 출사를 단념했다. 두 사람은 명종에서 선조에 이르는 시기 당대의 아웃사이더로서, 세상에 대한 불만과 우울, 깊은 좌절감을 감각적인 색채로 노래했다. 두 사람은 종종 시를 주고받았는데 주로 애수(哀愁) 짙은 깊은 그리움을 담은 것이었다(『玉峯集』 卷上의 「懷崔嘉運」, 「憶崔孤竹」, 「憶崔嘉運」, 「寄崔孤竹」, 『孤竹遺稿』의 「寄玉峯」). 그리움을 노래한 시는 많다. 이 시 역시 그리움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시는 그리움의 색깔보다 고독의 무게를 먼저 느끼게 한다. 그런 점에서 고독에 관한 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고독은 말미에 이르러 그리움으로 승화된다. 고독은 굵은 그리움을 그리기 위한 짙은 밑그림인 셈이다. 이 시는 문밖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한다. ‘문’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는 곳이다. 그곳으로 통하는 길에 풀이 쌓인 듯 무성하다는 것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간은 제법 오래되었던 것 같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얼굴의 확인은 그렇게 보낸 세월의 경과를 뜻한다. 세상과의 단절, 그리고 노년의 도래는 스스로 규정하는 고독의 시공간의 좌표이다. 시인의 고독은 계절의 변화에서 처연(悽然)함을 더한다. 만물이 조락(凋落)하는 가을, 그 밤의 서늘한 기운은 혼자임을 절감(切感)하게 한다. 게다가 빗소리마저 들리는 가을날의 아침은 고독의 극점(極點)을 맛보게 한다. 나를 위로하는 것이라곤 오직 나의 그림자뿐이다. 그런데 이 고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부재(不在)에서 오는 상대적인 것이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동요되고 어느새 슬픈 읊조림이 된다. “마음 뭉클할 땐 언제나 홀로 노래하는” 시인의 모습이 그것이다. 고독은 그 깊이만큼 강한 힘으로 반등(反騰)한다. 슬픈 읊조림의 현실은 상상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시인은 그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리운 이를 만나기를 염원한다. 그것이 가능한 공간이 ‘꿈’이다. 꿈에서는 높은 산도 넓은 바다도, 아무리 먼 거리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먼 길을 마다 않는 꿈을 빌어, 시인은 절절한 고독에 상응하는 그리움의 최대치를 표현하고 있다. 전통시대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다. 누군가가 길을 떠난 뒤, 편지를 전해오거나 직접 돌아오기 전까지는 생사를 알 길이 없었다. 보낸 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연 현상을 보며 안위(安危)를 점치고, 두 사람을 함께 비추는 달을 보며 위안을 얻는 것이 전부였다. 먼 곳에 있는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마 불안감과 두려움, 설렘과 기다림, 원망과 한스러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으리라. 시인이 적는 그리움의 시는, 그러한 감정을 에둘러 경물과 계절에 빗대고 기댄 것이었다. 위의 시에 나오는 ‘가을 기운 도는 밤’, ‘빗소리 들리는 가을 아침’ 등은 실타래 같은 감정이 그리움으로 솟구치는 지점이다. 절절한 마음을 담은 시가 멀리 있는 대상에게 보내지면, 대상은 화답의 시를 보내왔다. 긴 시간이 걸리기에 빈번할 수 없었고, 자칫 읽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는 불안감도 가졌을 것이다. 백광훈과 최경창 두 사람의 문집을 보면, 주고받은 시가 모두 다섯 편이다. 백광훈이 꿈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듯 최경창도 꿈의 공간을 빌려 그리움을 노래하곤 했다(『孤竹遺稿』, 「寄玉峯」). 문집에 실리지 않은 많은 시가 오갔겠지만,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시를 통해 짐작되는 서로 간의 애틋함이다. 달리 말하면, 국외자(局外者)의 위치에서 상대에게 위안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동질감을 확인하려는 그 마음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러한 간절함, 곧 다언(多言)을 필요하지 않은 진정성(眞情性)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질에 대한 자각 없이도 관계의 건강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효율을 강조하는 지금에는 이것이 자연스레 수긍되고 오히려 강조되기도 한다. 손쉽게 연락하고 다채롭게 표현하고, 연락의 횟수에 비례하여 만족감도 큰 시대이다.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지만 숱한 언어가 마음을 겉도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걷잡을 수 없지만 묵묵하게 감싸는 그리움. 그러한 그리움을 시로 적어가는 시인의 마음이 그리운 시대다. 글쓴이 김창호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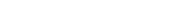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