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 길을 열다] 빛과 길과 땅 ②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선비, 길을 열다
|
||||||||||||||||
|
해풍에 실린 늦봄의 햇살은 노곤하였다. 국망의 세월 “만겁이 지나도 한국의 선비요, 일생을 드러내지 않고 공문(孔門)에 의탁하리” 하였던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계화도를 돌아보고,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외치며 흰 등거리에 죽창을 들고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의 장관을 연출한 백산성 옛터의 〈동학혁명백산창의비〉에서 불끈하였다. 한 분의 푸념, “연재(淵齋)는 죽고 면암(勉菴)은 싸웠는데, 간재는 왜 그렇게 나서지 않았는지!” 면암은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이고 연재는 송병선(宋秉璿, 1836∼1905), 한말 위정척사 원로다. 충청도 회덕 살던 연재는 을사오적의 처형과 늑약의 파기를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독약을 마셨고, 경기 포천 출신으로 호서 청양으로 이사 왔던 면암은 전라도 태인 무성서원에서 창의하여 정읍ㆍ순창ㆍ곡성을 지나 순창에서 관군이 포위 공격하자 ‘차마 동족끼리 싸울 수 있겠는가!’ 의병을 해산하고 대마도에서 순국하였다. 그런데 간재는 왜 좌시하였는가! 분명 불만이었다. 더구나 간재는 삼일운동 이후 유림의 파리장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 다른 분의 변호. “간재는 제자들에게 국권을 회복한다고 외세의 무리와 손잡으면 이것은 나라도 찾기 전에 내 몸이 먼저 오랑캐가 되는 짓이니 차마 할 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우리의 학문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던 선택도 존중해야 합니다. 안중근 추도시를 읽어봅시다.”
우리 전통 학문이 구학으로 매도당하던 세월, 천주교를 받아들인 안중근은 교수형을 앞두고선 ‘見利思義 見危授命[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침]’과 같은 공자의 어록을 적으며 마음을 추슬렀다. 부안 상서면 어느 마을 ‘타루비(墮淚碑)’ 앞에서 섰다. 이태백의 시구에서 따왔단다.
사연이 아련하였다. 1597년 전라도가 처참하게 짓밟혔던 정유재란 그해 늦가을, 고을 선비 이유(李瑜)가 의병에 나섰다가 순절하자 부인 김씨가 복수의 창을 들고 적진에 돌진하다가 산화하였다. 비문의 마지막 구절이 다음과 같았다. “당신의 그 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 있는 것이다.” 먹먹하였다. 영광에서 태어난 이유(1545∼1597)는 양부를 따라 부안으로 옮겨와 부안 김씨에게 장가들고 처가 마을에 살았다. 생부는 을사사화 직후 윤원형의 권세를 믿고 성균관에서 소란 피운―아마 사찰 나왔을 군졸과 관노를 내쫓았다가 성균관에서 퇴학당하고 의금부에 갇혔던 이장영(李長榮, 1521∼1589), 한참 후에 과거 들고 여러 고을을 맡으며 ‘청백’으로 이름을 알렸었다. 본관은 함평. 그날 나는 부안을 벗어날 때까지 조선후기 소나무가 많아 금송(禁松) 즉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인 변산에서 나무 베어 소금 굽고 배를 만들며 농토를 넓혀갔던 부자와 백성이 ‘변산적’으로 몰리면서, 1728년(영조 4) 임금과 노론을 몰아내고자 변란을 일으켰던 사실을 감췄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 가는 봄 햇살이 들판에 너르게 누울 즈음, 고창 성송면 어느 마을 앞에 잠시 멈췄다. 동네 어귀에 ‘의사정시해공충효비(義士鄭時海公忠孝碑)’가 들어왔다. “아, 그분이군요.” 정시해(1872∼1906)는 면암이 주창한 태인 의병의 소모장과 중군장으로 나섰다가 순창에서 관군의 기습으로 운명하였다. 이때 죽음을 바친 오직 한 사람으로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문인이었다. “정시해는 고기 잡고 나무하고 농사지어 부모를 봉양하였던 효자였습니다. 본래 관례 치루면서부터 불렀던 자(字)가 낙언(洛彦)이었는데, 송사가 ‘즐거움이 나한테 있으면 즐겁지 않은 때가 없지만, 밖에 있으면 즐거울 때가 없는 것’이라는 뜻을 담아 즐거울 낙 선비 언, 낙언(樂彦)으로 고쳐주었답니다. 그런데 정녕 당신은 불길한 시국에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실국광민(失國狂民), 나라 잃은 미친 백성이라 울부짖으며 일광(一狂)으로 자호 삼았습니다.” 어디선가 상쾌한 탄성, “이 비석이 있어 마을 들판, 이 땅이 문득 훤하구먼.” 순국선열의 시리도록 아름다운 사연 그것은 빛이었다. 우리는 지식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 빛인 줄을 까마득히 몰랐었다. 그러니 우리의 산하도 어두웠다! 이때의 경험은 2007년 늦봄 필자가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원형발굴―문화택리지 시범사업: 문화노마드의 길, 시공유예의 꿈》을 수행할 수 있었던 상상의 자양이 되었다. ‘빛을 찾아가면 길이 되고, 길을 묶으면 땅’이라는 즉, ‘점ㆍ선ㆍ면 ⇒ 빛ㆍ길ㆍ땅’을 통하여 국토와 문화 읽기를 시도한 것이었다. 옛글을 짤막하게 얽어가며 얼개를 짰다. 관광의 어원은 나라의 빛을 본다는 ‘관국지광(觀國之光)’이다. 옛적 나라의 빛은 임금이 사는 도성, 궁궐에서 나왔다. 따라서 나라의 빛을 보려면 임금의 손님 즉 벼슬을 해야겠는데, 그렇다면 먼저 뜻을 세우고 자신을 살피고 백성을 살펴야 할 터, 『주역』 「관괘(觀卦)」에 있다. “나라의 빛을 봄은 손님이 되려는 뜻을 높이는 것이고, 내 삶을 봄은 백성을 봄이라.1) 따라서 자신이 벼슬할 만큼 공부 수양이 되었는가? 어떻게 백성을 살릴 것인가? 그러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길은 절로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열어간다. 공자가 말하였다. “사람이 길을 넓히지 길이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2) 길과 길이 모이면 땅[坤]이다. 『주역』 「곤괘(坤卦)」에 따르면, “마침내 하늘을 받들어 두터움으로 만물을 담고 있으니, 그 덕은 끝이 없고 품은 것이 온통 빛나고 넓으니 만물이 형통하다.” 군자는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로우며 올곧은 땅의 속성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3) 옛적에는 왕궁의 빛이 가장 찬란하였지만, 오늘날의 빛은 겨레의 놀이와 솜씨, 우리 시인ㆍ화가의 노래와 그림, 우리 철인ㆍ고승의 사상과 학덕, 의인ㆍ걸사의 분노와 희생에서 나온다. 우리의 삶터와 일터, 배움터와 놀이터 또한 빛이다. 일찍이 이중환(李重煥)이 『택리지』에 즐거운 삶터, 낙토(樂土)를 정의한 바 있다. “무릇 살만한 땅은 지리가 으뜸이고 생리가 다음이며, 그리고 인심과 산수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낙토가 아니다.” 이렇게 읽고 싶다. “사람들은 좋은 땅에서 풍수를 먼저 연상하지만, 지형ㆍ기후ㆍ생태 등을 살펴 사람 살리는 일터를 가꾸고, 사람다울 수 있는 교육과 문화를 일으켜야 비로소 산수의 풍광에 즐거울 수 있다.” 빛은 우리의 시공을 타고 우리의 삶과 마음에 있다. 따라서 어떤 점에 머물지 않고 갇히지 않는다. 최근 유클리드와 뉴턴ㆍ데카르트를 소개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의 과학칼럼이 반가웠다.4) “점은 물체가 아니라 과정이며,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하여 마침표가 아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부피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간의 부피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길 터, 그것은 사람의 아픔, 사랑, 창의, 지혜로 충만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 ‘우리’의 빛은 ‘지금’에 멈추지 않고 ‘내일’을 비출 것이다. 살만한 땅을 위하여 길을 열었던 사람들의 빛을 찾아가는 까닭이다. 1) 「觀卦」 “象曰 觀國之光 尙賓也. 觀我生, 觀民也.”
2) 『論語』 「衛靈公」 “人能弘道, 非道弘人” 3) 「坤卦」 “彖曰 至哉 坤元, 萬物資生, 乃順承天, 坤厚載物, 德合无疆, 含弘光大, 品物咸亨…柔順利貞, 君子攸行.” 4) 《경향신문》 2018.10.18. 글쓴이 이종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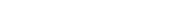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