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초대석] 둥근달 밝게 빛나는데 벌써 꽃은 져버리고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명시초대석
|
|||||||||||||||||||||||||||||||
|
인생을 정의하는 말들은 많다. 그런데 어느 것도 인생을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저마다 앞에 놓인 길이 다르고 걸음을 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생에 관한 어느 말도 쉬이 흘려보낼 수 없다. 생로병사를 거치고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본질에 대한 답은 없고 참고 사항만 무수한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굴곡진 삶의 마디에서 인생의 본질을 노래한 시 한 수를 소개한다. 이 시의 작자 습재(習齋) 권벽(權擘, 1520∼1593)은 명가의 후예였다. 원간섭기 일가구봉군(一家九封君)의 영화를 누렸던 보(溥)의 후손으로, 조선 개국공신인 근(近)이 5대조, 세조의 집권에 기여했던 준(蹲)은 4대조였다. 이로써 보면 가문 배경이 탄탄하였지만, 준 이후는 음사(蔭仕) 벼슬에 나서는 정도, 그러다가 부친 기(祺)가 문과에 진출하며 집안은 재도약기를 맞이하는 듯했다. 그러나 부친은 권신 김안로(金安老)의 위세에 밀려 현달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도성 밖으로 옮겨 살았다. 권벽은 어렸을 때 부친의 임소(任所)를 따라다니면서도 과거 공부에 힘을 쏟아서 1543년 대과에 합격하고 승문원에서 관직을 시작하였다. 벼슬을 시작할 무렵 권벽은 마음이 통하는 벗을 만났으니, 문과 동방(同榜)으로 문명이 높고 호방한 윤결(尹潔, 1517∼1548)이었다. 두 사람은 격의 없이 대화하고 자주 시를 주고받았다. 대과 급제 이듬해 윤결에게 건넨 시에는 신진 관료로서의 기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시인은 꽃이 지고 새가 우는 봄날의 정경을 보며 약동의 리듬을 느낀다. 20대 중반 젊은 관료로서 태평시대의 일원으로 임금에 보답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패기와 열정 그리고 포부가 가슴 가득하였다. 그러나 이도 잠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재위 8개월에 승하한 인종에 이어 명종이 즉위하며 흔히 대윤(大尹)ㆍ소윤(小尹)의 갈등으로 많은 선비가 희생당한 을사사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 수렴청정하던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와 윤원형 일파는 무서운 고문과 조작으로 외척 권신을 반대하는 사림파 관료를 역모죄로 처형하면서 공포정치를 자행하였다. 이즈음 작품 「봄날 밤에 바람 불고 비가 내리다」는 가볍게 읊조린 듯하지만 느낌이 심상찮다.
비 내려 꽃이 피며 봄은 오고, 바람 불어 꽃이 지면서 봄은 간다. 한철의 봄은 이렇게 비와 바람을 매개로 꽃이 피고 지는 가운데에 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비와 바람이 함께 거세게 몰아쳤다. 한바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꽃은 활짝 피고 어떤 꽃은 져버렸다. 그대로 읽으면 봄날의 한 장면을 스케치한 것이다. 감정의 실마리는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비바람[風雨]을 혼돈, 격변, 부대낌으로 읽으면, 복사꽃은 소란 속에 득세한 무리, 살구꽃은 그런 와중에 희생된 선류(善類)를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복사꽃[桃花]은 간신을 비유하였으니 이러한 해석도 무리는 아니다. 봄날의 한 장면을 담은 이 시는 사화에 의해 뒤바뀐 세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화는 단발로 그치지 않았다. 갖가지 구실을 붙여 많은 인사가 유배 가고 죽음을 받았는데, 속마음을 터놓았던 윤결까지 화망(禍網)에 걸려들었다. 시정기(時政記)에 사화의 전후 상황을 자세히 적었던 안명세(安名世, 1518∼1548)가 참형 당한 것을 안타까워하던 차에, 술자리에서 그의 직필을 변호하였다가, 그러한 언행이 알려지면서 국청에 잡혀들어가 고문을 당하다가 옥사한 것이다. 이 일은 권벽에게 충격을 넘어 인생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후로 세상일에 관심을 끊고 남들과 교유하지 않았다. 이정귀(李廷龜)가 『습재집』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집에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안부를 묻고는, 다시 한 마디도 주고받지 않은 채 덩그러니 진흙으로 만든 상(像)처럼 있었다. 自是擺落世事, 不復與人交游, 人有來訪者, 問無恙外, 不接一語, 凝然如泥塑人.” 권벽은 벼슬을 그만두지는 않았어도 세상을 비켜나 살았다. 이러한 권벽에게 시는 자신의 침묵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가 남긴 3,100여 수는 일상의 세세한 기록이자 독백의 언사였다. 앞의 「둥근 달을 보며 져버린 꽃을 안타까워하다 對月惜花」는 그러한 침묵의 삶 어느 마디에서 그가 정의한 인생의 본질이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자. 꽃이 한창 아름다운 어느 날 밤, 시인은 둥근 달이 뜨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기다리던 보름밤이 되자 꽃은 벌써 시들어버렸다. 꽃과 달은 보이는 그대로 꽃이요 달이지만, 회한과 격정의 시기를 보낸 시인이 삶을 회고하는 상징이 아닐까?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20년, 왕실과 조정을 주물렀던 문정왕후가 죽고 윤원형까지 몰락하면서 정계는 사림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인을 이러한 세월에 세워놓으면, 창작 시기가 불명한 이 작품은 한층 수월하게 읽힌다. 벼슬을 시작하며 벗과 함께 큰 꿈을 꾸던 시절, 포부를 실현할 기회는 오지 않고 시련만이 가득했다. 세월이 지나 득세하던 무리가 퇴조하고 새 시대가 열린 지금, 함께 새 세상을 이야기하던 벗은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다. 젊은 날의 벗은 어디로 갔는가? 새로운 세상은 열리고 있는데, 벗은 없고 늙음만이 앞에 와 있다. 시인은 생각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날 밤 땅의 꽃과 하늘의 달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인생은 ‘결여’(缺如)일 수밖에 없는가? 시인은 씁쓸한 마음으로 인생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경외(敬畏)케 하는 것들이 있다. 그림이나 조각물, 몇 줄의 시에서 우리는 가끔 전율을 느낀다. 그저 아름답다는 표현으로는 담아내지 못할 그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러한 작품에는 인간 존재의 비원(悲願)이 담겨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여를 본질로 하는 인간의 삶에 기초해 있다. 결여로부터 완전성을 지향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제각각의 결정물(結晶物)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망각했던 인생의 본질 앞에 숙연해진다. 시야를 우리에게 돌려보자. 본질로서의 결여를 추상 개념이 아니라 가슴에 내려앉는 실물(實物)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삶의 도정에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함’이다. 저 숭고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 고집스럽게 자신의 세계를 일구어 간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그들은 본질로서의 결여를 확인하는 지점에서 이 간절함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갈망한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인생의 불완전성에 대한 진지한 통찰의 끝에서 시작된다. 글쓴이 김창호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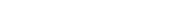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