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초대석] 어부의 집에는 석양빛도 많아라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명시초대석
|
|||||||||||||
|
현대적 도시의 삶은 온갖 편리로 가득하다. 짧은 동선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 게다가 도시의 공간은 효율성을 더해간다. 시설마다 촌각(寸刻)을 다투는 사람들의 발끝에 매끈하게 이어지고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생을 마칠 사람들이, 먼 미래 도시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대이다. 도시의 삶에는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다. 경로와 디자인만 다를 뿐, 도시는 여전히 한 시대 욕망의 집합체다. 무언가를 향한 쟁투(爭鬪)와 피로를 덜어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기기(機器)를 닮아간다. 그러나 기기처럼 리셋할 수 없는 일상은 공허와 우울로 귀결되기 일쑤다. 분위기를 전환할 계기(契機)를 찾지 못하는 우리는 늘 뭔가가 목에 걸린 듯, 불편함을 안고 산다. 일상의 돌파구는 어디에 없는 것일까? 전통 시대의 시 한 수를 읽으며, 다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 이 시를 지은 사암(思庵) 박순(朴淳 1523∼1589)은 선조 치세 ‘사림재상(士林宰相)’의 칭호를 얻었다. 나주에서 태어났고 본관은 충주다. 부친 박우(朴祐)는 기개와 지조가 있고, 개성 유수(留守)를 지냈다. 중부는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이름 높은 눌재(訥齋) 박상(朴祥)이다. 화담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으로 중년에 이황(李滉)을 사사(師事)하였고, 이이(李珥)ㆍ성혼(成渾)과 깊이 사귀었다. 1553년 정시(庭試)에 장원급제하고 성균관 전적으로 벼슬을 시작하였다. 을사사화를 방조한 위사공신(衛社功臣) 임백령(林百齡)의 시호를 짓는 문제로 파직되어 고향으로 물러나기도 하였다. 이후 대사간이 되자 윤원형(尹元衡)을 탄핵하여 파직시키면서, 외척정치의 종식 적폐청산에 앞장섰다. 예조ㆍ이조판서를 지내고 의정부에 진입하여 영의정을 지냈다. 고결한 인품으로 이름이 높았다. 송순(宋純)은 박순이 이조판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청탁이 근절될 것 喜曰朴某秉銓 關節絶矣’이라 하였고, 이황은 ‘박순과 마주하면 한 덩어리 맑은 얼음과 같아서 정신이 갑자기 시원해짐을 느낀다 與朴某相對 烱如一條淸氷 覺神魂頓爽”고 칭찬한 바 있다. 박순은 불의에 단호하면서도 따스한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었다. 홍문관 시절이었다. 윤원형이 임백령의 시호를 제정할 때 내심 ‘충(忠)’이 들어가기를 기대했으나 박순은 ‘공소(恭昭)’로 올렸다. 시법(諡法)에 ‘과실을 하였다가 능히 고친 것[旣過能改]’을 공(恭)이라 하고, ‘용의가 공손하고 아름다운 것[容儀恭美]’을 소(昭)라 하였으니, 기실은 임백령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것이었다. 윤원형이 모함하여 벌을 주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박순은 태연하게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조정을 향하였다. 의금부에 갇힐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관직을 파면당하는 선에서 일이 끝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소처럼 어린 딸이 반갑게 맞이하였다. 웃으며 딸의 손을 잡은 박순, “하마터면 너를 다시 보지 못할뻔하였구나.” 39세, 1561년 봄이었다. 박순은 적자가 없고 딸 하나만 두었다. 위에 소개한 시는 36세 무렵,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던 시기에 지었는데,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느껴진다. 사가독서는 젊고 유능한 문신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학문을 닦도록 하는 제도였다. 독서당은 제목 중의 ‘호당(湖堂)’이라고도 하였는데, 지금 서울 동호대교 북단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신(李濟臣)의 「청강시화淸江詩話」에 이 시를 창작하는 배경이 나와 있다. 독서당의 어느 날, 소나기가 한참 내리더니 저물녘이 되어 그쳤다. 그런데 이날 따라 물을 머금은 강변이 무척 아름다웠다. 학사들은 저마다 시 한 수씩을 지어 내놓았다. 박순도 한 수를 지어 보였는데, 바로 이 작품이다. 먼저 시상(詩想)의 전개를 보자. 시상은 시선(視線)을 따라 펼쳐지는데, 시선은 카메라의 렌즈처럼 움직인다. 멀리 강가로 흘러가는 지류(支流)의 물결로, 다시 가까이 난간 밖 나뭇가지 끝의 물방울로, 그러다가 초점을 잡듯 눈길이 머문 곳이 강가 어부의 집이다. 어부는 비 온 뒤 잠깐 드러낸 햇살 아래 일상사에 분주하다. 엉성한 울타리에는 비 맞은 도롱이를 널고, 허름한 처마엔 내일을 위해 젖은 그물을 말린다. 짧은 시간의 햇살이지만 그것을 실컷 누리는 어부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다. 시인은 강과 산을 주변으로 밀어내고는, 어부의 집을 중심에 둔 그림 같은 시를 완성하였다. 동료 학사들은 ‘참으로 노래 있는 그림 眞有聲之畫’이라며 칭찬했다. 사실 박순은 자연 경물을 빌어서 인간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탁월한 재주를 지닌 시인으로 유명했다. 이 시에서 눈에 뜨이는 것은 눈앞의 정경을 읽어내는 방식이다. 갠 날 저물녘 강변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다. 교량이 놓여있고 건물이 시야를 가리는 지금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한적하였으리라. 시인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으레 떠올릴 만한 제재들, 말하자면 강변 정경을 다루는 한시(漢詩)에 등장하는 관습적인 이미지, ‘노을’이나 ‘먼 산’, ‘오가는 배’와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그리고는 고상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어부의 집’에 주목하고, 어부의 집을 중심에 둔 저물녘 강변의 모습을 창조하였다. 그 순간 정적(靜的)이던 풍경은 이채(異彩)로 생동하는 개성적인 풍경이 되었다. 시인의 접근 방식에서, 문득 도시의 삶을 생각하게 된다. 도시적 삶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박제화한다. 사람들은 트랜드에 환호하고 세련된 외양으로 자신을 치장하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에 영혼은 없다. 영혼이 없기에 공허하고 공허한 마음은 짙은 우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패턴화된 도시적 일상은 사람마다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렇지만 도시적 일상을 새롭게 할 재해석과 재구성의 방식은 무궁무진하다. 재해석과 재구성에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계기는 책 속 몇 줄 글에 있을 수도 있고, 도시적 삶이 잃어버린 자연과 계절의 리듬 속에 있을 수도 있다. ‘어부의 집’을 통해 강변 풍경에 생명을 불어넣은 시인처럼, 우리도 답답한 도시를 신선한 공간으로 돌려놓을 나만의 계기를 찾아보자. 글쓴이 김창호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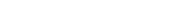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