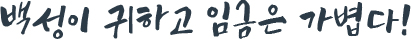[선비, 길을 열다] 백성이 귀하고 임금이 가볍다!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선비, 길을 열다
|
||||||||
|
전쟁하는 나라들의 시대, 열국의 제후 군주는 땅을 넓히고 시장을 열었으며, 성곽을 높이고 병사를 늘렸다. 주검이 골짜기와 들판을 채웠는데, 궁실은 ‘화려한 비단옷에 날카로운 검을 차고 싫증나도록 먹고 마시고도 재산이 남아도니 나 도둑이요, 과시하는’ 형국이었다.1) 이런 중에 양주(楊朱)는 ‘자기 털끝 하나도 세상을 위하여 뽑지 않겠다는 위아(爲我)’를 자부했고, 묵적(墨翟)은 ‘정수리부터 발꿈치가 닳아지도록 온몸을 희생하는 겸애(兼愛)’를 표방하였다.2) 양주는 공자에게 나루터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던 은자들의 환영을 받았고, 묵적은 하층민이 따랐다. 자신이 숙련된 목공이었던 묵적은 노동을 중시하였다.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그 힘에 의지하면 살고 그 힘에 의지하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3) 묵적은 노나라에 살며 유학을 배우고 공자를 전수하였지만, 유가를 매섭게 비판하였다.4) 형식적 의례 특히 삼년상을 거부한 것이다. 공자는 낮잠을 자다가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 담장은 손질할 수 없다’라는 꾸지람을 들었던 재아(宰我)가 삼년상이 길다고 하였을 때, 일깨웠던 적이 있었다.5) “자식은 3년 지나서야 부모 품을 벗어나니 삼년상은 천하 공통의 상례이다.” 맹자가 나섰다. “양주와 묵적의 주장이 천하에 가득하여 양주가 아니면 묵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양씨는 자신만을 위한다고 하니 임금이 없고, 묵씨는 모든 이를 똑같이 사랑하니 아버지가 없게 된다.”6) 양주를 무군(無君), 묵적을 무부(無父)로 배척한 것이다. 양주를 앞에 말하지만, 과녁은 묵적이다. 묵적은 또한 하늘의 뜻[天志]을 높이고 귀신을 밝히는 명귀(明鬼)를 앞세우며, 유가를 몰아세웠다.7) “귀신이 없다고 하면서 제례(祭禮)를 배우라고 하니, 이는 손님이 없는데 손님을 맞이하는 예를 배우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하늘에 밝히지 못하고 귀신을 신령스럽게 여기지 않아서 천귀(天鬼)가 기뻐하지 않으니 천하를 잃을 만하다.” 일찍이 공자는 자로가 귀신 섬김을 묻자,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고, 또 죽음을 묻자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하였다.8) 또한 ‘성(性)’과 ‘천도(天道)’를 들려주지 않았으며, ‘괴력난신(怪力亂神)’ 즉 괴상하고 힘을 쓰고 도에 어긋난 일 그리고 귀신을 입에 담지 않았고, 리(利)ㆍ명(命)은 물론 인(仁)조차도 드물게 말했다.9) 공자는 앎[知]을 ‘백성의 의로움에 힘쓰며 귀신을 공경하지만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가르쳤음이었다.10) 맹자는 인간의 성ㆍ명ㆍ천도에 대하여 적극, 발언하였다. 공자는 성품을 ‘서로 가깝지만, 습관에 의해 서로 멀어짐’ 정도에 그쳤지만, 맹자는 천성(天性)을 밝혔다.11) 그것은 ‘본래 선하고, 누구나 본디 갖춘’ 인의예지(仁義禮智)였다.12) 측은, 수오, 사양 혹은 공경, 시비의 마음을 실마리로 삼았다.13) 마음의 근원은 본성이며 본성의 근원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였다.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본성을 알 수 있으며, 그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 수 있다. 그 마음을 보존하여 그 성을 기름[存心養性]은 하늘을 섬기는 바요, 요절하거나 장수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몸을 닦고 기다림은 명(命)을 세우는 것이다. 무엇이든 명이 아님이 없으나, 그중에서 바른 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14) 지성(知性), 지천(知天), 사천(事天), 입명(立命), 순명(順命)을 위하여 마음에 진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맹자가 공부 핵심을 마음을 지키는 ‘구방심(求放心)’에 두었던 까닭이다. 공자 평생의 인격 도야의 경지, 불혹과 지천명 그리고 이순(耳順) 혹은 순천(順天)을 설명하였음이 틀림없다. 마음을 다하고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성인, 요순 같은 선왕이었다.15) 안연(顏淵)이 말하였다.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역시 순임금같이 될 수 있다.16) ‘성인도 같은 사람이다.’17) 맹자도 말하였다. “선에 밝히지 못하면 자신을 성실하게 할 수 없다. 성실함은 하늘의 길[天道]이고, 성실을 추구함은 사람의 길[人道]이다.”18) 맹자의 논설은 공자의 ‘성’ ‘명’ ‘천도’에 대한 풀이이면서 동시에 ‘유가는 하늘에 대하여 밝지 않고 귀신을 영험하지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한’ 묵가에 대한 논파이기도 하였다. 맹자의 시대, 정치 현실은 병가(兵家), 법가(法家), 종횡가(縱橫家)의 무대였다. 이들은 정법으로 인심을 굴복시키고 형벌로 목숨을 위협하고 술수로 권세를 확립하였다. 그러한 법(法)ㆍ형(刑)ㆍ술(術)은 죽음을 싫어하는 만큼 살고 싶고, 가난을 미워하는 만큼 재물을 좋아하는 욕생(欲生)ㆍ호리(好利)의 본능을 최대한 끌어내고 집약하였다. 전쟁으로 혼란, 난세를 끝내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으로 명분 삼았으니, 일찍이 관중(管仲)이 주창하고 손무(孫武)ㆍ오자서(伍子胥)ㆍ오기(吳起)ㆍ신불해(申不害)ㆍ상앙(商鞅)ㆍ신도(愼到)ㆍ순우곤(淳于髡)ㆍ소진(蘇秦)ㆍ장의(張儀) 등이 분파를 세웠다. 이들이 부국강병, 패권을 꾀하던 제후의 선택을 받았다. 맹자 또한 대량(大梁)으로 도읍을 옮긴 위나라 혜왕(惠王)의 부름을 받았다. 『맹자』는 유명한 대화로 시작한다.19) 어르신은 장차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해주시렵니까?” “왕께서는 하필 리(利)를 말씀하십니까?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맹자는 대우는 받았어도 말벗이었을 뿐, 혜왕을 승계한 양왕(襄王)은 더욱 실망이었다. ‘누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가’를 묻기에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통일할 수 있다’ 하였지만, 건성이었다. ‘임금 같지도 않고, 두려워할 만한 위엄도 없었다.20) 맹자는 ‘신하는 임금 섬김에 의리가 없고 나섬과 물러남의 예가 없고, 말끝마다 선왕의 도를 비방’하는 세태가 답답하였다21) 사군(事君)의 방향을 인군당도(引君當道)와 격군심(格君心)으로 제시하였다. “군자의 임금 섬김은 임금을 도를 감당하도록 이끌어 뜻을 어짊에 두도록 할 뿐이다.”22) “대인(大人)이라야 임금의 마음 잘못을 고칠 수 있다.”23) 대인은 높은 벼슬이 아니라, ‘자신을 바르게 하여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착함을 가득 채워 밖으로 광채가 빛나는’ 사람이다.24) 제나라 선왕이 공경(公卿)에 관하여 물었을 때였다. “귀척은 임금의 큰 잘못을 반복해서 간언해도 듣지 않으면 임금의 자리를 바꾸고, 이성(異姓)은 임금의 (작은) 잘못이라도 반복해서 간언해도 듣지 않으면 나라를 떠난다.”25) 거국(去國)과 역위(易位)! 이렇게 유세할 수 있음은 다름이 아니었다.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이 그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26)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사직은 백성을 위하여 토신(土神)과 곡신(穀神)을 모시는 제단이니, 백성을 살리지 못하고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군주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1) 金是天 譯註 『譯註 老子道德經注』 53장 “服文綵 帶利劍 厭飮食 財貨有餘 是謂盜夸”
2) 『孟子』 盡心 上 “孟子曰 楊子取爲我 拔一毛而利天下 不爲也. 墨子兼愛 摩頂放踵 利天下 爲之.” 3) 金學主 譯著 『新完譯 墨子』 上 非樂篇(상) “賴其力者生, 不賴其力者 不生.” 4) 이준영 해역, 『회남자』 하, 제21권, 要約 “墨子 學儒者之業 受孔子之術 以爲其禮煩擾而不悅 厚葬靡財而貧民” 5) 『論語』 公冶長 “宰予晝寢. 子曰朽木不可雕也, 糞土之墻 不可杇也, 於予與何誅?” 및 陽貨 “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6) 『孟子』 滕文公下, “楊朱墨翟之言 盈天下, 不歸楊則歸墨. 楊氏 爲我, 是無君也, 墨氏 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7) 『신완역 묵자』 하, 公孟篇, “無鬼而學祭禮 是猶無客而學客禮也…儒以天爲不明. 以鬼爲不神, 天鬼不說, 此足以喪天下.” 8) 『論語』 先進, “季路問事鬼神. 子曰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未知生 焉知死.” 9) 『論語』 公冶長 “子貢曰…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및 述而 “子不語怪力亂神” 및 子罕 “子罕言利與命與仁” 10) 『論語』 雍也 “樊遲問知 子曰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 11) 『論語』 陽貨 “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12) 『孟子』 告子上 “性善…仁義禮智 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13) 『孟子』 公孫丑上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知之端也.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14) 『孟子』 盡心上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殀壽不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 莫非命也 順受其正” 15) 『孟子』 滕文公上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 및 盡心上 “形色 天性也, 惟聖人然後 可以踐形.” 16) 『孟子』 滕文公上 “顏淵曰 舜 何人也, 予 何人也? 有爲者 亦若是.” 17) 『孟子』 公孫丑上 “聖人之於民 亦類也” 18) 『孟子』 離婁上 “不明乎善 不誠其身矣. 誠者 天之道也, 思誠者 人之道也.” 19) 『孟子』 梁惠王上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20) 『孟子』 梁惠王上 “孟子見梁襄王 出語人曰 望之不似人君 就之而不見所畏焉, 卒然問曰 天下 惡乎定? 吾對曰定于一. 孰能一之? 對曰 不嗜殺人者能一之.” 21) 『孟子』 離屢上, “事君無義 進退無禮 言則非先王之道者 猶沓沓也”. 22) 『孟子』 告子下 “君子之事君也, 務引其君以當道, 志於仁而己.” 23) 『孟子』 離屢上, “惟大人 爲能格君心之非.” 24) 『孟子』 盡心上 “大人者 正己而物正者也” 盡心下 “充實而有光輝之謂大” 25) 『孟子』 萬章下, “貴戚之卿…君有大過則諫 反覆之而不聽則易位…異姓之卿…君有過則諫 反覆之而不聽則去.” 26) 『孟子』 盡心下,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是故得乎丘民而爲天子, 得乎天子爲諸侯, 得乎諸侯爲大夫, 諸侯危社稷則變置.” 글쓴이 이종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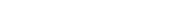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