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유학문선] 바다에서 비추어 유학이 밝아진다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근대유학문선
|
||||||||
|
바다란 무엇인가? 예로부터 바다는 서울에서 머나먼 곳, 왕화(王化)의 밝음이 미치기 어려운 가장 어두운 구석이었다. 육지의 끝 바다는 절망하는 곳, 함평 선비 김성현은 명나라 운세가 다함을 보고 바다에서 종적을 감춰 해은(海隱) 처사라는 칭호를 얻었다. 최남선이 노래하는 소년의 바다는 이와 다르다. 철썩, 철썩, 쏴아, 바다는 육지를 때리고 부수고 무너뜨린다. 낡음의 파괴, 새로움의 건설이다. 소년의 바다와 함께 유학자의 바다도 새롭게 나타났다. 『유교유신론』의 지은이로 유명한 안동 유학자 송기식, 그는 바다 너머를 통찰하고 자기 공부방의 이름을 바다의 창, 곧 해창(海窻)이라 지었다. 유학자의 아호로 유례가 없는 해창, 그가 투시하고 있던 창 너머 밝은 햇살은 무엇이었을까? [번역] 나라를 잠그고 살면 바다는 담장이다. 나라를 열어 놓으면 바다는 창이다. 바다가 담장일 때에는 글 읽는 선비가 자기가 본 것을 높이고 자기가 들은 것을 익힌다. 이 때문에 자기 생각 이외에는 비출 수 있는 다른 생각이 없다. 그런데도 다른 학설이 침입할까 근심해서 외부의 배척을 대의로 삼는다. 바다가 창일 때에는 글 읽는 선비가 고금을 절충하고 동서를 종합한다. 이 때문에 자기 단점을 버리고 남의 장점을 따라 이를 기꺼이 취해 선을 행한다. 그러고도 자기의 학설이 치우칠까 근심해서 겸허한 수용을 주의로 삼는다. 이전 사람은 좁고 지금 사람은 넓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 사람은 어리석고 지금 사람은 슬기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화의 단계이다. 역사의 추세이다. 만약 이전 사람과 이후 사람이 처지를 바꾸어도 모두 그러할 것이다. 대세가 굴러가는데 누가 그 궤도에 순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 이 천하의 이치가 어찌 한 나라, 한 사람의 사유물이겠는가? 내가 어릴 적에 성현의 경서와 영웅의 사서를 읽으면 매번 시정(時政)이 합당하지 않고 인문(人文)이 구비되지 않음을 탄식하였다. 해외에서 공화설(共和說)이 수입되어 오자 그런 뒤에야 공자의 대동설(大同說)과 부합함을 기뻐하였다. 다시 민주설(民主說)이 수입되어 오자 그런 뒤에야 맹자의 민귀설(民貴說)2)과 부합함을 기뻐하였다. 국제연맹(國際聯盟)3)의 회의가 매일 보도되자 그런 뒤에야 춘추시대의 회맹(會盟)의 의리와 같음을 기뻐하였다. 가지가지 여러 학설이 이용후생(利用厚生)에 부합한 것이 어찌 바깥에서 비추어 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창은 밝음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그래서 나의 글 읽는 방을 바다의 창이라고 이름한다. [원문] 國之鎖居也, 以海爲墻. 國之開放也, 以海爲窻. 其爲墻也, 讀書之士, 尊吾所見, 習吾所聞, 故己見之外, 無他可照, 猶恐他說之侵入, 以排外爲大義. 其爲窻也, 讀書之士, 斟酌古今, 綜合東西, 故舍己從人, 樂取爲善, 猶恐吾說之偏着, 以虛受爲主義. 非曰前人窄今人濶, 非曰前人愚後人智, 是乃進化之階段也, 歷史之步趨也, 若使前人後人易地而皆然也, 大勢之轉運, 孰能順其軌道也? 此天下之理, 豈一國一人之私哉? 余少也, 讀聖賢書英雄史, 每嘆時政之不合, 人文之未備. 及其海外有共和之說舶來, 然後喜與孔子大同之說合, 又民主之說舶來, 然後喜與孟子民貴之說合, 有聯盟之會日報, 然後喜與春秋會盟之義同, 種種諸說, 合於利用厚生者, 豈非照乎外而明于內者耶? 窻受明之所也, 故名吾讀書之室曰海窻. [출처] 송기식(宋基植), 『해창문집(海窻文集)』 권5 「해창설(海窻說)」 [해설] 유럽의 역사에서 15~16세기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불리는 사건은 새로운 바닷길의 개척을 뜻한다. 콜럼버스는 유럽을 출발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달하였고 마젤란은 유럽을 출발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에 도착했다. ‘지리상의 발견’에 관한 유럽인들의 영웅담은 예수회 선교사 알레니의 『직방외기』(1623)에 실려 중국과 조선에 알려졌다. 신항로의 개척은 세계지도의 갱신으로 이어졌다. 이 책에 수록된 「만국전도(萬國全圖)」에는 유럽인이 파악한 당시 세계 지명이 적혀 있는데 오늘날과 다르다.4 반면 기독교 선교사 티모시 리처드의 『태서신사남요』(1895)에 수록된 「오주각국통속전도(五洲各國統屬全圖)」는 오대양 육대주의 이름과 위치가 현대 세계지도와 일치한다. 대한제국 학부는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해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책에 수록된 이 지도를 별도로 간행했다. 이에 앞서 최한기의 『지구전요』와 헐버트의 『사민필지』도 공간되어 나왔다. 한국에서도 서서히 ‘지리상의 발견’이라 칭할만한 세계지리의 혁명적 확장이 일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세계의 발견은 새로운 지식의 쇄도를 뜻하였다. 바다 너머의 새로운 지식이 해일처럼 밀려와 이 땅을 강타했다. 안동 유학자 송기식(宋基植, 1878~1948)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의 세계라는 것은 옛날보다 백 배는 된다. 이에 백인이 말하는 ‘학설’이란 것을 들어보니 루소의 민약설이 마침내 공화제를 초래했고 다윈의 진화설이 문명의 단계를 고동시켰다.” 그는 계속해서 와트의 증기설과 프랭클린의 전기설, 마르크스의 과학설과 톨스토이의 노동설도 언급했다. 유학자로서 그가 특히 남다른 관심을 보인 서양 학설은 ‘서철’, 곧 서양철학의 학설이었는데, 그의 명저 『유교유신론』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로부터 근대 영국 사회이론가 벤저민 키드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설이 소개되어 있다. 그는 마르크스를 맥객사(麥喀士), 벤저민 키드를 힐덕(頡德)이라 표기했는데 이는 양계초의 번역어가 성행하던 시대적인 조류를 반영한 현상이다. 중국 근대사상가 양계초가 구축한 세계 지식은 조선 유학자에게 지식의 팽창을 안겨줌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전통적 지식의 관계를 성찰하도록 견인하였다. 송기식은 낙관적인 입장이었다. 그가 보기에 서양의 학설은 유교 전통과 다르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성이 본래 서로 사랑한다 했는데 이는 인성은 본래 선하다는 맹자의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공화국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는 공자의 대동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루소는 천부인권을 밝혀 사람이 나면서 평등권이 있고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맹자가 말한 양지양능(良知良能)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몽테스키외는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을 나눈다 했는데 이는 홍범에서 말하는 팔정(八政)을 분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진화론의 혁명자 키드는 경쟁하지 않으면 진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홍범에서 말하는 강(剛)으로 이기고 유(柔)로 이긴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공부방에 바다의 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바깥에서 비추어 안이 밝아진다는 믿음, 곧 해외의 세계 지식에 비추어 유교 해석의 현대적 지평이 확장된다는 통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그 이상의 꿈이 있었다. ‘성리’, ‘학설’, ‘종교’, ‘과학’,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 세상의 온갖 지식을 종합하고 절충하는 일이었다. 그의 공부방은 미래에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펼쳐질 세계 지식의 총론, 원론을 제조하는 작업장이었다. 고금을 절충하고 동서를 종합하여 학문의 총론, 학문의 원론을 창조하는 과업, 오늘날 한국의 학계는 이를 향해 얼마나 진보했는가? 1) 대세가 … 있겠는가? : 원문은 “大勢之轉運, 孰能順其軌道也?”인데 이는 “대세가 굴러가는데 누가 그 궤도에 순행할 수 있겠는가?”로 번역되어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다. 원문의 ‘能’을 ‘不能’의 잘못으로 여기고 이에 맞추어 번역하였다.
2) 맹자의 민귀설(民貴說) : 맹자는 “백성이 귀중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볍다”고 말했다. 3) 국제연맹 :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세계 평화와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 기구이다. 4) 오늘날과 달리 조선과 일본의 남쪽에 ‘대명해(大明海)’가 있다. 인도 서쪽에 ‘소서양(小西洋)’이, 북미 서쪽에 ‘소동양(小東洋)’이 있다. 미국 서부와 멕시코는 ‘신 이스파니아(新以西把尼亞)’, 멕시코 만의 바다는 ‘신 이스파니아 해(海)’, 아이티 섬은 ‘소(小) 이스파니아 도(島)’이다. 홍해가 둘이 있는데 오늘날의 홍해는 ‘서홍해’, 오늘날 멕시코의 코르테스해는 ‘동홍해’이다. [참고문헌] 宋基植, 『海窻文集』 권5 「儒敎範圍說示丹陽經學生」 宋基植, 『海窻文集』 권5 「學說左右世界論」 宋基植, 『儒敎維新論』 제12장 「現今各宗敎와 及歐西各學說의 考證比例」 금장태, 「송기식의 유교개혁사상」 『퇴계학보』 112, 2002 이연승, 「해창 송기식의 유교개혁론에 대한 소고」 『종교와 문화』 34, 201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특별전 도록, 『규장각, 세계의 지식을 품다』, 2015 글쓴이 노관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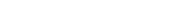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