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초대석] 밤양갱과 버들가지 - 그리움을 노래한 임전(任錪)의 <절양류>- 게시기간 : 2024-04-12 07:00부터 2040-12-25 21:21까지 등록일 : 2024-04-08 17:3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명시초대석
|
||||||||
|
강의의 분위기는 학생들의 표정에서부터 알 수 있다.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면 기분이 좋고 흥도 난다. 어떤 때는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큰 아이와의 대화 중에 들은 말인데, 강의시간에 학생들이 웃는 것은 꼭 재미를 느껴서만은 아니라고 한다. 할 말이 없거나 서먹함을 느낄 때 습관적으로 웃는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는 학생들과 공감할 ‘재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학생들과 만나는 학기의 첫날, 요즈음 핫하다는 노래 ‘밤양갱’의 가사를 준비해 갔다. 강좌명은 ‘한시이야기’. 신입생인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의이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시어(詩語)’는 뭐가 다를까? 이어 스크린에 ‘밤양갱’ 의 가사를 띄웠다.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엉뚱한 답을 한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소하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몇 마디 말을 덧붙였다. 사랑하는 이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부담스러워하지만, 나는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대가 서운하다. 그래서 둘의 마음은 어긋나고 헤어짐에 이르렀다는 것. 그 때 어느 학생이 손을 들었다. “밤양갱을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웃으며 “그럼 이별도 없고, 이 노래도 나오지 않았겠지.”라고 답했다. 웃으며 여러 말을 주고받으려니 이별을 모티브로 한 옛 시들이 생각났다.

봄철의 버드나무(원광대 수목원)

여름철의 버드나무(원광대 수목원) 이별을 다룬 한시에 자주 등장하는 제재가 버드나무의 가지, 곧 ‘버들가지’이다. 버들가지는 겨울이 끝날 무렵, 봄기운을 먼저 알게 해준다. 멀리서 보면 물이 오른 버들가지가 누런 빛을 띠는데, 옛 사람들은 이것을 ‘금빛’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버들가지는 이별의 상황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오늘은 명고(鳴皐) 임전(任錪, 1560~1611)의 <절양류(折楊柳)> - ‘버들가지를 꺾어’라는 제목의 시를 소개한다. <折楊柳>
님은 큰 둑길 따라 가고 저는 하양 땅에서 슬퍼하나니 해마다 강가의 버들은 봄바람에 하늘거립니다 가지를 잡아 봄빛을 꺾어 긴긴 그리움을 부치노니 그대 화병에 꽂아 놓기를 바라는 것은 진실로 이뿐 하늘하늘 이파리 돋아나고 푸른 가지 또 뻗으리니 가지 뻗고 이파리 돋을 때 그것이 저의 마음인줄 아소서 君向大堤去 妾在河陽悲 年年河上柳 搖艶東風時 攀條折春色 寄此長相思 勸君置甁水 所感諒在玆 裊裊定生葉 靑靑又抽絲 抽絲與生葉 妾意君應知 (『鳴臯集』卷之六.) 먼저 시인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임전의 본관은 풍천, 자는 관보(寬甫)이다. 부친은 나주목사를 지낸 임윤신(任允臣), 어머니는 윤신지(尹新之)의 따님이다. 지금의 서울 청파동 지역에서 살았고(이안눌의 『東岳集』 권1, 「客裏逢佳節」의 注에 “任君錪寬甫家在靑坡, 故云城南.”이라는 내용이 있다.) 아들 임기지(任器之) 때에 이르러 나주 남평에 입향(入鄕)한다. 임전은 어렸을 때 성혼(成渾, 1535~1598)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사마시에 합격했으나 대과에는 합격하지 못했고, 몇 차례 참봉에 제수되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임란(壬亂) 때에는 김천일(金千鎰)의 휘하에서 서기(書記)를 맡기도 했다. 임란 이후 서인(西人) 위축기에 시사(時事)에 대한 비분(悲憤)을 내용으로 하는 시들을 많이 썼다.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의 시를 몹시 좋아했으며, 이백을 시대를 건너 뛴 벗, 또는 정신적 존숭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이 시는 여인의 갸날픈 목소리로 시작한다. 여인은 님을 보냈고 계절은 한창의 봄이다. 님이 떠나간 강가의 긴 둑에는 버들가지만이 봄바람에 흔들거린다. 여인은 봄빛 가득한 가지를 꺾어 든다. 가지를 손에 쥐자 그리움이 간절해진다. 여인은 멀리 있는 님에게 버들가지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동시에 버들의 가지를 손에 쥔 님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 가지를 받거든 보는데 그치지 말고 화병에 꽃아 두시기를. 그 가지에 하늘하늘 이파리가 돋아나고 마디가 더해질 때, 그 만큼의 생명력이 곧 그대를 그리는 나의 마음인 줄 아시기를.” 짙푸름을 더하는 버들을 빌어 제어할 수 없는 여인의 그리움을 형상한 시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같은 제재로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時調)가 있다. 묏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 곧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홍랑(洪娘)이라는 기생의 시조이다. 홍랑이 겪은 개인사의 배경 위에 쓰여진 것이다. 홍랑은 16세기 후반 함경도 홍원에서 살았다. 그녀는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재색을 겸비했고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했다. 1573년 이름 높은 시인 최경창(崔慶昌, 1539~1583)이 북도평사로 경성에 온다. 두 사람은 이내 사랑하게 되는데, 이듬해 봄 최경창은 임기가 다 되어 돌아가야 했다. 최경창이 떠나는 날, 홍랑은 영흥까지 따라가 배웅을 한다. 설움을 삼키고 돌아오던 길, 함흥 70리 밖 함관령(咸關嶺)에 이르렀다. 마침 날은 저물어 가고 비까지 내렸다. 홍랑은 처연한 마음을 담아 시조 한 수를 짓고, 버들을 꺾어 함께 최경창에게 보낸다. 창밖에 이 버들을 심고 밤비에 그것이 자라거든 사랑하는 자신처럼 보아달라는 내용이다. 돌아온 최경창은 1575년 한 해 내내 병으로 누워 있었다. 소식을 들은 홍랑은 칠 일 밤낮을 걸어와서는 병 수발을 한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때는 명종 비 인순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국상(國喪) 기간이었다. 그리고 국법(國法)에는 함경도, 평안도 변방의 사람들은 도성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들로 최경창은 논란 끝에 파직을 당한다. 최경창이 죽은 뒤 홍랑은 그의 묘소를 지켰고, 임란 중에는 최경창 시의 원고를 가지고 다니며 병화(兵火)를 피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조선 후기 남학명의 『회은집(晦隱集)』에 전한다.
위의 두 작품은 모티브가 같다. 임전과 홍랑 두 사람 생애의 기간도 겹친다. 최경창이 임전보다 스무 살 남짓 많고, 최경창과 홍랑이 사랑을 나눌 무렵 임전은 10대 중후반이었다. 임전의 문집을 보면 최경창과 시에 대해 논하는 등 교류가 있었다. 그런데 홍랑의 시조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 도성(都城) 안에 회자되던 이 시조를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를 썼을 수도 있다. 동시대의 인물들이기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기실 ‘절양류’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악곡 이름이다. 중국 한나라 시절 가까운 사람을 전송할 때 장안(長安) 동쪽의 패교(霸橋)라는 다리에 나가서 버들가지를 꺾어 주는 풍속이 있었다. 이별을 슬퍼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柳(류)’가 ‘머무르다’를 뜻하는 ‘留(류)’와 발음이 같기에,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버들을 꺾어 직접 건네기도 했지만 멀리 있는 이에게 부치기도 했다. 중국 전종서(錢鍾書, 1910~1988)의 『담예록(談藝錄)』에 따르면 육조(六朝)와 당나라 때까지도 버들을 꺾어 먼 곳에 부치는 풍속이 있었다[玩索六朝及唐人篇什,似尙有折柳寄遠之俗.]고 한다. 대상은 멀리 있는 님인데, 님은 집을 떠나 먼 어느 곳, 또는 군중(軍中)에 있었다. ‘절양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 이별, 또는 그리움과 관련하여 애용되던 시제이자 모티브라 할 수 있다. 위의 두 작품도 이러한 문학 전통에서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4월로 접어들면서 버들이 푸른빛을 더한다. 봄비에 마디를 뻗어가는 버들가지를 보며, 옛날 이별의 순간에 가지를 건네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길을 떠나 시야에서 사라지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러한 불안감은, 한 번 쯤은 ‘가지말라는’[留] 간절한 말로 표현되었을 것이고, 떠남을 받아들여야 할 때에는 서로의 마음을 매개할 그 무엇이 필요했을 것이다. 버들은 어디에서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화병이든 창밖의 땅이든 떠난 이의 관심 속에 파란 잎을 틔울 것이다. 그렇게 되찾은 버들의 생기(生氣)는 보내는 이가 상상하고 떠나온 이가 확인하는 믿음의 교차점이고, 이를 통해 그들은 불변의 사랑을 염원했으리라. 다시 밤양갱의 가사를 떠올린다. 밤양갱은 이별 노래이지만 내용을 보면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 않다. 어긋난 사랑을 인정하고 이별의 원인도 차분하게 이야기 한다. 21세기의 젊은이들만이 사랑에 대범한 것은 아닐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초연결 사회를 사는 그들에겐 이별이라는 것도 관계의 절대적 단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시대마다 어떤 것에 대한 관념이 변하고 상식도 달라진다. 디지털 시대에는 그것에 적합한 정서 유형이 발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텁텁한 된장 맛이 그리울 때가 있듯, 우리는 삶의 곡절에서 본연의 깊은 정서에 도취되고 싶은 때가 있다. 버들가지를 꺾어 건네는 그 순간의 마음 – 그 애틋함과 간절함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되는 이유이다. 글쓴이 김창호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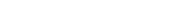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