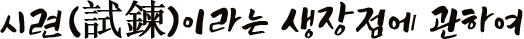[명시초대석] 시련(試鍊)이라는 생장점에 관하여 게시기간 : 2023-07-19 07:00부터 2030-12-24 21:21까지 등록일 : 2023-07-17 15:33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명시초대석
|
||||||||
|
식물에는 생장점이 있다. 생장점은 줄기와 뿌리의 끝에 있다. 생장호르몬을 분비하여 세포분열을 촉진한다. 이 과정이 줄기가 자라고 뿌리가 뻗어가는 것이다. 연구실에는 작은 토분에 담긴 올리브나무가 있다. 작년 가을 내게 올 무렵 가지 하나의 끝이 약간 삐죽이 나와 있었다. 단정한 모양을 깨트리는 것 같아 자르려다 바쁜 통에 잊고 지냈다. 그러다 얼마 뒤에 보니 반 뼘 정도 자라 있었다. 얼마나 자랄까 하는 마음에 놓아두었더니, 지금은 두 뼘 이상이 되어 개성을 뽐내고 있다. 잘라내려 했던 지점에 올리브의 생장점이 있음을 이제야 알았다. 사람에게도 생장점이 있다. 사람의 생장점은 시련 속에 있다. 당시에는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야 안다. 시련은 생각의 마디를 더하고 너그러움의 둘레를 키운다. 옛 시를 읽다보면 인생의 생장점에서 쓰여진 것들이 있다. 그런 작품들은 한때의 시련이 또 다른 자가발전(自家發電)임을 보게 한다. 절절한 비감(悲感)의 언어를 보노라면 나도 모르게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분행루(分行樓) 위에서 어찌 시가 없으랴
사절(使節)과 머무르며 감회를 읊어보네 갈댓잎 사각이는 가을 강가의 마을 강과 산 어슴푸레한 해저물녘의 시간 옛 사람 볼 수 없어 부질없이 탄식하고 지난 일 돌이키기 어려워 스스로 슬퍼할 뿐 누가 믿으랴 먼 시골로 좌천된 이 관직 낮고 나이 많아 머리만 허연 것을 分行樓上豈無詩 留與皇華寄所思 蘆葦蕭蕭秋水國 江山杳杳夕陽時 古人不見今空嘆 往事難追只自悲 誰信長沙左遷客 職卑年老鬂毛衰 지금으로부터 거의 천 년 전의 시이다. 시를 쓴 사람은 김황원(金黃元, 1045~1117)이다. 김황원의 자는 천민(天民)이며 광양현(光陽縣, 지금의 전남 광양시) 출신이다.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문장가로 예부시랑, 한림학사 등을 지냈다. 그는 청빈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다. 특히 고문(古文)을 주장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재상 이자위(李子威)가 당시 유행하던 문풍(文風)을 따르지 않는다고 박해했지만, 상서(尙書) 김상우(金商佑)가 변호하여 복귀할 수 있었다. 화려한 문풍이 선비들의 정신 자세를 흐트러뜨리므로 옛 사람의 순후한 정신을 담은 고문 학습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김황원에 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김황원은 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하루는 평양 부벽루(浮碧樓)에 올랐다. 올라보니 그곳에 걸려있는 평양 산천을 읊은 시들이 하나같이 시원찮았다. 그러자 그것을 모두 떼어내 불태우게 했다. 그리고는 직접 한 수 짓겠다고 호언했다. 시상(詩想)에 잠겼지만 저물녘에 이르러서야 두 구가 생각났다. 긴 성 한 쪽에는 콸콸 흐르는 물
큰 들 동쪽 머리에는 점점의 산들 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 그런데 한참을 고민해도 나머지 두 구가 생각나지 않자 통곡을 하고는 내려왔다. 문단(文壇)을 주도하던 시인의 호방함과 창작이라는 것이 뜻대로 만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일화라 할 수 있다. 위의 분행루(分行樓) 시는 김황원의 시 가운데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이 시를 쓰기 얼마 전 김황원은 간언(諫言)을 담당하는 간관의 책임자[臺諫]로 있었다. 어떤 일인지 기록에는 없지만 당시 임금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다. 김황원은 간언을 했으나 임금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여러 차례 간언을 했다. 그러자 임금은 그를 왕성(王城)에서 멀리 떨어진 성주(星州) 태수로 보낸다. 쓸쓸한 발걸음으로 성주를 향하던 중 분행역(分行驛,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죽산 지역)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침 친한 벗 이궤(李軌)가 그곳에 있지 않은가. 이궤가 누구인가. 한때 나라 안에서 문장을 가장 잘 하는 두 사람이라 해서 자신과 함께 김이(金李)로 불리워졌던 이이다. 이궤는 한림원에 있으면서 업무로 지방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김황원은 반가움도 반가움이지만 벗을 만나자 울적했던 마음의 둑이 터져버렸다. 진정(眞情)을 외면받는 신하의 마음을 벗만은 알아줄 것 같아서였을까. 때는 늦가을. 날이 저물어 해는 서산을 넘어가고 있다. 앞에 펼쳐진 산천은 흐릿하고 강가의 갈대들은 사각이는 소리를 낸다. 쓸쓸하고 차가운 저 광경이 낙담한 내 마음의 모습일까. 세상을 바로잡고 임금을 옳은 길로 이끌려던 포부는 이제 펼 수가 없다. 만들어야 할 세상을 가르쳐주던 책 속의 성현(聖賢)은 너무 먼 시간 속에 있다. 차라리 도연명(陶淵明)처럼 일찍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지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과거의 영화는 오간데 없고 세상 한복판에 홀로 덩그러니 놓인 것 같다. 그저 가을 저녁 낯선 역(驛)에서 초췌한 자신을 위로할 뿐. 그나마 나의 벗 그대가 있기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 시는 당시 고려 시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다.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파한집(破閑集)』에 따르면, 이 시에 화답한 시가 100수나 되었는데 『분행집(分行集)』이라는 이름으로 엮였다. 학사(學士) 박승충(朴昇冲)이 서문을 쓰고, 예종(睿宗)의 아우 대원공(大原公, 王侾)이 판목(板木)에 새겨 후대에 전할 수 있게 했다. 김황원의 시는 한때의 좌절을 읊은 것이다. 그렇지만 벼슬을 하는 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에 관한 것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다. ‘벼슬이란 바다[宦海]’는 위험이 도사린 곳이고 언제든 좌초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삶이란 올지도 모를 그런 시련까지 일부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 시를 읽었을 고려 지식인들이 밑바탕에 가졌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다행히 그는 후에 조정으로 돌아와 예부시랑·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까지 역임하고 관직을 마감한다.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 사이의 관계로 힘든 것이 인생이다. 게다가 보다 나은 삶을 의식하다 보면 생각 밖의 상황에서 곤란을 겪기도 한다. 어떤 때는 힘에 부치고 고통스럽다. 어떤 때는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든다. 그래도 마음을 다지고 꿋꿋이 버티다 보면, 쌓이는 시간 따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오랜 세월, 질풍(疾風)을 견디고 눈비 맞으며 자란 고목의 자태가 그런 것일까. 돌이켜 보면, 묵묵히 견뎠던, 아프고 힘들었던 그 때가 정신적 마디를 더한 생장점이었음을 느낀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다른 이들을 보게 된다. 말 하나 행동 하나에서 드러나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세상에 대한 따스한 시선,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자연스런 용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풍부한 지식도 든든한 경제력도 아니다. 그들이 직면했던 시련이 응결 끝에 다음 마디를 내는 과정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삶이 계속되는 한 시련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시련이 그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생장의 가능성을 가진다. 남다른 이들의 품격있는 모습이라는 것도 시련에 응하는 나의 가능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 가지 이야기를 보탠다. 분행루 시에는 ‘석양(夕陽)’이라는 시어가 있다. 김황원은 시를 지을 때마다 꼭 ‘석양’이라는 시어를 사용했다. 묘지명을 쓴 김부의(金富儀, 1079~1136)는 이러한 습관을 소개하며, 만년(晩年)에 청요직(淸要職)에 오를 조짐을 보인 것이라 했다. 얼마 전 김황원 관련 자료를 찾다가 광양에 대해 알아보았다. 높은 산을 등지고 바다를 마주한 이 도시에 노을(석양) 명소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김황원이 떠올리는 석양은 곧 고향 땅 광양의 노을이 아닐까. 유년시절 뛰어 놀며 눈에 담았던 서편 하늘의 노을. 그 노을이 창작의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밑그림이 된 것은 아닐까. 멀지 않은 때에 광양을 찾아 저물녘의 노을을 한 번 보고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글쓴이 김창호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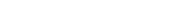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