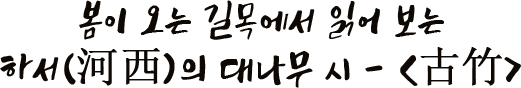[명시초대석]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읽어 보는 하서(河西)의 대나무 시 - <古竹> 게시기간 : 2023-02-20 07:00부터 2030-12-24 21:21까지 등록일 : 2023-02-16 09:4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명시초대석
|
||||||||
|
봄이 오고 있다. 바람은 차갑지만 햇빛에서는 온기가 느껴진다. 나뭇가지는 잠이 깬 듯 물기를 머금고, 뜰에 쌓인 낙엽 사이로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뒷산으로 이어진 대숲에서도 새 기운이 느껴진다. 찬바람을 체질[篩]하고 눈뭉치에 힘겨워하던 가지들이 생기를 되찾고 있다. 대숲 사이의 오솔길을 걷노라면 벌써 한봄의 무성한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옛날부터 시인, 학자들이 좋아한 나무의 하나가 대이다. 단단한 뿌리, 곧게 자라는 성질, 텅 빈 속, 분명한 마디를 보며 당나라의 백거이(白居易)는 현자(賢者)의 모습을 떠올렸고, 송나라의 소동파(蘇東坡)는 “밥 먹을 때에 고기는 없어도 되지만, 사는 집에 대가 없게 할 수는 없네.[可使食無肉 不可使居無竹]”라 하며, 대의 속성에서 속인(俗人)과는 다른 가치를 찾았다.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 김인후(金麟厚, 1510~1560)도 대를 좋아했다. 고향 장성은 대가 자라기에 적합한 곳이어서 늘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문집 『하서집(河西集)』에는 대를 제재로 한 여러 편의 시가 있다. 생활 속에서 쓰여진 것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것도 있다. <고죽(古竹)> 이라는 작품을 소개한다.
<古竹>
쓸쓸한 대나무 바람과 연기에 싸여 있으니 어느 날에 구름 뚫고 올라가 푸른 하늘을 쓸까 짧은 잎은 모래섬돌 위에서 봄을 감추고 있고 가벼운 가지는 흙담 가에서 빗물을 튕기네 蕭蕭苦竹帶風烟 何日穿雲掃碧天 短葉藏春沙砌上 輕枝弄雨土墻邊 소년기 또는 젊은 시절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의 집안이 한양을 떠나 장성에 정착한 것은 5대조 김온이 세자 책봉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한 뒤였다. 김인후는 1510년 7월 19일 장성현(長城縣) 대맥동(大麥洞)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영오(穎悟)했던 그는 10세 때에 전라감사로 와있던 김안국(金安國, 1478~1543)에게 나아가『소학(小學)』을 배웠다. 김안국은 김굉필(金宏弼)의 도학(道學)을 이었으며, 기묘사화로 단절될 뻔 했던 유학의 근본을 유지시켰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인후는 김안국에게 ‘나의 작은 벗[吾小友]’이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였다. 18세 때에는 기묘사화로 인해 화순 동복(同福)에 유배중이던 최산두(崔山斗)를 찾아가 학문을 닦기도 하였다. 이 시는 겨울 끝 무렵의 어느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인은 참대[苦竹]를 바라보고 있다. 참대는 대나무 중에서도 줄기가 매끈하고 곧게 자라는 종류다. 잘만 자란다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자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대는 희뿌연 안개에 싸여 모습조차 선명하지 않다. 시인은 시선을 참대의 잎과 줄기로 옮겨간다. 거리를 두고 볼 때와 다르게 참대의 면면은 생기(生氣)가 충만하다. 섬돌 위에 드리운 짧은 잎은 혹한(酷寒)의 겨울에 지쳐있는 것이 아니었다. 봄의 도래를 준비하며 봄기운을 담뿍 감추고 있다. 흙담 가로 뻗친 가벼운 가지는 수직의 빗방울에도 위축되지 않는다. 빗방울을 튕겨내듯 꼿꼿하고 의연한 모습 그대로다. 문면 그대로 읽기에 이 시는 다분히 중의적(重義的)이다. 대나무는 능력을 지녔으나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시인 자신의 비유로 읽을 수 있다. 대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 ‘푸른 하늘을 쓸 듯’, 언젠가는 간신배를 일소(一掃)하고 태평성세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그러기에 시인은 미래의 어느 날을 기다리며 학문을 연마하고 자기수양에 소홀하지 않은 것이다. 대나무를 보며 세상을 변혁할 역할을 기대하며 견정(堅貞)한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작품이다. 김인후는 31세 되던 해인 중종 35년(1540)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다. 이후 홍문관 정자·저작을 거쳐 중종 38년(1543) 세자시강원설서가 되어 세자(인종)를 보필하고 가르치는 직임을 맡게 된다. 세자와 김인후의 만남은 서로에게 특별한 것이었다. 세자는 김인후의 학문과 도덕의 훌륭함을 보고는 정성껏 스승의 예로 대했다. 김인후 역시 조용한 성품에 효심과 우애가 남달랐던 세자에게서 성군(聖君)의 지치(至治)를 예견한다. 두 사람의 존경과 신뢰는 점차 태평성세에 대한 희망으로 영글어 갔다. 어느 날이었다. 세자는 김인후에게『주자대전(朱子大全)』 한 질과 함께 그림 하나를 선물한다.
<應製題睿畫墨竹>
뿌리와 가지, 마디와 잎 모두 정밀하고 석우(石友)의 정신이 그림 안에 있네 비로소 알겠네 성신께서 조화옹과 짝이 되어 한덩어리 천지의 이치에 어긋남이 없음을 根枝節葉盡精微 石友精神在範圍 始覺聖神侔造化 一團天地不能違 그림을 받아 본 김인후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잎이 무성한 대나무 그림이었다. 세자는 그림에 시를 써 줄 것을 부탁했고 김인후는 이에 마음을 담은 시로 화답했다. 그림의 한 켠에 썼던 시가 바로 이것이다. 시인은 먼저 필치의 섬세함을 노래한다. 뿌리와 가지, 마디와 잎 하나하나가 참으로 정밀하다. 여러 줄기 사이에는 듬직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다. 죽군(竹君)과 석우(石友), 곧 어우러져 있는 대와 돌은 그림의 구성물이지만, 세자와 김인후 두 사람의 상통하는 지취(志趣)와 변치 않을 마음을 대변한다. 후반부는 그림에 담긴 세자의 비범성(非凡性)에 대한 찬탄이다. 세자의 고매한 정신은 조화옹(造化翁)과 짝하였고, 그 결과 이 그림에 천지의 이치가 담뿍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 그림이야말로 성군(聖君)의 자질과 인품이 반영된 걸작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그는 인종이 태평성세를 열 성군이 될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 역시 그러한 성군을 보필할 현신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인종의 단명(短命)은 이들의 꿈을 좌초시키고 말았다. 인종은 1544년 등극 이래 현량과를 복구하고 조광조(趙光祖) 등 기묘명현(己卯名賢)을 신원하는 등 개혁정치의 시동을 걸었다. 그렇지만 계모 문정왕후의 계속되는 견제에 시달리고 병약한 몸을 이기지 못한 채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어 문정왕후의 소생 명종(明宗)이 즉위하는데 이 와중에 문정왕후의 독살설이 퍼지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기도 했다. 앞서 김인후는 중종 말년인 1543년 부모 봉양을 이유로 외직(外職)을 청했고, 12월에 고향 인근 옥과현감(玉果縣監)에 제수된다. 이러한 결단의 이면에는 시대에 대한 깊은 좌절이 있었다. 그는 국정을 농단하던 김안로(金安老)가 물러나자 김안국·이언적(李彦迪) 등 제현(諸賢)에 의해 새 세상이 열릴 것[陽復之漸]을 기대했다. 그러나 척리(戚里)들의 권력 다툼을 보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어려움을 알았다. 또 인종 즉위 후 많은 이들이 옆에서 보필할 것[輔導]을 바랐지만 시대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했다. 게다가 병약한 인종의 약(藥) 처방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거부당하자 깊은 상심에 빠진다. 얼마 후 인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통곡하던 그는 병을 핑계로 고향에 돌아온다. 옥과현감이 일평생 관력(官歷)의 끝이었다. 이후 명종의 조정에서 일곱 차례나 불렀지만 신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출사의 거부는 인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그는 인종이 승하한 을사년 이후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계절이 되면, 책 읽기를 그만 두고 손님도 물리치며, 시종(始終) 슬픈 얼굴을 하고서 한 걸음도 집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칠월 초하루 인종의 기일(忌日)이 되면 술을 가지고 집 남쪽 난산(卵山)에 들어가 저녁때까지 목 놓아 통곡 하다 돌아왔다. 51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일은 그치지 않았다. 훗날 정조(正祖)는 김인후에 대해 “도덕과 문장과 절의를 겸비한 사람은 오직 하서 김문정공이 그 사람일 것이다.(道德文章節義兼備者, 惟河西金文正其人乎.)라 하여 양심과 행동이 일치하고 신념에 조금도 위배되지 않는 삶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냈다. 우암 송시열도 “한 개인이 스스로 그 몸을 폐기했지만 우주(宇宙)가 그를 동량(棟樑)으로 삼고 일월이 그 때문에 어둠을 면하게 되었다.(有一介人自廢其身, 而宇宙以爲棟樑, 日月免夫晦蒙.)”라 함으로써, 양심에 따른 출처가 만고(萬古)의 모범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김인후의 삶은 군신(君臣) 간 의리의 상징이자 출처(出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거유(巨儒)들의 출처를 두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개입되고 부득불(不得不)의 어구가 덧붙여지는 것에 비해, 그의 출처는 진정성있는 경서(經書)의 글귀처럼 오히려 간명(簡明)하다. 중세적 충성(忠誠)이 어떤 진실성인지 오늘의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면이 있다. 의리라는 것이 일생을 걸 만한 중량(重量)이 있는가에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다만 몇 백 년을 건너뛴 오늘에도, 종국에는 많은 현실의 문제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내가 믿는 이, 나를 믿어주는 이, 이러한 관계성에 기초하지 않고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세상을 꿈 꿀 수 있는가. 인종과 김인후의 관계는 이루지 못한 태평성세에 대한 아쉬움을 전해주는 동시에, 인간 사회에서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한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한 사람은 상대에 대한 금석(金石)의 믿음으로 고집스런 자기의 길을 가지 않았던가.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머지않아 초록의 댓잎이 무성하고 가지는 마디를 뻗어 푸른 그늘을 만들 것이다. 김인후의 시대는 ‘하늘 높이 솟은 커다란 대나무’의 역할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사철 푸른 대의 모습과도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은은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글쓴이 김창호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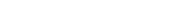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